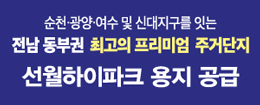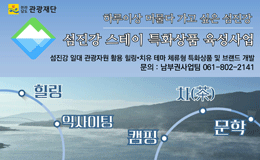호박꽃과 풀꽃 단상(斷想)- 이동범 수필가·교육칼럼니스트
 |
울타리에 황금빛 꽃을 피운 호박꽃을 보면서 옛날 어머니 생각에 잠긴다. 찌는 듯한 무더위에서도 꿋꿋이 피어난 호박꽃은 옥토와 박토를 고집하지 않고 논두렁이나 밭두렁 할 것 없이 햇빛 한 줄기 드는 곳이면 자갈밭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자란 신념의 꽃이다.
이른 봄 호박 씨앗을 심으면 숨기척을 내기 무섭게 넝쿨은 가뿐하게 울타리 담을 타고 올라 푸짐한 꽃잔치를 벌인다. 능글맞게 달달 볶는 한낮의 열기도 개숫물 한 바가지면 족하다. 이기적인 인간에게 햇순을 무참히 꺾인다 해도 절망하거나 요절하지 않는다. 더 많은 줄기를 뻗어 마디마디 열매를 품는다. 잎을 내고 줄기를 뻗는 옹골찬 기상만은 칠월의 태양 볕보다 더 뜨겁다.
호박꽃은 집념의 꽃이다. 허공이든 장벽이든 가리지 않는다. 표독스런 탱자나무 울타리도 기필코 오르고야 마는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꽃이다. 황무지에 맨몸을 갈면서도 열매를 맺는 것이 호박꽃의 운명이라면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 또한 사람의 몫이 아닐까? 어쩌면 성실이라는 단어는 사람보다 식물에 더 어울릴 지도 모른다.
호박꽃은 그리움의 꽃이다. 그 속에는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가 숨어 계신다. 유년시절 어머니에게 호박꽃은 삶이고 세월이었다. 어머니께서는 잘 익은 호박으로 죽을 쑤거나 떡을 만들어 주셨으며 호박잎 쌈을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새롭기만 하다.
들녘에 황금알을 낳는 호박꽃에 주목해보면 연인과의 해후처럼 마음의 응어리가 스스로 풀리고 따스한 훈김이 심장에 빛나는 별처럼 박힌 것 같다. 나도 이렇게 곱게 익을 수 있을까? 사람에게도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다. 설익은 패기만 믿고 대책없이 세상에 부딪치다간 좌충우돌 겉돌기 마련이리라. 냉철한 담금질로 자숙의 시간을 거쳐야 어떤 사람과도 화합할 수 있다고 본다.
호박꽃의 멋은 누가 뭐래도 진솔함이다. 가식이 없는 꽃은 늘 훤칠한 목을 빼어 당당하게 하늘에 시선을 모은다. 슬픔과 기쁨, 미움과 고마움도 한 심장에서 일색으로 피우는 꽃이 아니던가?
“그 사람은 속이 따뜻한 사람이라고, 이름없는 풀꽃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세상의 비웃음이 주는 고통까지도 가슴에 안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마치 빗물에 세수한 호박꽃을 바라보면 마음이 포근해진 것처럼 말이다.
호박의 담홍색 속살에 알알이 박힌 생명의 씨들을 말려서 까먹을 때 고소한 맛은 우리의 미각을 새삼 느끼게 한다. 호박꽃을 하찮은 꽃이라고 하지만 열매인 호박은 우리 식단을 풍성하게 하고 약용으로도 신장에 크게 도움을 준다고 하니 그 이상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는가?
호박꽃을 보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누구에게도 알려주려 하지 않는 풀꽃이 생각난다. 바람 불면 그가 알아서 눕고 비오면 그가 알아서 흠뻑 맞는다. 눈 내리면 눈을 이불삼아 자기 몸을 움츠리며 긴 추운 한파를 이겨내기도 하며 사시사철 바쁜 나날을 보내는 풀꽃이다. 이처럼 호박꽃은 풀꽃과 함께 각자도생하는 민초들이 아닐까? 풀꽃은 아무리 짓밟고 문드러져 헤어날 길 없어도 비온 후 태양이 뜨면 다시 몸을 추스리고 일어나는 인내의 꽃이다.
누가 풀꽃이라 불렀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각자도생하는 민초들이 풀꽃이 아닌가 싶다. 모든 박해를 감수하면서도 의연하게 일어나 꽃과 향기를 품어내는 꽃으로 바로 호박꽃의 인내심과 같은 풀꽃이 아닐까?
우리 모두가 ‘포용과 관대함’이라는 호박꽃의 꽃말처럼 순박하고 수수한 외모에서부터 믿음과 넉넉함을 가지고 속이 따뜻하고 포근하게 살면서 풀꽃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꿋꿋하고 힘차게 살아가면 좋겠다.
이른 봄 호박 씨앗을 심으면 숨기척을 내기 무섭게 넝쿨은 가뿐하게 울타리 담을 타고 올라 푸짐한 꽃잔치를 벌인다. 능글맞게 달달 볶는 한낮의 열기도 개숫물 한 바가지면 족하다. 이기적인 인간에게 햇순을 무참히 꺾인다 해도 절망하거나 요절하지 않는다. 더 많은 줄기를 뻗어 마디마디 열매를 품는다. 잎을 내고 줄기를 뻗는 옹골찬 기상만은 칠월의 태양 볕보다 더 뜨겁다.
들녘에 황금알을 낳는 호박꽃에 주목해보면 연인과의 해후처럼 마음의 응어리가 스스로 풀리고 따스한 훈김이 심장에 빛나는 별처럼 박힌 것 같다. 나도 이렇게 곱게 익을 수 있을까? 사람에게도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다. 설익은 패기만 믿고 대책없이 세상에 부딪치다간 좌충우돌 겉돌기 마련이리라. 냉철한 담금질로 자숙의 시간을 거쳐야 어떤 사람과도 화합할 수 있다고 본다.
호박꽃의 멋은 누가 뭐래도 진솔함이다. 가식이 없는 꽃은 늘 훤칠한 목을 빼어 당당하게 하늘에 시선을 모은다. 슬픔과 기쁨, 미움과 고마움도 한 심장에서 일색으로 피우는 꽃이 아니던가?
“그 사람은 속이 따뜻한 사람이라고, 이름없는 풀꽃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세상의 비웃음이 주는 고통까지도 가슴에 안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마치 빗물에 세수한 호박꽃을 바라보면 마음이 포근해진 것처럼 말이다.
호박의 담홍색 속살에 알알이 박힌 생명의 씨들을 말려서 까먹을 때 고소한 맛은 우리의 미각을 새삼 느끼게 한다. 호박꽃을 하찮은 꽃이라고 하지만 열매인 호박은 우리 식단을 풍성하게 하고 약용으로도 신장에 크게 도움을 준다고 하니 그 이상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는가?
호박꽃을 보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누구에게도 알려주려 하지 않는 풀꽃이 생각난다. 바람 불면 그가 알아서 눕고 비오면 그가 알아서 흠뻑 맞는다. 눈 내리면 눈을 이불삼아 자기 몸을 움츠리며 긴 추운 한파를 이겨내기도 하며 사시사철 바쁜 나날을 보내는 풀꽃이다. 이처럼 호박꽃은 풀꽃과 함께 각자도생하는 민초들이 아닐까? 풀꽃은 아무리 짓밟고 문드러져 헤어날 길 없어도 비온 후 태양이 뜨면 다시 몸을 추스리고 일어나는 인내의 꽃이다.
누가 풀꽃이라 불렀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각자도생하는 민초들이 풀꽃이 아닌가 싶다. 모든 박해를 감수하면서도 의연하게 일어나 꽃과 향기를 품어내는 꽃으로 바로 호박꽃의 인내심과 같은 풀꽃이 아닐까?
우리 모두가 ‘포용과 관대함’이라는 호박꽃의 꽃말처럼 순박하고 수수한 외모에서부터 믿음과 넉넉함을 가지고 속이 따뜻하고 포근하게 살면서 풀꽃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꿋꿋하고 힘차게 살아가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