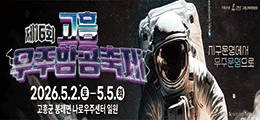“광주, 광역연합 성공시켜 지역균형발전 선도모델 돼야”
한국거버넌스학회, AI 메가클러스터 등 구체적 실행방안 논의
공공주택 거주율 35% 달성·출생아 수 1만명 회복 목표 설정도
공공주택 거주율 35% 달성·출생아 수 1만명 회복 목표 설정도
 지역균형발전 영호남 대토론회 |
광주가 초광역 협력체계인 광주·전남 광역연합을 성공시켜 지역균형발전 선도모델이 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협력사무 1호’를 서둘러 지정하고 향후 5년을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정해 즉시 실행 가능한 정책 대안들을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통혼잡·환경·산단 안전처럼 즉시 공동처리가 가능한 사무를 시범→평가→확대 순으로 연차 계획까지 명시하면 정치 이벤트가 아닌 행정 프로세스로 굳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25일 광주시 서구 5·18민주화운동교육관에서 열린 한국거버넌스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광주의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안들이 제시됐다.
분과별 발표 주제는 메가시티와 행정통합, AI 인프라, 인구·청년·고령층, 공공 디지털전환 등으로 진행됐다.
황성웅 광주연구원 박사는 호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통해 2040년까지 GRDP 200조원 달성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광주·전남의 AI-에너지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핵심 전략으로 제안했다. 광주의 AI 집적단지와 전남의 재생에너지 자원을 결합한 ‘AI-에너지 산업벨트’를 구축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RE300(재생에너지 300%) 달성을 위한 장기 로드맵도 주목받았다. 기존 RE100 목표(2034년)와 연계해 2035-2050년 RE300 달성을 위한 분산형 전원시스템(DSO) 구축과 신재생에너지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제시됐다.
문연희 광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 유출률 전국 1위(-0.6%)인 광주에서 키움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2035년 공공주택 거주율 35% 달성을 핵심 정책으로 제안했다.
현재 광주 공공주택 거주율이 전국 평균(8.2%)보다 낮은 상황에서 이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려 청년층 주거 부담을 해결하자는 것이다. 8~18세 학령기 전반 경제적 지원과 산후조리비용 지원 등 광주 특화 출산 지원 정책을 통해 출생아 수 1만명 회복을 목표로 설정했다.
광주의 2023년 출생아 수는 8943명으로 2022년(9425명) 대비 5.1% 감소했고,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전국 평균(0.72명)을 소폭 상회하지만 여전히 위험 수준이라는 점에서다. 이를 근거로 출산 지원 정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주배경주민 15% 목표 설정도 눈길을 끈다. 현재 광주의 외국인주민 비율이 3.2% 수준인 상황에서 이를 대폭 늘려 인구 감소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무현 지역산업경제연구원 박사는 전국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593만명이 현재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며, 이들에 대한 헌법상 평등권과 인간 존엄성 보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을 통해 860만명에 달하는 비임금 노동자까지 포괄하는 획기적 전환을 제시했다.
대학생 정책 제안팀은 광주 빈집 1405곳 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행정 면책 기준 명확화 및 법제화를 제안했다.
김준형 순천대 교수는 각 부처에 분산된 디지털 관련 기능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디지털부 신설을 제안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등에 산재한 디지털 정책을 일원화해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안성조 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앙정부 중심 외국인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광역비자 도입을 제안했다. 광역지자체가 법무부의 비자발급·체류기간 결정 권한 일부를 넘겨받아 지역 특성에 맞는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박자경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주4일제 도입에 대비한 학교-지역사회 이음 교육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가칭)학교 밖 교육협력위원회’ 설치를 통한 법적 근거 마련과 지방교육협력기구의 법적 근거 마련을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제시했다.
유미현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연구원은 건설노동자 보호를 위해 폭염·한파 시 작업중지권 및 유급 휴식 규정 신설, 탄소중립 대응 ‘디지털 건설 아카데미’ 설립 등을 제안했다. 광주 건설업 ‘임시 및 일용근로자’ 비율이 40.2%에 달한다는 현실을 근거로 내놨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협력사무 1호’를 서둘러 지정하고 향후 5년을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정해 즉시 실행 가능한 정책 대안들을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통혼잡·환경·산단 안전처럼 즉시 공동처리가 가능한 사무를 시범→평가→확대 순으로 연차 계획까지 명시하면 정치 이벤트가 아닌 행정 프로세스로 굳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분과별 발표 주제는 메가시티와 행정통합, AI 인프라, 인구·청년·고령층, 공공 디지털전환 등으로 진행됐다.
황성웅 광주연구원 박사는 호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통해 2040년까지 GRDP 200조원 달성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광주·전남의 AI-에너지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핵심 전략으로 제안했다. 광주의 AI 집적단지와 전남의 재생에너지 자원을 결합한 ‘AI-에너지 산업벨트’를 구축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문연희 광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 유출률 전국 1위(-0.6%)인 광주에서 키움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2035년 공공주택 거주율 35% 달성을 핵심 정책으로 제안했다.
현재 광주 공공주택 거주율이 전국 평균(8.2%)보다 낮은 상황에서 이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려 청년층 주거 부담을 해결하자는 것이다. 8~18세 학령기 전반 경제적 지원과 산후조리비용 지원 등 광주 특화 출산 지원 정책을 통해 출생아 수 1만명 회복을 목표로 설정했다.
광주의 2023년 출생아 수는 8943명으로 2022년(9425명) 대비 5.1% 감소했고,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전국 평균(0.72명)을 소폭 상회하지만 여전히 위험 수준이라는 점에서다. 이를 근거로 출산 지원 정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주배경주민 15% 목표 설정도 눈길을 끈다. 현재 광주의 외국인주민 비율이 3.2% 수준인 상황에서 이를 대폭 늘려 인구 감소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무현 지역산업경제연구원 박사는 전국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593만명이 현재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며, 이들에 대한 헌법상 평등권과 인간 존엄성 보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을 통해 860만명에 달하는 비임금 노동자까지 포괄하는 획기적 전환을 제시했다.
대학생 정책 제안팀은 광주 빈집 1405곳 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행정 면책 기준 명확화 및 법제화를 제안했다.
김준형 순천대 교수는 각 부처에 분산된 디지털 관련 기능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디지털부 신설을 제안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등에 산재한 디지털 정책을 일원화해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안성조 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앙정부 중심 외국인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광역비자 도입을 제안했다. 광역지자체가 법무부의 비자발급·체류기간 결정 권한 일부를 넘겨받아 지역 특성에 맞는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박자경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주4일제 도입에 대비한 학교-지역사회 이음 교육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가칭)학교 밖 교육협력위원회’ 설치를 통한 법적 근거 마련과 지방교육협력기구의 법적 근거 마련을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제시했다.
유미현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연구원은 건설노동자 보호를 위해 폭염·한파 시 작업중지권 및 유급 휴식 규정 신설, 탄소중립 대응 ‘디지털 건설 아카데미’ 설립 등을 제안했다. 광주 건설업 ‘임시 및 일용근로자’ 비율이 40.2%에 달한다는 현실을 근거로 내놨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