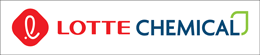위기의 바다…변화와 혁신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연다
전남 혁신 어촌의 ‘바다 이야기’ <1> 프롤로그
풍요의 상징이었던 전남어업 쇠락의 길
전국 생산량 58% 수산물 수출액 10% 불과
외국인 노동자 없인 김·전복 양식 붕괴 직면
기후위기에 어획량 급감 어민들 생계 위협
생산 시설, 가공·관광 시스템 구축 등 시급
풍요의 상징이었던 전남어업 쇠락의 길
전국 생산량 58% 수산물 수출액 10% 불과
외국인 노동자 없인 김·전복 양식 붕괴 직면
기후위기에 어획량 급감 어민들 생계 위협
생산 시설, 가공·관광 시스템 구축 등 시급
 여수 금봉어촌계가 운영중인 굴 양식장. 대규모 양식을 통해 전복, 굴, 돔, 우럭 등 비싼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됐지만, 바다 생태계 변화, 자체 노동력 상실 및 인건비 급등, 가격 폭락 등으로 어민들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
바다가 위기다. 엘리뇨 현상으로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고, 그에 따라 어패류, 해조류 등 바다 생물의 생태계도 급변하고 있다. 태풍, 폭우, 폭염 등 이상기후도 잦아지면서 피해가 반복되고, 매년 잡혔던 어패류가 갑자기 자취를 감추는 현상도 곳곳에서 발생, 전남 어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여기에 어업이 대표적인 3D(Dirty, Difficult, Dangerous)업종으로 분류돼 젊은이들이 떠나고 외국인에게 노동력을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지속가능성에도 의문에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월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면서 바다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전남 어민들의 걱정거리는 하나 더 늘어났다. 광주일보는 전남 어촌 현장을 찾아 미래를 설계하며, 지역 발전과 어민 삶의 질 증진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수 어촌들을 소개한다.
전남 어촌은 풍요의 상징이었다. 농축산물보다 귀했던 수산물은 구하기도 어렵고, 값도 비싸 맛보기조차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어로 방식이 대대적으로 바뀌고, 전남 연안이 거대한 양식장으로 변모하면서 우럭, 돔, 전복, 굴, 낙지 등 건강한 수산물을 언제든 저렴하게 즐길 수 있게 된 것은 20여 년 전부터다.
서해와 남해를 접하고 있고, 리아스식 해안과 섬으로 둘러싸인 전남은 우월한 해양·수산 기반을 갖추고 관련 분야에서 절대적인 우위에 있다. 해안선이 전국의 45%인 6,873㎞로, 여자만, 가막만, 득량만, 강진만, 광양만 등을 만들어냈으며, 긴 해안선과 만에는 국가·지방어항, 소규모 항포구 등 1,102개소(전국 2,305개소의 47.8%)가 연이어 자리하고 있다. 2만7,807척(전국 6만5,531척의 42.4%)의 어선이 연안과 먼 바다를 오가며 각종 수산물을 잡거나 길러 실어나르고 있다. 2022년 수산물 생산량은 198만8,000t(전국의 58%)에 달했으며, 생산액은 3조1,002억원(전국의 39%)를 차지했다.
그러나 뛰어난 전남의 해양·수산 기반 및 자원은 국가 및 지역 경제 성장·발전, 어촌 삶의 질 증진, 어민 소득 및 만족도 향상 등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항만, 방파제, 물양장, 공동작업장 등 어항·항포구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들이 미흡·노후되어 있으며, 수산물 가공·유통을 위한 시설, 공장, 기업 등이 없어 전남에서 생산된 어패류, 해조류가 저렴한 원물 상태에서 타지역으로 유출되기 때문이다. 살기 불편한 어촌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같고, 기득권을 쥔 기존 어민들의 텃세는 계속돼 젊은층은 떠나고 외지인들은 정착하기 어렵다.
수산물 수출액은 3억500만 달러로 전국(28억1,900만 달러)의 10.8%에 불과하며, 5t 미만의 소규모 어선이 2만2,769척으로 전체 전남 어선의 80.1%를 차지하고 있다. 어항·항포구는 전국의 절반에 육박하지만, 무역항은 4곳(전국의 13%), 연안항은 11곳(전국의 38%)에 불과하다. 전남은 김, 전복, 미역 등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수산물 생산기지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어민들의 속은 검게 타들어가고 있다. 일당 20만 원(간식비, 인센티브 등 포함)을 넘어선 외국인 숙련 노동자들의 콧대와 임금은 나날이 높아지고, 과잉 생산된 수산물들의 가격은 급등락을 거듭한다. 외국인 노동자가 없다면 김·전복 생산 시스템은 붕괴될 것이다. 사료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고 있으나 도매·위판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면서 가두리 양식도 한계에 이르고 있다.
기후 위기로 인한 전남 바다의 이상 징후는 계속 그 정도를 더해가고 있다. 갑자기 잡히던 어류의 종류가 바뀌고 패류, 두족류 등이 사라지는 등 오랜 시간 어촌을 지켜왔던 어민들도 당황할 정도다. 잡히는 양도 크게 줄면서 당장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 바다에서 그 명맥을 이어왔던 전통 어로 기술도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 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꼬막, 자연산 굴, 짱뚱어, 낙지 등 다양한 수산물의 보고이자 남도 음식문화의 기반이 돼 온 서남해안 갯벌과 연안의 ‘건강함’도 언제까지 유지될 지 알 수가 없다. 전남도와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16개 시·군이 수산 자원 회복을 위해 종자·종패를 지속적으로 살포하고 있지만, 생산량이 과거에 비해 급감하고 있다는 것이 어민들의 토로다.
이러한 위기 속 전남 어촌이 유지·존속,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혁신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어업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도시와 비슷한 수준의 편의·문화시설 보급, 소득 향상을 위한 가공·관광 시스템 구축 등은 필수이다. 여기에 외국인 노동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첨단기술의 적용, 어촌에서 살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지원, 폐쇄적이며 과거에 머물러 있는 어촌의 자체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 등도 이어져야 한다.
전국(2044개)의 41.9%에 달하는 857개 전남의 어촌계 가운데 생존을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혁신 어촌들이 있다. 광주일보는 이들 혁신 어촌계의 노력과 성과, 앞으로의 과제 등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사진 제공=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해남 송호어촌계가 운영중인 전복 양식장. 전남 해역 곳곳에 전복 양식장이 들어서면서 과잉 생산, 해양쓰레기 증가, 경관 침해 등의 문제점이 부상하고 있다. 전복을 비롯한 어패류, 해조류 등을 가공해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
그러나 뛰어난 전남의 해양·수산 기반 및 자원은 국가 및 지역 경제 성장·발전, 어촌 삶의 질 증진, 어민 소득 및 만족도 향상 등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항만, 방파제, 물양장, 공동작업장 등 어항·항포구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들이 미흡·노후되어 있으며, 수산물 가공·유통을 위한 시설, 공장, 기업 등이 없어 전남에서 생산된 어패류, 해조류가 저렴한 원물 상태에서 타지역으로 유출되기 때문이다. 살기 불편한 어촌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같고, 기득권을 쥔 기존 어민들의 텃세는 계속돼 젊은층은 떠나고 외지인들은 정착하기 어렵다.
수산물 수출액은 3억500만 달러로 전국(28억1,900만 달러)의 10.8%에 불과하며, 5t 미만의 소규모 어선이 2만2,769척으로 전체 전남 어선의 80.1%를 차지하고 있다. 어항·항포구는 전국의 절반에 육박하지만, 무역항은 4곳(전국의 13%), 연안항은 11곳(전국의 38%)에 불과하다. 전남은 김, 전복, 미역 등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수산물 생산기지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어민들의 속은 검게 타들어가고 있다. 일당 20만 원(간식비, 인센티브 등 포함)을 넘어선 외국인 숙련 노동자들의 콧대와 임금은 나날이 높아지고, 과잉 생산된 수산물들의 가격은 급등락을 거듭한다. 외국인 노동자가 없다면 김·전복 생산 시스템은 붕괴될 것이다. 사료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고 있으나 도매·위판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면서 가두리 양식도 한계에 이르고 있다.
 보성 석간어촌계가 공동운영하고 있는 갯벌. 낙지, 칠게, 꼬막, 바지락 등 다양한 수산물의 보고인 전남의 갯벌이 최근 기후 위기, 오염, 남획 등으로 예전과 같은 생산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
이러한 위기 속 전남 어촌이 유지·존속,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혁신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어업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도시와 비슷한 수준의 편의·문화시설 보급, 소득 향상을 위한 가공·관광 시스템 구축 등은 필수이다. 여기에 외국인 노동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첨단기술의 적용, 어촌에서 살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지원, 폐쇄적이며 과거에 머물러 있는 어촌의 자체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 등도 이어져야 한다.
전국(2044개)의 41.9%에 달하는 857개 전남의 어촌계 가운데 생존을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혁신 어촌들이 있다. 광주일보는 이들 혁신 어촌계의 노력과 성과, 앞으로의 과제 등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사진 제공=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