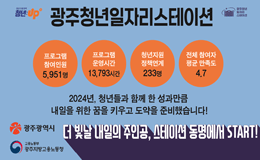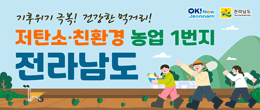김복희 열사를 생각하며- 최현열 광주 온교회 담임목사
 |
3월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하는가. 올해는 삼일운동이나 일제로부터 해방을 위해 목숨을 버렸던 많은 열사나 독립운동가들을 기리는 내용들은 찾아보기 힘든 것 같다. 대통령의 삼일절 담화가 독립투사들의 후손들과 일본군에 의하여 고통을 겪었던 이들의 마음에 생채기를 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또한 세종시에서 삼일절에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를 아파트에 거는 바람에 마치 그가 삼일절의 주인공인양 언론과 뉴스와 매체들은 그 이야기로 온통 뒤덮었다. 구정물을 맑은 물로 정화하는 것은 힘들지만 맑은 물을 더럽히는 데는 그보다 훨씬 쉽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용어가 있다. 각종 이슈를 요란스럽게 치장해 구설수에 오르도록 하거나, 화젯거리를 만들어 소비자들의 이목을 현혹시켜 인지도를 늘리는 마케팅 기법을 말한다. 즉 소음이나 잡음을 뜻하는 ‘노이즈’를 일부러 조성해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부추기는 기법으로 주로 텔레비전의 오락 프로그램이나 새로 개봉하는 영화 등을 홍보할 때 많이 이용된다. 이런 자극적인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노출되고 많은 조회수를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끌기 위해서 분란을 유도하는 자극적인 내용의 글을 올리거나 악의적인 행동을 하는 어그로(aggro)라는 단어가 생겨났다. 나무위키에서는 “상대방을 도발해서 상대방에게 적의를 갖게 하여 관심을 끄는 행위나 상황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런 식의 농간에 넘어가지 말았으면 한다. 잊지 말고 기억해 내자.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태극기과 햇불을 들어 올렸음을 후손들에게 전해주자. 그런 의미에서 나는 김복희 열사를 소개하고 싶다.
김복희 열사는 유관순 열사의 이화학당 2년 선배이다. 그녀는 한 교회에서 장로로 임직하여 신앙으로도 모범을 보였다. 김복희 학생의 독립운동에 대한 열정은 이화학당에 재학 중 불타올랐다. 일제의 폭정 밑에서 고통과 굴욕의 나날을 보내고 있던 당시 이화학당 학생들은 대부분 17~18세의 한창때 나이였던지라 그들의 반일감정은 극에 달해 있었다. 마침내 김복희 학생이 졸업반이 되던 해 3월 1일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당시 유관순은 1학년이었다. 서울에서 만세운동이 있은 지 30일째가 되던 3월 31일 저녁, 김복희는 모든 부락민들에게 횃불을 들고 동네에서 가장 높은 산(방화산)으로 모이라는 말을 전달했고, 시간이 되어 약 50여 명의 주민들이 모였다. 그들은 목청껏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그러나 곧 일본 순사들이 에워쌌다. 그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강제 해산당하고 대부분 잡혀갔는데, 김복희와 한연순 선생은 헌병들의 눈을 피해 지척을 분간하기 어려운 산속으로 달아나기는 했지만 낭떠러지에서 굴러떨어져 부상을 당했고 치료 중 헌병대의 집요한 수사로 끝내 붙잡혀 공주감옥에 투옥되었다. 김복희 장로가 중심이 되어 일어난 ‘백암리 만세운동’은 이후 천안 유관순의 아우내 독립운동과 더불어 3·1운동사의 중요한 운동으로 자리잡게 된다. 이후 이화학당에 다시 들어간 김복희는 이화여자전문학교 보육과에 진학해 공부하다가 졸업했고, 사애리시 선교사의 부름을 받아 강경의 황금정여학교 부속 유치원 설립에 관여하는 한편 강경 만통여학교의 선생으로도 일했다. 공주 대화정교회의 영명여학교 부속유치원 교사와 영명여학교 시간교사로 일하기도 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부림절이라는 절기가 있고 그 절기 속에는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에스더와 모르드개라는 사람이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시대에 이스라엘 여성으로서 왕비의 자리에 올랐다. 타 민족의 계략으로 많은 동족이 죽음의 위기에 몰렸고 그 사실을 안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 말을 함으로써 그 위기를 역전시켰다.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잘 알려진 성경 말씀 중 에스더서 4장 16절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구절이 있다. 목숨을 걸고 나라를 구한 그녀의 다짐의 말이다. 그의 삼촌이 모르드개는 머뭇거리고 있는 그녀의 마음을 굳건히 세워서 그 일을 이루게 한 인물이다. 그는 에스더서 9장 22절에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라고 선포한다. 페르시아 시대부터 이어진 절기가 현대에까지 전해져서 지켜지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놀라운가. 삼일절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
김복희 열사는 유관순 열사의 이화학당 2년 선배이다. 그녀는 한 교회에서 장로로 임직하여 신앙으로도 모범을 보였다. 김복희 학생의 독립운동에 대한 열정은 이화학당에 재학 중 불타올랐다. 일제의 폭정 밑에서 고통과 굴욕의 나날을 보내고 있던 당시 이화학당 학생들은 대부분 17~18세의 한창때 나이였던지라 그들의 반일감정은 극에 달해 있었다. 마침내 김복희 학생이 졸업반이 되던 해 3월 1일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당시 유관순은 1학년이었다. 서울에서 만세운동이 있은 지 30일째가 되던 3월 31일 저녁, 김복희는 모든 부락민들에게 횃불을 들고 동네에서 가장 높은 산(방화산)으로 모이라는 말을 전달했고, 시간이 되어 약 50여 명의 주민들이 모였다. 그들은 목청껏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그러나 곧 일본 순사들이 에워쌌다. 그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강제 해산당하고 대부분 잡혀갔는데, 김복희와 한연순 선생은 헌병들의 눈을 피해 지척을 분간하기 어려운 산속으로 달아나기는 했지만 낭떠러지에서 굴러떨어져 부상을 당했고 치료 중 헌병대의 집요한 수사로 끝내 붙잡혀 공주감옥에 투옥되었다. 김복희 장로가 중심이 되어 일어난 ‘백암리 만세운동’은 이후 천안 유관순의 아우내 독립운동과 더불어 3·1운동사의 중요한 운동으로 자리잡게 된다. 이후 이화학당에 다시 들어간 김복희는 이화여자전문학교 보육과에 진학해 공부하다가 졸업했고, 사애리시 선교사의 부름을 받아 강경의 황금정여학교 부속 유치원 설립에 관여하는 한편 강경 만통여학교의 선생으로도 일했다. 공주 대화정교회의 영명여학교 부속유치원 교사와 영명여학교 시간교사로 일하기도 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부림절이라는 절기가 있고 그 절기 속에는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에스더와 모르드개라는 사람이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시대에 이스라엘 여성으로서 왕비의 자리에 올랐다. 타 민족의 계략으로 많은 동족이 죽음의 위기에 몰렸고 그 사실을 안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 말을 함으로써 그 위기를 역전시켰다.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잘 알려진 성경 말씀 중 에스더서 4장 16절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구절이 있다. 목숨을 걸고 나라를 구한 그녀의 다짐의 말이다. 그의 삼촌이 모르드개는 머뭇거리고 있는 그녀의 마음을 굳건히 세워서 그 일을 이루게 한 인물이다. 그는 에스더서 9장 22절에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라고 선포한다. 페르시아 시대부터 이어진 절기가 현대에까지 전해져서 지켜지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놀라운가. 삼일절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