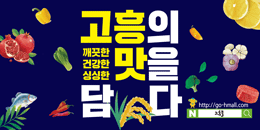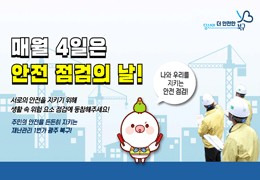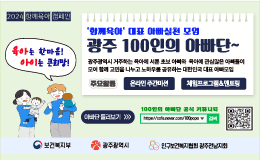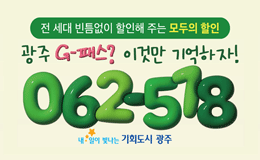애착을 버리면 그 자리가 명백하게 드러난다 - 김원명 광주 원음방송 교무
 |
원불교 3대 종법사인 대산 종사께서는 하루에 네 차례 마음을 챙기는 사시(四時) 유무념 대조를 하셨다고 한다. 아침과 오전 그리고 오후와 저녁에 ‘도심(道心)으로 일관했는가, 일관하지 않았는가’를 늘 대조하신 것이다. 도심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도심은 그렇게 찾으면 멀어지고 찾지 않고 구하면 얻어지는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다. 그 한마음을 깨달아야 생사가 끊어지고 고락을 초월할 수 있다. 성리를 깨닫고 성리를 단련해야 성자가 되고 항마를 할 수 있다.
성리를 모르면 삼세가 해결이 안 되고 복을 지어도 복의 그림자에 걸려서 생사대사가 더 어렵게 되기 쉽다. 그래서 누구나 성리의 무문관(無門關)을 통과해야 한다. 그 한마음을 깨달아서 그 한마음을 잘 지키고 그 한마음을 바탕으로 영생을 거래할 수 있어야 한다. 심조 승찬(僧璨) 스님의 ‘신심명(信心銘)’ 첫 구절을 보면 “지도무난(至道無難) 유혐간택(唯嫌揀擇) 단막증애(但莫憎愛) 통연명백(洞然明白)”이란 말씀이 있다. “지도무난 유혐간택” 다시 말해서 지극한 성리 자리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것인가 저것인가 하고 차별심만 갖지 않으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다.
이리저리 따지고 재는 사람은 사람을 만나도 견주기를 좋아한다. 저 사람이 높을까 내가 높을까, 저 사람이 예쁠까 내가 예쁠까, 저 사람이 클까 내가 클까를 견주고 생각하면서 산다. 사람이 괴로운 것은 항상 나와 상대방을 이처럼 견주어 차별하기 때문이다. 그런 간택의 마음을 놓고 증애를 버려야 한다. ‘단막증애 통연명백’ 다시 말해서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놓으면 그 자리가 통연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말씀이다. 증애(憎愛)의 감정과 호오(好惡)의 감정 그리고 높고 낮은 감정을 쉬면 마음 밭이 저절로 통연명백하게 드러난다. 그 자리가 확실해서 명백하게 드러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생사에 걸려 윤회를 하는 것이다. 착한 일을 하고서도 남이 몰라준다고 걱정이고 나는 착한데 저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심지(心地), 심전(心田) 자리를 늘 만나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은 만난 줄을 모른다. 하지만 깨달은 사람은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구나’ 하고 확연하게 안다. 생사대사를 연마할 때 조촐한 그 한마음을 함축하지 못하면 영생 길을 떠날 때 남의 힘을 빌려서 가야 한다. “나 죽으면 교무님이 와서 단단히 천도해주세요. 대중이 오셔서 변명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렇게 믿고 안심하고 간다. 자력이 없으면 타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신심이 장하고 나를 옹호해 주시는 불보살들이 많이 있으면 잘 갈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한마음을 알아서 그 한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다. 잘못하면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참 어려운 것이 바로 애착이다. 애착이 있으면 놓아야 하는데 끝까지 붙잡고 있으니까 그 근처를 떠나지 못한다.
부처님께서는 집이 오음(五陰)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셨다. 애착이 강하면 그 울타리를 넘어설 수 없다. 사랑하려면 먼저 무심한 마음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나무도 가지 하나가 크려면 뿌리도 함께 깊이 뿌리를 내려야 바람이 많이 불어도 견딜 수 있다고 한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할 일이 있으면 무심을 더 많이 단련해서 사랑을 하더라도 놓을 자리에 놓고 들일 자리에 들이는 공부가 필요하다. ‘단막증애 통연명백’이란 말씀은 다만 증애의 마음을 조절해서 놓았다 들였다 자유로 하면 그 자리가 훤히 드러난다는 말씀이다.
세상을 살면서 어찌 집념이 없고 사랑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놓을 줄도 알고 잡을 줄도 알고 무심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그렇게 성리를 단련하고 법력을 갖추어야 생사에 대자유(大自由)를 얻을 수 있다. 이제 청정한 그 마음을 깨달아 항상 그 자리가 주인이 되어서 일 끝나면 그 자리로 돌아오고 또다시 일이 끝나면 그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괴로울 때도 즐거울 때도 항상 초연한 그 자리에 머물 줄 알아야 참 사람이고 성자이고 부처이다. 청정심의 기본은 분별 망상이 끊어지고 심행처(心行處)가 멸한 그 자리를 보아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청정일념이 영생과 현생을 거래하는데 기본이 되고 으뜸이 되는 공덕이 될 것이다.
우리가 심지(心地), 심전(心田) 자리를 늘 만나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은 만난 줄을 모른다. 하지만 깨달은 사람은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구나’ 하고 확연하게 안다. 생사대사를 연마할 때 조촐한 그 한마음을 함축하지 못하면 영생 길을 떠날 때 남의 힘을 빌려서 가야 한다. “나 죽으면 교무님이 와서 단단히 천도해주세요. 대중이 오셔서 변명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렇게 믿고 안심하고 간다. 자력이 없으면 타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신심이 장하고 나를 옹호해 주시는 불보살들이 많이 있으면 잘 갈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한마음을 알아서 그 한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다. 잘못하면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참 어려운 것이 바로 애착이다. 애착이 있으면 놓아야 하는데 끝까지 붙잡고 있으니까 그 근처를 떠나지 못한다.
부처님께서는 집이 오음(五陰)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셨다. 애착이 강하면 그 울타리를 넘어설 수 없다. 사랑하려면 먼저 무심한 마음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나무도 가지 하나가 크려면 뿌리도 함께 깊이 뿌리를 내려야 바람이 많이 불어도 견딜 수 있다고 한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할 일이 있으면 무심을 더 많이 단련해서 사랑을 하더라도 놓을 자리에 놓고 들일 자리에 들이는 공부가 필요하다. ‘단막증애 통연명백’이란 말씀은 다만 증애의 마음을 조절해서 놓았다 들였다 자유로 하면 그 자리가 훤히 드러난다는 말씀이다.
세상을 살면서 어찌 집념이 없고 사랑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놓을 줄도 알고 잡을 줄도 알고 무심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그렇게 성리를 단련하고 법력을 갖추어야 생사에 대자유(大自由)를 얻을 수 있다. 이제 청정한 그 마음을 깨달아 항상 그 자리가 주인이 되어서 일 끝나면 그 자리로 돌아오고 또다시 일이 끝나면 그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괴로울 때도 즐거울 때도 항상 초연한 그 자리에 머물 줄 알아야 참 사람이고 성자이고 부처이다. 청정심의 기본은 분별 망상이 끊어지고 심행처(心行處)가 멸한 그 자리를 보아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청정일념이 영생과 현생을 거래하는데 기본이 되고 으뜸이 되는 공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