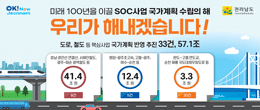원전 용역 근로자 피폭량 정규직의 8배
한빛원전 비정규직 비율 최고
CCTV 45.3%는 저화질
“인력 안정·장비 보강 필요”
CCTV 45.3%는 저화질
“인력 안정·장비 보강 필요”
국내 원자력발전소에서 근무 인원 10명 중 4명은 한국수력원자력 소속 정규직원이 아닌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며, 이들의 방사능 피폭량은 정규직의 8배 이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국내 4개 원자력발전소에 설치된 CCTV 3대 중 1대는 얼굴 식별도 어려울 정도의 저화소, 노후장비여서 교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빛원전 근로자 절반 ‘용역업체 소속’=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빛원전 근무 인원 2960명 중 한수원 소속 정규직원은 1508명으로 파악됐다.
전체의 49.1%에 달하는 1452명은 용역업체 소속 직원으로, 한빛원전은 월성·고리·한울 등 국내 원전 4곳 가운데 정규직 대비 용역업체 직원 비율이 가장 높았다.
고리원전은 정규직 2338명, 용역업체 소속 1534명(39.6%), 월성원전 1620명, 1287명(44.3%), 한울원전 2136명, 1485명(41.0%) 이었다. 국내 원전 근로자 가운데 10명 중 4명은 한수원 직원이 아닌 외부 용역업체 소속으로, 위험성을 안고 가동되는 원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정규직 비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업무 중 방사선에 노출되는 피폭량을 비교하면 한수원 직원보다 용역업체 직원들의 피폭량이 월등히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해당 기간 한수원 직원들의 평균 피폭량은 0.11mSv인 반면, 용역업체 직원들의 평균 피폭량은 0.97mSv로 약 8.8배 차이가 났다.
한수원 정규직의 경우 지난 2011년 1인당 평균 피폭량이 0.15mSv에서 올해는 0.06mSv으로 감소했다. 반면 용역업체 직원들의 피폭량은 같은 기간 1.06mSv에서 0.73mSv으로 소폭 감소했으며,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방사선작업종사자 중 원자력안전법에 규정된 일반인의 피폭량 한도인 1mSv을 넘은 이도 무려 2182명(14.6%)에 달했다.
이찬열 의원은 “원전의 특수성, 위험성을 감하면 비정규직, 외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 비율이 너무 높다. 안전 관련업무, 위험업무 종사자 등은 조속히 정규직화해 고용 보장 등 정당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면서 “정규직, 비정규직 직원의 피폭량 차이와 관련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괜찮다고 할 것이 아니라 작업환경을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전 CCTV 3대 중 1대 ‘얼굴 구분도 못해’= 1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경욱 의원(새누리당)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한빛·고리·월성·한울 4개 원자력발전소에 설치된 1063대의 CCTV 중 34.3%인 365대는 41만 저화소 장비였다. 100만 화소 CCTV는 16대(1.5%)였고, 비교적 고화질인 200만 화소 CCTV는 전체의 64.1%인 682대였다.
한빛원전의 경우 CCTV 258대 가운데 41만 화소는 117대, 200만 화소는 141대로 파악됐다.
원전은 청와대, 국회의사당, 국제공항 등과 함께 국가보안목표시설 ‘가’급으로 지정된 주요시설이다. 주요시설인 만큼 152억 원을 투입해 CCTV 1063대, 출입통제시스템 12개소 등 보안장비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41만 저화소 CCTV가 3대 중 1대꼴이고, 이마저도 설치된 지 5년 이상 된 노후장비로 해안가 특성상 해풍과 바닷물의 영향으로 인해 내구 연한이 더 짧아진 상태로 나타났다.
또한 원전은 바다와 인접해 유사시에 인근지역 관공서와 유관기관의 방호지원, 피해복구 지원이 제한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이에 대비한 훈련과 장비 및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민경욱 의원은 “원전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에너지원이고, 핵심시설인 만큼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보안시설 강화를 통한 테러 사전 예방과 사건 발생 시·군과 경찰, 소방요원들 간에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신속한 대처가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전체의 49.1%에 달하는 1452명은 용역업체 소속 직원으로, 한빛원전은 월성·고리·한울 등 국내 원전 4곳 가운데 정규직 대비 용역업체 직원 비율이 가장 높았다.
고리원전은 정규직 2338명, 용역업체 소속 1534명(39.6%), 월성원전 1620명, 1287명(44.3%), 한울원전 2136명, 1485명(41.0%) 이었다. 국내 원전 근로자 가운데 10명 중 4명은 한수원 직원이 아닌 외부 용역업체 소속으로, 위험성을 안고 가동되는 원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정규직 비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수원 정규직의 경우 지난 2011년 1인당 평균 피폭량이 0.15mSv에서 올해는 0.06mSv으로 감소했다. 반면 용역업체 직원들의 피폭량은 같은 기간 1.06mSv에서 0.73mSv으로 소폭 감소했으며,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방사선작업종사자 중 원자력안전법에 규정된 일반인의 피폭량 한도인 1mSv을 넘은 이도 무려 2182명(14.6%)에 달했다.
이찬열 의원은 “원전의 특수성, 위험성을 감하면 비정규직, 외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 비율이 너무 높다. 안전 관련업무, 위험업무 종사자 등은 조속히 정규직화해 고용 보장 등 정당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면서 “정규직, 비정규직 직원의 피폭량 차이와 관련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괜찮다고 할 것이 아니라 작업환경을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전 CCTV 3대 중 1대 ‘얼굴 구분도 못해’= 1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경욱 의원(새누리당)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한빛·고리·월성·한울 4개 원자력발전소에 설치된 1063대의 CCTV 중 34.3%인 365대는 41만 저화소 장비였다. 100만 화소 CCTV는 16대(1.5%)였고, 비교적 고화질인 200만 화소 CCTV는 전체의 64.1%인 682대였다.
한빛원전의 경우 CCTV 258대 가운데 41만 화소는 117대, 200만 화소는 141대로 파악됐다.
원전은 청와대, 국회의사당, 국제공항 등과 함께 국가보안목표시설 ‘가’급으로 지정된 주요시설이다. 주요시설인 만큼 152억 원을 투입해 CCTV 1063대, 출입통제시스템 12개소 등 보안장비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41만 저화소 CCTV가 3대 중 1대꼴이고, 이마저도 설치된 지 5년 이상 된 노후장비로 해안가 특성상 해풍과 바닷물의 영향으로 인해 내구 연한이 더 짧아진 상태로 나타났다.
또한 원전은 바다와 인접해 유사시에 인근지역 관공서와 유관기관의 방호지원, 피해복구 지원이 제한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이에 대비한 훈련과 장비 및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민경욱 의원은 “원전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에너지원이고, 핵심시설인 만큼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보안시설 강화를 통한 테러 사전 예방과 사건 발생 시·군과 경찰, 소방요원들 간에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신속한 대처가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