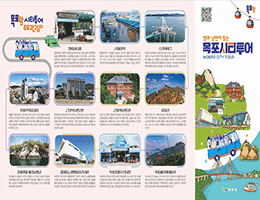‘자연의 콩팥’ 습지생태계 안녕한가?
송 기 동
사회2부장
사회2부장
지난해 8월, 담양군 고서면에 위치한 명옥헌 원림(鳴玉軒 苑林)을 찾았을 때의 일이다. 마침 배롱나무꽃이 만개한 때라 붉은 수채화 물감을 풀어놓은 듯한 절경을 연출했다. 명옥헌 앞 연못 역시 붉은 빛깔이 반영돼 아름다웠다.
수면에는 소금쟁이떼가 바람결에 움직이는 낙화한 꽃잎을 따라 이리저리 미끄러지고 있었다. 이때 연못가 풀줄기에 뭔가 붙어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쪼그리고 앉아 자세히 들여다 보니 자그마한 잠자리 한 쌍이 하트모양을 한 채 짝짓기에 열중하고 있었다. 손가락 두 마디도 채 되지 않을 정도의 크기였다.
마을 입구 덤벙에도 많은 생물체가 날아다니고 있었다. 그 가운데 잠자리 같기도 하고, 나비 같기도 한 모양새에 너울너울 ‘묘하게’ 나는 것도 있었다. 두 쌍의 날개가 대칭형이 아니고 아래쪽 날개가 더 큰 데다가 먹물을 묻힌 듯 검었기 때문이다.
두 종류의 잠자리 이름이 너무 궁금해 ‘한국의 잠자리’라는 제목의 도감을 구입해 살펴보니 전자는 ‘아시아실잠자리’, 후자는 ‘나비잠자리’였다.
한여름철 명옥헌 일대는 피서객들에게는 ‘힐링’ 휴식지이지만 곤충 등 많은 생명체의 보금자리이기도 했던 것이다.
요즘 습지(濕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육지도, 호수도 아닌 습지는 지구 표면의 6%를 차지하지만 그동안 쓸모없는 땅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습지가 생물종 다양성 유지에 중요한 자연공간으로 인식이 바뀌면서 ‘내셔설 트러스트 운동’ 등 보존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습지가 중요한 것은 다양한 생명이 모여 사는 또 하나의 생태계이자 물의 흐름을 조절하고 수질을 정화시키는 ‘자연의 콩팥’이기 때문이다.
1975년 발효된 ‘람사르(Ramsar) 협약’은 가입국의 습지를 보전하는 정책을 이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7월 세계에서 101번째로 ‘람사르 협약’에 가입했다. 전남·북 지역에서는 순천만·보성갯벌을 비롯해 신안 증도갯벌, 무안갯벌, 신안 장도습지, 고창 운곡습지, 고창·부안갯벌 등지가 ‘람사르 습지’로 지정돼 있다.
이 가운데 널리 알려지고 많이 찾는 곳은 ‘세계 5대 연안습지’ 중 하나로 꼽히는 순천만일 것이다. 20여 년 전 처음 방문했을 때 끝없이 펼쳐진 갈대밭과 용산전망대서 바라본 저녁 놀속 S자 물길이 인상적이었다.
보행데크가 놓인 후에 다시 갔을 때는 ‘주먹대장’같이 한쪽 집게발이 유독 커다란 농게가 발밑으로 왔다갔다 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습지는 개발 명목으로 매립되고 있다. 미국은 습지의 54%가 개발돼 없어지고, 뉴질랜드는 90%나 개발됐다고 한다. 그럼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우리나라 역시 국토개발과 간척지 사업을 통해 시화호, 새만금 등지의 갯벌을 매립, 심각하게 파괴되고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네덜란드는 둑을 허물어 간척 농경지를 다시 습지로 되돌리고, 스위스도 직선화한 하천을 구불구불한 원래 모습으로 되돌리는 사업을 벌인다고 한다. 전남도 역시 지난 2009년 진도 소포리 일대 간척지를 대상으로 역(逆) 간척을 추진했지만 토지보상 문제 등으로 인해 무산된 바 있다.
지난 7일은 ‘제13회 세계 습지의 날’이었다. ‘생태도시’를 표방하는 순천에서 ‘한국의 갯벌과 세계의 갯벌’을 주제로 한 생태전문가 초청 강연회와 생태체험 부스가 운영되며 습지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4대강 사업 이후 ‘큰빗이끼벌레’가 번식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으로 환경오염과 개발행위로부터 습지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법들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짬을 내 가까운 곡성 반구정 습지나 담양 하천습지 등지를 찾아 잠자리와 여러 생물을 찾아 봐야겠다.
/song@kwangju.co.kr
수면에는 소금쟁이떼가 바람결에 움직이는 낙화한 꽃잎을 따라 이리저리 미끄러지고 있었다. 이때 연못가 풀줄기에 뭔가 붙어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쪼그리고 앉아 자세히 들여다 보니 자그마한 잠자리 한 쌍이 하트모양을 한 채 짝짓기에 열중하고 있었다. 손가락 두 마디도 채 되지 않을 정도의 크기였다.
두 종류의 잠자리 이름이 너무 궁금해 ‘한국의 잠자리’라는 제목의 도감을 구입해 살펴보니 전자는 ‘아시아실잠자리’, 후자는 ‘나비잠자리’였다.
요즘 습지(濕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육지도, 호수도 아닌 습지는 지구 표면의 6%를 차지하지만 그동안 쓸모없는 땅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습지가 생물종 다양성 유지에 중요한 자연공간으로 인식이 바뀌면서 ‘내셔설 트러스트 운동’ 등 보존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습지가 중요한 것은 다양한 생명이 모여 사는 또 하나의 생태계이자 물의 흐름을 조절하고 수질을 정화시키는 ‘자연의 콩팥’이기 때문이다.
1975년 발효된 ‘람사르(Ramsar) 협약’은 가입국의 습지를 보전하는 정책을 이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7월 세계에서 101번째로 ‘람사르 협약’에 가입했다. 전남·북 지역에서는 순천만·보성갯벌을 비롯해 신안 증도갯벌, 무안갯벌, 신안 장도습지, 고창 운곡습지, 고창·부안갯벌 등지가 ‘람사르 습지’로 지정돼 있다.
이 가운데 널리 알려지고 많이 찾는 곳은 ‘세계 5대 연안습지’ 중 하나로 꼽히는 순천만일 것이다. 20여 년 전 처음 방문했을 때 끝없이 펼쳐진 갈대밭과 용산전망대서 바라본 저녁 놀속 S자 물길이 인상적이었다.
보행데크가 놓인 후에 다시 갔을 때는 ‘주먹대장’같이 한쪽 집게발이 유독 커다란 농게가 발밑으로 왔다갔다 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습지는 개발 명목으로 매립되고 있다. 미국은 습지의 54%가 개발돼 없어지고, 뉴질랜드는 90%나 개발됐다고 한다. 그럼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우리나라 역시 국토개발과 간척지 사업을 통해 시화호, 새만금 등지의 갯벌을 매립, 심각하게 파괴되고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네덜란드는 둑을 허물어 간척 농경지를 다시 습지로 되돌리고, 스위스도 직선화한 하천을 구불구불한 원래 모습으로 되돌리는 사업을 벌인다고 한다. 전남도 역시 지난 2009년 진도 소포리 일대 간척지를 대상으로 역(逆) 간척을 추진했지만 토지보상 문제 등으로 인해 무산된 바 있다.
지난 7일은 ‘제13회 세계 습지의 날’이었다. ‘생태도시’를 표방하는 순천에서 ‘한국의 갯벌과 세계의 갯벌’을 주제로 한 생태전문가 초청 강연회와 생태체험 부스가 운영되며 습지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4대강 사업 이후 ‘큰빗이끼벌레’가 번식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으로 환경오염과 개발행위로부터 습지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법들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짬을 내 가까운 곡성 반구정 습지나 담양 하천습지 등지를 찾아 잠자리와 여러 생물을 찾아 봐야겠다.
/song@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