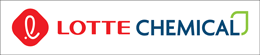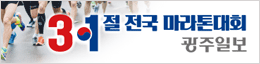[수필의 향기] 웃는 곡비 - 박용수 수필가·동신여고 교사
 |
울고 싶어도 울만한 장소가 없다.
깊은 밤, 울고 싶어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갔는데, 구석에 누가 숨죽여 울고 있었다. 그도 울 곳을 찾아 어지간히 헤맨 것 같다. 차 안이 좋겠다 싶어, 차 안에서 운 적도 있다. 하지만 개운하지 않았다. 누가 우는 때를 맞춰 실컷 울어보려고 장례식장을 기웃거리기도 했다. 그러나 아무도 크게 울지 않았다. 박지원이 통곡할만한 자리라고 한 요동 땅처럼 그런 곳은 없을까.
곡을 대신해 주는 노비, 곡비(哭婢)가 있었다. 참 희귀한 직이다. 누가 부르면 재바르게 가서 울었던 것 같다. 몸을 쇠사슬로 옭아맨 봉비도 비참하려니와 모르는 이를 위해서 곡을 해야 하는 운명이라니….
기구한 운명의 여인, 곡비!
가짜로 곡을 하다 보면 진짜 곡을 하게 되고, 또 진짜 울게 된 곡비, 남을 위해 울다가 자기 서러움에 한이 맺혀 우는 울음이야말로 진짜 울음이 아닐까.
요즘은 장례식장에서도 곡소리가 나지 않는다. 1주일이 멀다 하고 장례식장에 가지만, 곡소리를 들은 지도 까마득하다. 좀 따라서 속 시원하게 울고 싶은데…. 곡은커녕 웃음꽃만 만발한다. 혹여 누구 우는 소리 들으려고 승화원을 기웃거리는 일은 현명한 짓이 아니다.
홍사용이 외쳤던 눈물의 왕은 이제 없다. 이청준의 소설 축제처럼, 장례식은 축제다. 고통스러운 삶을 끝내고 고인이 새로운 삶이 시작했으니 축복이다. 또 자식은 더 요양하지 않아서 좋고 비용도 들지 않아 좋다. 장례는 가식도 없이 솔직하다. 그냥 드러내놓고 활짝 웃는다.
옛날에는 집집이 자식들이 많았다. 배고팠던 시절 고인이 남긴 한 숟가락 밥이 눈물샘을 자극했을 것이다. 구박받고 차별도 받았다. 그 강도에 따라 자식들 곡소리의 깊이나 무게도 각기 달랐다.
웃음은 즉각적이고 일시적이다, 하지만 눈물은 그렇지 않다. 차곡차곡 쌓이고 또 맺혀서 더는 어찌할 수 없을 때 나온다.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전부인 지금, 애지중지 키웠으나 응어리진 것이 있을 리 없다. 그러니 곡이 나올 리도 없다. 곡비가 필요한 시대는 그때보다 지금이 아닐지 모른다.
대신해서 곡을 하는 운명, 망자 혼자 가는 길에 자기 인생을 투영하다 보면 이래저래 뭉친 자기 설움이 돋아날 것이다. 곡비라는 운명에 피눈물이 맺혔을 것이고, 사자의 애환과 자기 애환이 섞여, 생과 사가 반반 섞여, 미움과 분노, 슬픔과 기쁨이 반반씩 섞이면서, 안단테에서 포르테로 가랑비에서 소낙비로…. 곡비의 화음은 사자의 슬픔이 자신의 한으로 변주되는 변곡점에서 최고조였을지 모른다.
노비도 서러운데, 곡비는 또 말해 무엇하랴. 그 천대 속에서 그나마 살 수 있었다면, 그것은 순전히 ‘소리 내서 울 수 있는 특혜’ 때문은 아닐까. 절망을 펑펑 쏟아낼 수 있는 곡, 타인의 죽음에 자신의 속 것을 몽땅 쏟아낼 수 있었기에 고통을 견디고 지난한 삶을 정화할 수 있지 않았을까.
친구 부친상에 아무도 울지 않았다. 이상한 일도 아니지만 헛헛했다. 우는 게 창피한 일이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곡소리가 났다. 등이 휘고 백발인 노인이 통곡하며 들어왔다. 그러자 울지 않던 가족들이 하나둘 따라서 울기 시작했다.
얼마 후에, 상주에게 누구냐고 물었다. 고인의 여동생이란다. 어찌나 슬프게 울어서 따라 울다 보니, 자기도 눈물보가 터졌단다.
그녀의 시원한 울음, 막힘없는 울음, 고인도 미련 없이 이승을 하직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눈물은 금방 그쳤고 다시 화기애애해졌다. 멀리서 노인을 바라보았다.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것같이 추레했다. 노인이 유독 크게 운 것은 오빠의 죽음 때문이겠지만 어쩌면 자기 연민은 아니었을까. 성큼 다가온 죽음이 남의 일 같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누군가를 위해 흘리는 눈물 한 방울, 누군가를 향한 연민 한 조각은 인간이 언제나 간직해야 할 고귀한 마음이고 사랑이다.
타인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는 삭막한 세상에 살고 있다. 나 역시 누구의 눈물샘을 자극할 정도로 강렬하게 살아본 적이, 아니 울어본 적이 없다. 고인은 적어도 이 순간만은 누구보다 잘산 사람으로 보인다.
고개를 돌려보니 울음을 통째 쏟아낸 그가 환히 웃고 있다. 그 옛날 곡비처럼….
깊은 밤, 울고 싶어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갔는데, 구석에 누가 숨죽여 울고 있었다. 그도 울 곳을 찾아 어지간히 헤맨 것 같다. 차 안이 좋겠다 싶어, 차 안에서 운 적도 있다. 하지만 개운하지 않았다. 누가 우는 때를 맞춰 실컷 울어보려고 장례식장을 기웃거리기도 했다. 그러나 아무도 크게 울지 않았다. 박지원이 통곡할만한 자리라고 한 요동 땅처럼 그런 곳은 없을까.
기구한 운명의 여인, 곡비!
가짜로 곡을 하다 보면 진짜 곡을 하게 되고, 또 진짜 울게 된 곡비, 남을 위해 울다가 자기 서러움에 한이 맺혀 우는 울음이야말로 진짜 울음이 아닐까.
요즘은 장례식장에서도 곡소리가 나지 않는다. 1주일이 멀다 하고 장례식장에 가지만, 곡소리를 들은 지도 까마득하다. 좀 따라서 속 시원하게 울고 싶은데…. 곡은커녕 웃음꽃만 만발한다. 혹여 누구 우는 소리 들으려고 승화원을 기웃거리는 일은 현명한 짓이 아니다.
옛날에는 집집이 자식들이 많았다. 배고팠던 시절 고인이 남긴 한 숟가락 밥이 눈물샘을 자극했을 것이다. 구박받고 차별도 받았다. 그 강도에 따라 자식들 곡소리의 깊이나 무게도 각기 달랐다.
웃음은 즉각적이고 일시적이다, 하지만 눈물은 그렇지 않다. 차곡차곡 쌓이고 또 맺혀서 더는 어찌할 수 없을 때 나온다.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전부인 지금, 애지중지 키웠으나 응어리진 것이 있을 리 없다. 그러니 곡이 나올 리도 없다. 곡비가 필요한 시대는 그때보다 지금이 아닐지 모른다.
대신해서 곡을 하는 운명, 망자 혼자 가는 길에 자기 인생을 투영하다 보면 이래저래 뭉친 자기 설움이 돋아날 것이다. 곡비라는 운명에 피눈물이 맺혔을 것이고, 사자의 애환과 자기 애환이 섞여, 생과 사가 반반 섞여, 미움과 분노, 슬픔과 기쁨이 반반씩 섞이면서, 안단테에서 포르테로 가랑비에서 소낙비로…. 곡비의 화음은 사자의 슬픔이 자신의 한으로 변주되는 변곡점에서 최고조였을지 모른다.
노비도 서러운데, 곡비는 또 말해 무엇하랴. 그 천대 속에서 그나마 살 수 있었다면, 그것은 순전히 ‘소리 내서 울 수 있는 특혜’ 때문은 아닐까. 절망을 펑펑 쏟아낼 수 있는 곡, 타인의 죽음에 자신의 속 것을 몽땅 쏟아낼 수 있었기에 고통을 견디고 지난한 삶을 정화할 수 있지 않았을까.
친구 부친상에 아무도 울지 않았다. 이상한 일도 아니지만 헛헛했다. 우는 게 창피한 일이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곡소리가 났다. 등이 휘고 백발인 노인이 통곡하며 들어왔다. 그러자 울지 않던 가족들이 하나둘 따라서 울기 시작했다.
얼마 후에, 상주에게 누구냐고 물었다. 고인의 여동생이란다. 어찌나 슬프게 울어서 따라 울다 보니, 자기도 눈물보가 터졌단다.
그녀의 시원한 울음, 막힘없는 울음, 고인도 미련 없이 이승을 하직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눈물은 금방 그쳤고 다시 화기애애해졌다. 멀리서 노인을 바라보았다.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것같이 추레했다. 노인이 유독 크게 운 것은 오빠의 죽음 때문이겠지만 어쩌면 자기 연민은 아니었을까. 성큼 다가온 죽음이 남의 일 같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누군가를 위해 흘리는 눈물 한 방울, 누군가를 향한 연민 한 조각은 인간이 언제나 간직해야 할 고귀한 마음이고 사랑이다.
타인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는 삭막한 세상에 살고 있다. 나 역시 누구의 눈물샘을 자극할 정도로 강렬하게 살아본 적이, 아니 울어본 적이 없다. 고인은 적어도 이 순간만은 누구보다 잘산 사람으로 보인다.
고개를 돌려보니 울음을 통째 쏟아낸 그가 환히 웃고 있다. 그 옛날 곡비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