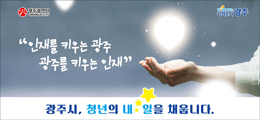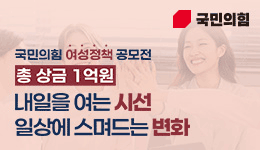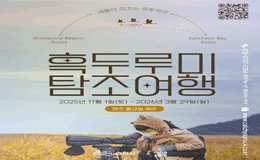[수필의 향기] 진짜 시인 - 박용수 수필가·동신여고 교사
 |
출근길에 차를 보고 깜짝 놀랐다. 거미줄에 걸린 것처럼 날벌레들이 주렁주렁 걸려 죽어있었다. 어젯밤 야간 운전 결과였다. 하루 산다는 그 하루조차 다 살지 못한 하루살이 부스러기들이 내 자동차에 산산이 으깨져 있었다.
뭉개진 것 중에는 아직도 숨이 붙어있는 것도 있었다. 헤드라이트 주변이 더욱 그랬다. 내게는 앞길을 안내하는 찬란한 빛이었으나 하루살이에게는 죽음을 유혹하는 빛이었다니, 참혹했다.
아는 친구가 ‘문학 맛보기’만 해달라고 부탁해서 기꺼이 첫날 저녁, 곡성 목사동면 어느 마을회관에 문학 강의를 다녀오다 당한 봉변이었다. 강의가 늦게 끝나자 속도를 냈다. 그런데 그 불빛과 속도가 문제였다. 나 하나 빨리 가자고 이렇게 많은 벌레가 죽어도 되는가.
예전에 경험과 비슷하게 이곳 마을어른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 역시 언어였다. 그리고 그 시어를 끝내거나 연결하는 서사를 어렵게 생각하셨다. 그래서 나는 두 노래를 연이어 들려주며 수업을 시작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어른들은 절로 콧노래로 따라 부르고 있었다. 이건 노래가 아니라 시라며, 시도 이렇게 노래처럼 읽고 쓰고 이해하면 좋겠다고 했다. 그리고 강의를 마치니 시골 분들이 옥수수, 호박 따위를 챙겨주셨다. 압록에서 돌실 가는 자동차는 모두 바빴다. 도시에서 집으로 가는 차들이 마치 영화처럼 추격전을 펼치며 내달렸다.
오늘 귀갓길은 일부러 자동차 길을 택하지 않고 강 건너 구불구불한 마을길을 택했다. 좀 불편했지만 상향등을 끄고 속도도 줄였다. 여남은 오리 새끼들이 길에서 놀다가 내 불빛에 황급히 좌우로 흩어졌다. 난 차를 옆에 대고 시동을 껐다. 벼 포기 사이에서 오리 새끼들이 나와서 옹기종기 갈 길을 갔다. 어슴푸레한 달빛이 앞섰다. 다시 시동을 켰다. 논에 무언가가 비췄다. 어둠 속에서 동글동글 두 개가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저게 뭐지!’
고라니가 저녁 식사 중이었다. 하얗게 발하던 그 눈빛은 자세히 보내 푸른색을 띠고 나를 보더니 이내 언덕으로 사라졌다. 나를 사냥꾼으로 생각했을지 모른다. 자동차의 불빛, 하늘의 별빛, 고라니의 그 파란 눈빛이 스쳐 지나갔다. 나를 단박 사로잡는 푸른 영혼의 눈빛, 오래도록 영감을 주는 빛이었다.
어제는 급히 가기 바빴던 강변이었는데, 천천히 가다보니 정말 강변의 금모래와 하늘의 별들이 내게 반짝반짝, 진짜 내게 시가 되어 다가왔다. 언어의 포장을 벗고 다가온 실물들, 시 속의 언어가 진짜가 되어 다가왔다. 어젯밤엔 바삐 가느라 놓친 것들이었다. 강변 금모래가 하늘의 별이 반짝반짝 나와 동승했다. 별들은 자동차 불빛처럼 강렬하지 않았고 하루살이를 유혹하던 광란의 불빛이 아니었다. 만져도 부딪혀도 죽지 않는 빛이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의 반짝반짝 살아있는 눈빛이 떠올랐다. 어떻게 시를 가르치나 평가하려는 도시 사람들 눈빛과 완전 달랐다. 고라니 눈처럼 푸른 영혼을 가진 눈빛이었고, 하늘의 별빛이나 강여울의 윤슬을 닮은 눈빛이었다. 시와 함께 사는 사람들, 삶이 시였고 처음부터 시인이었던 사람들 같았다.
‘나비와 꽃송이 되어 다시 만나랴~!’, ‘들에는 반짝이는 금모래 빛~’
그런데 누가 강변에 살지? 강변에 산 적이 없는 사람이 평생 강변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시를 이야기해도 되나? 그래도 될까?
나는 강변 살자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분들은 이미 강변에 사는 사람들이었다. 나는 어디서 다시 만날 순간을 노래하는 이라면 그분들은 오래전부터 강과 오리와 고라니와 별과 함께 만난 이들이었다. 내 눈이 자동차처럼 문명의 앞만 밝히는 눈이었다면 이 분들의 눈은 별빛과 윤슬 그리고 사슴 그대로의 눈빛이었다. 언어에 갇힌, 화려한 수사와 분식으로 치장한 도시 시인들과 달리, 다른 존재 다른 사물과 교감하는 마음의 불빛, 언어를 초월한 영롱한 영혼을 켜고 있었다.
내가 틀렸다. 시는 언어가 아니었다. 마음이었다. 영혼이었다. 하루살이의 죽음을 목격했던 때보다 더 큰 충격이었다. 시를 사랑하는 사람은 온몸으로 시를 쓴다고 깝죽대는 시인들이 아니라, 이곳 농민들이야말로 진짜 온몸으로 시를 사랑하는 오염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뭉개진 것 중에는 아직도 숨이 붙어있는 것도 있었다. 헤드라이트 주변이 더욱 그랬다. 내게는 앞길을 안내하는 찬란한 빛이었으나 하루살이에게는 죽음을 유혹하는 빛이었다니, 참혹했다.
예전에 경험과 비슷하게 이곳 마을어른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 역시 언어였다. 그리고 그 시어를 끝내거나 연결하는 서사를 어렵게 생각하셨다. 그래서 나는 두 노래를 연이어 들려주며 수업을 시작했다.
어른들은 절로 콧노래로 따라 부르고 있었다. 이건 노래가 아니라 시라며, 시도 이렇게 노래처럼 읽고 쓰고 이해하면 좋겠다고 했다. 그리고 강의를 마치니 시골 분들이 옥수수, 호박 따위를 챙겨주셨다. 압록에서 돌실 가는 자동차는 모두 바빴다. 도시에서 집으로 가는 차들이 마치 영화처럼 추격전을 펼치며 내달렸다.
오늘 귀갓길은 일부러 자동차 길을 택하지 않고 강 건너 구불구불한 마을길을 택했다. 좀 불편했지만 상향등을 끄고 속도도 줄였다. 여남은 오리 새끼들이 길에서 놀다가 내 불빛에 황급히 좌우로 흩어졌다. 난 차를 옆에 대고 시동을 껐다. 벼 포기 사이에서 오리 새끼들이 나와서 옹기종기 갈 길을 갔다. 어슴푸레한 달빛이 앞섰다. 다시 시동을 켰다. 논에 무언가가 비췄다. 어둠 속에서 동글동글 두 개가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저게 뭐지!’
고라니가 저녁 식사 중이었다. 하얗게 발하던 그 눈빛은 자세히 보내 푸른색을 띠고 나를 보더니 이내 언덕으로 사라졌다. 나를 사냥꾼으로 생각했을지 모른다. 자동차의 불빛, 하늘의 별빛, 고라니의 그 파란 눈빛이 스쳐 지나갔다. 나를 단박 사로잡는 푸른 영혼의 눈빛, 오래도록 영감을 주는 빛이었다.
어제는 급히 가기 바빴던 강변이었는데, 천천히 가다보니 정말 강변의 금모래와 하늘의 별들이 내게 반짝반짝, 진짜 내게 시가 되어 다가왔다. 언어의 포장을 벗고 다가온 실물들, 시 속의 언어가 진짜가 되어 다가왔다. 어젯밤엔 바삐 가느라 놓친 것들이었다. 강변 금모래가 하늘의 별이 반짝반짝 나와 동승했다. 별들은 자동차 불빛처럼 강렬하지 않았고 하루살이를 유혹하던 광란의 불빛이 아니었다. 만져도 부딪혀도 죽지 않는 빛이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의 반짝반짝 살아있는 눈빛이 떠올랐다. 어떻게 시를 가르치나 평가하려는 도시 사람들 눈빛과 완전 달랐다. 고라니 눈처럼 푸른 영혼을 가진 눈빛이었고, 하늘의 별빛이나 강여울의 윤슬을 닮은 눈빛이었다. 시와 함께 사는 사람들, 삶이 시였고 처음부터 시인이었던 사람들 같았다.
‘나비와 꽃송이 되어 다시 만나랴~!’, ‘들에는 반짝이는 금모래 빛~’
그런데 누가 강변에 살지? 강변에 산 적이 없는 사람이 평생 강변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시를 이야기해도 되나? 그래도 될까?
나는 강변 살자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분들은 이미 강변에 사는 사람들이었다. 나는 어디서 다시 만날 순간을 노래하는 이라면 그분들은 오래전부터 강과 오리와 고라니와 별과 함께 만난 이들이었다. 내 눈이 자동차처럼 문명의 앞만 밝히는 눈이었다면 이 분들의 눈은 별빛과 윤슬 그리고 사슴 그대로의 눈빛이었다. 언어에 갇힌, 화려한 수사와 분식으로 치장한 도시 시인들과 달리, 다른 존재 다른 사물과 교감하는 마음의 불빛, 언어를 초월한 영롱한 영혼을 켜고 있었다.
내가 틀렸다. 시는 언어가 아니었다. 마음이었다. 영혼이었다. 하루살이의 죽음을 목격했던 때보다 더 큰 충격이었다. 시를 사랑하는 사람은 온몸으로 시를 쓴다고 깝죽대는 시인들이 아니라, 이곳 농민들이야말로 진짜 온몸으로 시를 사랑하는 오염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