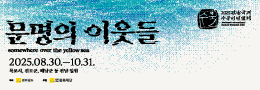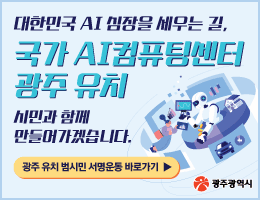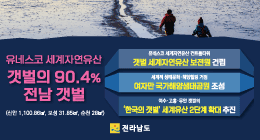[수필의 향기] 매미, 한 생의 문장- 김향남 수필가
 |
비가 갠 아침, 어디선가 매미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소리의 출처는 안방 창문 쪽. 방충망에 착 달라붙은 매미 한 마리가 기세 좋게 울고 있다. 신생아의 첫울음처럼 방 안 가득 싱싱한 기운을 퍼뜨린다. 오호라, 여기까지 찾아와준 것도 고맙고 이렇게 우는 것은 더 뭉클한 일이다.
매미는, 어쩐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무엇이다. 해마다 같은 계절, 같은 시간에 울지만, 그 울음은 같으면서도 같지 않다. 여름이면 늘 있었던 익숙한 소리지만, 작년의 내가 듣던 울음과 올해의 내가 듣는 울음은 전혀 다르다. 같은 소리, 그러나 다른 마음.
누군가에겐 매미 울음이 잊었던 여름의 냄새를, 또 다른 이에겐 오래 묵힌 그리움을 꺼내게 한다. 작년의 나는 아득한 어린 날의 기억을 떠올렸지만, 올해의 나는 어떤 상실 앞에서 매미를 듣고 있다. 내년의 나는 또 다른 자리에서, 또 다른 마음으로 이 울음을 듣게 되겠지.
매미의 생은 더욱 우리를 멈춰 세운다. 땅속에서 수년을 버티며 견뎌낸 뒤, 지상에서 겨우 며칠 남짓 울다가 생을 마감하는 존재. 눈앞에 보이는 시간은 찰나이지만, 그 울음은 오랜 기다림 끝에 터진 것이다. 생의 대부분을 침묵으로 채우고, 마지막 순간을 울음으로 불태우는 생. 그 안에 담긴 절박하고 비장한 곡조가 듣는 사람의 마음조차 서늘하게 뒤흔든다.
옛사람들도 매미의 울음을 허투루 듣지 않았나 보다. 그들은 매미에게서 다섯 가지 덕을 보았다. 머리의 관은 군자의 기품을, 높은 가지에 매달린 습성은 고결함을, 이슬만을 먹는 습성은 청렴함을, 먼저 울어 계절을 알리는 모습은 성실과 용기를, 죽어서도 곧바로 떨어지지 않는 습성은 절개를 상징한다고 했다. 요컨대 매미는 고결한 정신의 표상으로, 올곧은 선비의 문장으로 비유되기도 했다.
실제로 매미의 울음은 하나의 문장과도 같다. 침묵의 세월을 지나 마침내 울 수 있게 되었을 때, 매미는 목청이 아닌 몸 전체로 노래한다. 그 울음은 단순한 생존의 신호를 넘어 자기 존재를 남기려는 간절한 전문(傳文)이다. 말이 없던 생애를 대신해 울음으로 말하는 존재. 그 울음에는 기다림의 무게와 순간의 빛이 하나로 겹쳐 있어, 듣는 이로 하여금 자신만의 여름을 떠올리게 한다. 사람들이 매미에 귀 기울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매미의 울음은 여름이라는 한 삶을 통째로 넘기는 소리다. 여름은 충만과 절정의 계절이다. 봄이 약속과 시작의 계절이라면, 여름은 이미 도달한 생의 한가운데를 드러낸다. 숨길 것도 감출 것도 없이 빛과 열과 생의 절정을 쏟아내는 계절. 그래서 여름의 문장은 뜨겁고 격렬하며 단 한 번의 절정에서 숨을 멈춘다. 너무 꽉 차서 오래 머무를 수도 없다.
여름의 문장은 덧없음의 문장이기도 하다. 너무 충만해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 순간의 빛과 열은 붙잡을 수 없기에, 우리는 더더욱 귀 기울여 기억하려 애쓴다. 땅속의 긴 침묵과 지상의 짧은 절정이 한 줄기 울음으로 연결될 때, 그 문장은 종이에 쓰이지 않고 공기 속에 퍼져 나뭇잎을 타고 흐른다. 그 소리는 마음속 깊이 스며들어 각자의 이야기로 자라난다.
매미의 울음은 단순한 생존의 외침이 아니다. 그것은 몸을 문장 삼아 써 내려간 삶의 문장이다. 긴 기다림을 거쳐 비로소 허물을 벗고, 세상을 향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써 내려간 글. 그 문장엔 문법도 없고 수사도 없지만, 존재의 전력을 다해서 쓴 절절한 고백이 담겨 있다.
텅 빈 방충망을 바라보다가, 나는 그 소리에 깃든 여운을 다시 돌아본다. 매미는 울고 갔지만, 그 소리는 여전히 이곳에 남아 있다. 시끄럽다고 고개를 돌리기엔, 너무 오래 침묵한 생의 진동이 그 속에 있다. 잠시 스쳐 갔을 뿐인 한 존재의 숨결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말 속에서 삶을 읽는다. 매미의 울음 속에도 땅속에서 보낸 긴 기다림과 지상에서의 짧은 절정이 한꺼번에 녹아 있다. 거기에는 ‘살았다’라는 증명과 ‘다녀감’이라는 흔적이 오롯이 남는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는 일은 한 생의 시작과 끝을 동시에 목격하는 일과도 같다.
올여름, 한 마리 매미의 울음을 들었다면, 그것은 한 생의 문장을 읽은 것이다. 그 문장은 뜨겁고도 짧아 읽는 순간 이미 사라져버릴지 모른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읽고, 또 쓰고 있을 것이다.
매미는, 어쩐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무엇이다. 해마다 같은 계절, 같은 시간에 울지만, 그 울음은 같으면서도 같지 않다. 여름이면 늘 있었던 익숙한 소리지만, 작년의 내가 듣던 울음과 올해의 내가 듣는 울음은 전혀 다르다. 같은 소리, 그러나 다른 마음.
매미의 생은 더욱 우리를 멈춰 세운다. 땅속에서 수년을 버티며 견뎌낸 뒤, 지상에서 겨우 며칠 남짓 울다가 생을 마감하는 존재. 눈앞에 보이는 시간은 찰나이지만, 그 울음은 오랜 기다림 끝에 터진 것이다. 생의 대부분을 침묵으로 채우고, 마지막 순간을 울음으로 불태우는 생. 그 안에 담긴 절박하고 비장한 곡조가 듣는 사람의 마음조차 서늘하게 뒤흔든다.
실제로 매미의 울음은 하나의 문장과도 같다. 침묵의 세월을 지나 마침내 울 수 있게 되었을 때, 매미는 목청이 아닌 몸 전체로 노래한다. 그 울음은 단순한 생존의 신호를 넘어 자기 존재를 남기려는 간절한 전문(傳文)이다. 말이 없던 생애를 대신해 울음으로 말하는 존재. 그 울음에는 기다림의 무게와 순간의 빛이 하나로 겹쳐 있어, 듣는 이로 하여금 자신만의 여름을 떠올리게 한다. 사람들이 매미에 귀 기울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매미의 울음은 여름이라는 한 삶을 통째로 넘기는 소리다. 여름은 충만과 절정의 계절이다. 봄이 약속과 시작의 계절이라면, 여름은 이미 도달한 생의 한가운데를 드러낸다. 숨길 것도 감출 것도 없이 빛과 열과 생의 절정을 쏟아내는 계절. 그래서 여름의 문장은 뜨겁고 격렬하며 단 한 번의 절정에서 숨을 멈춘다. 너무 꽉 차서 오래 머무를 수도 없다.
여름의 문장은 덧없음의 문장이기도 하다. 너무 충만해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 순간의 빛과 열은 붙잡을 수 없기에, 우리는 더더욱 귀 기울여 기억하려 애쓴다. 땅속의 긴 침묵과 지상의 짧은 절정이 한 줄기 울음으로 연결될 때, 그 문장은 종이에 쓰이지 않고 공기 속에 퍼져 나뭇잎을 타고 흐른다. 그 소리는 마음속 깊이 스며들어 각자의 이야기로 자라난다.
매미의 울음은 단순한 생존의 외침이 아니다. 그것은 몸을 문장 삼아 써 내려간 삶의 문장이다. 긴 기다림을 거쳐 비로소 허물을 벗고, 세상을 향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써 내려간 글. 그 문장엔 문법도 없고 수사도 없지만, 존재의 전력을 다해서 쓴 절절한 고백이 담겨 있다.
텅 빈 방충망을 바라보다가, 나는 그 소리에 깃든 여운을 다시 돌아본다. 매미는 울고 갔지만, 그 소리는 여전히 이곳에 남아 있다. 시끄럽다고 고개를 돌리기엔, 너무 오래 침묵한 생의 진동이 그 속에 있다. 잠시 스쳐 갔을 뿐인 한 존재의 숨결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말 속에서 삶을 읽는다. 매미의 울음 속에도 땅속에서 보낸 긴 기다림과 지상에서의 짧은 절정이 한꺼번에 녹아 있다. 거기에는 ‘살았다’라는 증명과 ‘다녀감’이라는 흔적이 오롯이 남는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는 일은 한 생의 시작과 끝을 동시에 목격하는 일과도 같다.
올여름, 한 마리 매미의 울음을 들었다면, 그것은 한 생의 문장을 읽은 것이다. 그 문장은 뜨겁고도 짧아 읽는 순간 이미 사라져버릴지 모른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읽고, 또 쓰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