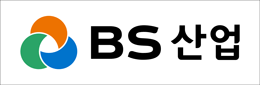[서효인의 ‘소설처럼’] 긴급한 사태 앞에서 깊고 길게 사유하기 -2025년 봄호 문예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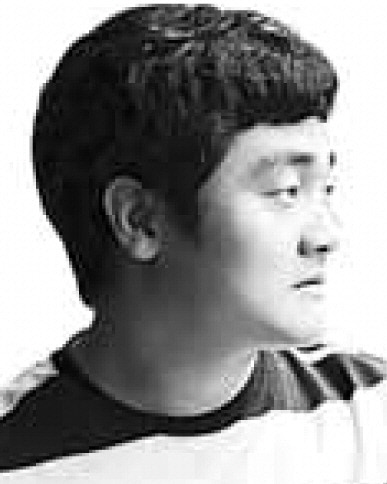 |
지연된 정의라 하더라도 정의가 아닌 것보다는 낫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4월 4일로 밝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선고일을 두고 하는 말이다. 비상계엄이 12월 3일 밤에 있었으니 꼬박 넉 달을 채운 셈이다. 파면이 인용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나 미래는 모르는 일이다. 그날 밤이 되기 전까지 비상계엄이 있으리라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 영장을 발부했다고 하여 법원에 폭동이 일어날 것이리라 생각한 사람 역시 없다. 구속 취소와 즉시항고 포기는 어떠했는가. 불확실한 미래는 불안을 키운다.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우리의 영혼은 잠식당했다. 그럼에도 4월 4일, 피소추인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민주주의의 영혼이 회복되리라 믿는다. 우리는 앞발에 걸리는 돌멩이는 못 보았지만, 멀리에 산등성이는 계속해서 보아왔다. 이제 거의 도착이다.
2024년 겨울, 비상계엄 이후 2025년 봄에 출간된 각종 문예지에서는 지나칠 수 없는 긴급한 사태에 긴밀하게 반응했다. 한때 지성계와 문학계를 아우르며 시대를 풍미했던 문예지는 속도와 영상의 시대에 접어든 지금까지도 다수가 계절에 한 번 책을 내는 계간지로 출간된다.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창작과비평’, ‘문학과사회’, ‘문학동네’가 대표적이다. 이와 같은 시스템은 요즘 들어 더욱 구닥다리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각종 뉴스는 하루는커녕 반나절도 되지 않아 지나간 소식이 되어버린다. 독자는 오랜 사유 끝에 탄생한 길고 깊은 콘텐츠보다는 엄지손가락으로 툭툭 넘겨 볼 수 있는 짧디짧은 콘텐츠를 선호하는 듯하다. 게다가 비상계엄이라니, 이후 이어진 숨 가쁜 변곡점을 계간지가 다루기에는 벅차 보일 수도 있다.
문학과사회는 매호 별권으로 내는 문학과사회-하이픈에서 작가 열다섯 명의 글을 모아 ‘탄핵-일지’를 꾸렸다. 글은 윤석열 구속취소 이전에 마감된 듯하다.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탄핵 절차에 대한 불안감과 절차와 법규에 따라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는 기대감이 공존한다. 작가들은 섣불리 전망하거나 확신하기보다 혼란해하거나 침잠하길 택한다. 허약하기 짝이 없는 사회와 제도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기도 한다. 남태령의 빛을 생각하며 김수영을 떠올리기도 하고 혐오를 혐오하는 일의 아이러니를 고민하기도 한다. 그들 중 누구도 사태를 평론하지 않았다. 작가는 우선 기록할 뿐이다. 기자가 현상을 기록한다면 작가는 내면을 기록한다. 개인의 내면이 모여 사회의 내면을 이룬다. 내란 앞에서 작가가 기록할 내면은 물론 사회의 내면이다. 우리의 안쪽은 대체 어떻게 생겨 먹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작가들은 집요하게 파고들고, 회고하며, 고백한다.
문학동네의 특집도 ‘내란 일지’이다. 어쩌면 우리는 탄핵과 내란과 같은 쇳소리 나는 단어를 왕복하며 이 시간을 견뎌왔는지도 모른다. 앞서 언급한 ‘탄핵-일지’가 기록이라면 ‘내란-일지’는 질문에 가까운 듯하다. 지난겨울 우리가 겪은 것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또 무엇인지, 너무 참담하고 또한 너무 어려워서 피하고 싶은 질문 앞에 우리를 데려다 놓는다. 응원봉 집회가 부른 것의 기저에 있는 문화적 의미를 되짚는다. 그 집회를 주도한 여성의 광장 참여는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인지 살펴본다. 대한민국에서 친위 쿠데타라니, 이러한 서사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왔다. 우리는 불가능의 가능성이라는 불확실성 위에, 제대로 된 플롯을 구성하려 한다. 그것을 민주주의의 서사 구조라고 해도 될까. 우리가 원하는 건 어쩌면 말이 되는 이야기가 전부일 수 있다. 우리에게 정치과 헌법에 있어 말이 되는 서사는 오직 민주주의뿐이다.
창작과비평은 ‘K민주주의의 약진’이라는 특집으로 우리 사회의 회복력을 신뢰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이번 겨울 우리의 움직임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의 모범이 될 것이라 확언한다. ‘변혁적 중도’라는 개념을 설파하고 혐오의 꼬리를 끊어내야 할 당위를 강화한다. 기득권 유지에만 혈안이 된 보수세력에 대한 분석도 꼭 필요한 논지로 보인다.
매일 속보가 쏟아진다. 당장 4월 4일 이후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은 소식에 휘둘릴 것인가. 그 소식을 쌓아놓고 깊이 그리고 길게 사유하는 일은 중요하다. 역사적 급변 사태 앞에서 그 일은 더욱 소중할 것이다. 참혹한 겨울을 지나온 우리가 올해 봄호 문예지들을 읽어야 할 이유다. <시인>
문학동네의 특집도 ‘내란 일지’이다. 어쩌면 우리는 탄핵과 내란과 같은 쇳소리 나는 단어를 왕복하며 이 시간을 견뎌왔는지도 모른다. 앞서 언급한 ‘탄핵-일지’가 기록이라면 ‘내란-일지’는 질문에 가까운 듯하다. 지난겨울 우리가 겪은 것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또 무엇인지, 너무 참담하고 또한 너무 어려워서 피하고 싶은 질문 앞에 우리를 데려다 놓는다. 응원봉 집회가 부른 것의 기저에 있는 문화적 의미를 되짚는다. 그 집회를 주도한 여성의 광장 참여는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인지 살펴본다. 대한민국에서 친위 쿠데타라니, 이러한 서사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왔다. 우리는 불가능의 가능성이라는 불확실성 위에, 제대로 된 플롯을 구성하려 한다. 그것을 민주주의의 서사 구조라고 해도 될까. 우리가 원하는 건 어쩌면 말이 되는 이야기가 전부일 수 있다. 우리에게 정치과 헌법에 있어 말이 되는 서사는 오직 민주주의뿐이다.
창작과비평은 ‘K민주주의의 약진’이라는 특집으로 우리 사회의 회복력을 신뢰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이번 겨울 우리의 움직임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의 모범이 될 것이라 확언한다. ‘변혁적 중도’라는 개념을 설파하고 혐오의 꼬리를 끊어내야 할 당위를 강화한다. 기득권 유지에만 혈안이 된 보수세력에 대한 분석도 꼭 필요한 논지로 보인다.
매일 속보가 쏟아진다. 당장 4월 4일 이후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은 소식에 휘둘릴 것인가. 그 소식을 쌓아놓고 깊이 그리고 길게 사유하는 일은 중요하다. 역사적 급변 사태 앞에서 그 일은 더욱 소중할 것이다. 참혹한 겨울을 지나온 우리가 올해 봄호 문예지들을 읽어야 할 이유다.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