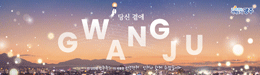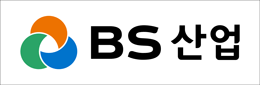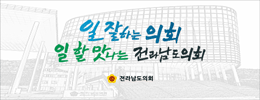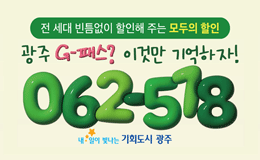일본 불교와 카레라이스- 중현 광주 증심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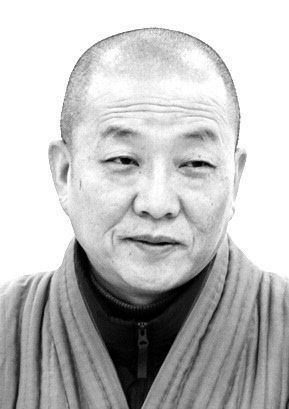 |
카레라이스는 인도 요리일까? 일본 요리일까? 언뜻 생각하기엔 인도 요리 같은데 ‘카레라이스’ 자체는 일본 요리로 보는 것이 중론이다. 먼저 커리(curry)는 “강황을 비롯한 여러 향신료들을 넣어 만든 배합 향신료인 마살라를 사용해 채소나 고기 등으로 맛을 낸 인도 요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영국은 이백 년 가까이 인도를 식민 통치했다. 아마도 인도의 많고도 많은 향신료 중에서 강황이 그나마 영국인들 입에 맞았던 모양이다. 영국으로 건너간 커리에 들어간 향신료는 강황 가루뿐이어서, 마살라로 만든 인도 고유의 커리와는 이미 거리가 있었다. 이렇게 영국화된 커리는 19세기 영국 해군을 통해 일본으로까지 전해지게 되었다. 일본에 들어온 커리는 일본화의 과정을 거치며 이름도 ‘카레’로 바뀌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날 일본의 국민식이라 할 정도로 일본인의 인기를 한 몸에 받는 바로 그 카레라이스가 탄생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 마살라는 인도를 포함한 남아시아에서 두루 통용되는 소스로, 강황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향신료를 배합한 것이다. 그래서 지방마다, 지역마다 심지어 만드는 사람마다 다른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카레라이스의 카레는 강황을 주 재료로 하고 있다. 그리고 커리는 주로 인도식 빵인 ‘난’과 함께 먹지만, 카레라이스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애초부터 밥과 한 세트이다.
일본 불교는 마치 카레라이스와도 같다. 일본의 가장 큰 종파라는 정토진종은 오직 ‘나무아미타불’만 외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한다. 또 다른 종파인 일련정종은 ‘나무묘법연화경’, 이 일곱 글자만 외면 만사형통이다. 선종을 내세우는 조동종은 좌선만을 강조한다.
인도의 마살라와 영국의 커리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카레라이스로 바꾸어버린 것처럼,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뿌리 깊은 전통신앙인 신도와 불교를 융합하여 일본 특유의 불교를 만들어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인들은 불교를 해체하여 자신들에게 부합되는 것들만 취사선택했다. 그러나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으로 실천하는 지계(持戒), 마음을 닦는 선정(禪定), 연기법의 진리를 밝히는 지혜(智慧), 이 세 가지가 한 몸이어서 각자 떨어질 수 없다.
일본에서는 갓난 아이가 태어나면 먼저 신사의 신들에게 신고한다. 결혼식은 기독교의 교회나 호텔에서 올리지만 장례는 사찰에서 불교식으로 한다. 그래서 일본에는 애초부터 결혼식만 주로 할 용도로 만들어진 교회도 있다고 한다. 홋카이도에 있다는 안도 다다오의 그 유명한 ‘물의 교회’가 이런 경우이다. 또 일본의 부자는 무덤이 세 개라고 한다. 하나는 다니던 사찰에, 또 하나는 고향에, 마지막 하나는 진언종의 총본산이 있는 고야산의 오쿠보인에 있다고 한다.
이런 몇몇 사실들만 보더라도 종교가 일본인들의 일상 속에 깊숙이 파고들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올바른 삶의 기준으로서의 종교라기보다, 으레 치뤄야 하는 통과의례, 그래서 하지 않으면 왠지 마음 한 구석이 찜찜한 그 무엇에 가깝다.
지난주 일본 불교의 실제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일본 불교 답사를 다녀왔다. 답사 둘째 날, 정토진종의 총본산인 니시혼간지(서본원사)를 찾았다. 마침 유치원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주지스님(?)과 함께 단체사진을 찍고 있었다. 검정색 승복을 차려 입었지만 삭발을 하지 않은 주지스님은 매우 세련된 이웃 종교의 성직자 같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정장으로 한껏 차려 입은 젊은 학부모들과 오랜 시간동안 한 마디 말 없이 미동도 하지 않는 아이들도 한국에서 온 승려인 나의 눈에는 무척 생경하게 다가왔다. 분명 불교의 외형을 띄고 있었지만 불교적이지 않은 묘한 분위기였다. 압도적인 규모의 법당과 경내의 여러 다양한 시설들을 접할 때도 역시 같은 느낌이었다.
일본의 카레라이스도 맛있는 요리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다양한 향신료를 배합하는 마살라 본연의 풍미를 카레라이스에서 기대하기는 힘들다. 불교가 인도를 벗어나 세계로 퍼져 나가는 과정은 곧 불교의 해체와 재구성의 과정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불교는 시대와 사회에 부합하는 종교로 재탄생했다. 오늘날 불교가 가지는 다양한 얼굴에는 이런 이유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체와 종합의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불교의 핵심 정신이다. 일본 불교는 불교가 변화를 꾀할 때 유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말해 주고 있다.
영국은 이백 년 가까이 인도를 식민 통치했다. 아마도 인도의 많고도 많은 향신료 중에서 강황이 그나마 영국인들 입에 맞았던 모양이다. 영국으로 건너간 커리에 들어간 향신료는 강황 가루뿐이어서, 마살라로 만든 인도 고유의 커리와는 이미 거리가 있었다. 이렇게 영국화된 커리는 19세기 영국 해군을 통해 일본으로까지 전해지게 되었다. 일본에 들어온 커리는 일본화의 과정을 거치며 이름도 ‘카레’로 바뀌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날 일본의 국민식이라 할 정도로 일본인의 인기를 한 몸에 받는 바로 그 카레라이스가 탄생하였다.
인도의 마살라와 영국의 커리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카레라이스로 바꾸어버린 것처럼,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뿌리 깊은 전통신앙인 신도와 불교를 융합하여 일본 특유의 불교를 만들어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인들은 불교를 해체하여 자신들에게 부합되는 것들만 취사선택했다. 그러나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으로 실천하는 지계(持戒), 마음을 닦는 선정(禪定), 연기법의 진리를 밝히는 지혜(智慧), 이 세 가지가 한 몸이어서 각자 떨어질 수 없다.
일본에서는 갓난 아이가 태어나면 먼저 신사의 신들에게 신고한다. 결혼식은 기독교의 교회나 호텔에서 올리지만 장례는 사찰에서 불교식으로 한다. 그래서 일본에는 애초부터 결혼식만 주로 할 용도로 만들어진 교회도 있다고 한다. 홋카이도에 있다는 안도 다다오의 그 유명한 ‘물의 교회’가 이런 경우이다. 또 일본의 부자는 무덤이 세 개라고 한다. 하나는 다니던 사찰에, 또 하나는 고향에, 마지막 하나는 진언종의 총본산이 있는 고야산의 오쿠보인에 있다고 한다.
이런 몇몇 사실들만 보더라도 종교가 일본인들의 일상 속에 깊숙이 파고들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올바른 삶의 기준으로서의 종교라기보다, 으레 치뤄야 하는 통과의례, 그래서 하지 않으면 왠지 마음 한 구석이 찜찜한 그 무엇에 가깝다.
지난주 일본 불교의 실제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일본 불교 답사를 다녀왔다. 답사 둘째 날, 정토진종의 총본산인 니시혼간지(서본원사)를 찾았다. 마침 유치원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주지스님(?)과 함께 단체사진을 찍고 있었다. 검정색 승복을 차려 입었지만 삭발을 하지 않은 주지스님은 매우 세련된 이웃 종교의 성직자 같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정장으로 한껏 차려 입은 젊은 학부모들과 오랜 시간동안 한 마디 말 없이 미동도 하지 않는 아이들도 한국에서 온 승려인 나의 눈에는 무척 생경하게 다가왔다. 분명 불교의 외형을 띄고 있었지만 불교적이지 않은 묘한 분위기였다. 압도적인 규모의 법당과 경내의 여러 다양한 시설들을 접할 때도 역시 같은 느낌이었다.
일본의 카레라이스도 맛있는 요리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다양한 향신료를 배합하는 마살라 본연의 풍미를 카레라이스에서 기대하기는 힘들다. 불교가 인도를 벗어나 세계로 퍼져 나가는 과정은 곧 불교의 해체와 재구성의 과정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불교는 시대와 사회에 부합하는 종교로 재탄생했다. 오늘날 불교가 가지는 다양한 얼굴에는 이런 이유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체와 종합의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불교의 핵심 정신이다. 일본 불교는 불교가 변화를 꾀할 때 유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말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