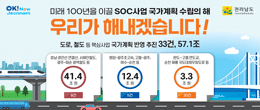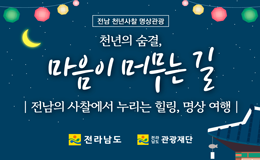충장공 김덕령의 억울한 옥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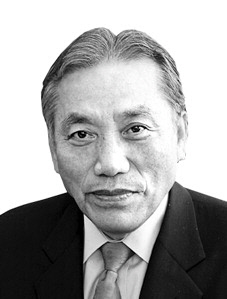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우석대 석좌교수 |
역적 죄인으로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혔고, 악독한 고문에 못 이겨 끝내 감옥에서 운명했던 억울함은 425년이 지난 오늘에도 하늘을 찌르는 원통함으로 남아 있다. 광주의 아들이요 무등산의 사나이였던 김덕령(金德齡). 그는 1567년에 태어나 겨우 29세이던 1596년에 옥사했다. 길고 긴 시간이 흐른 오늘 ‘김장군전’(金將軍傳)이라는 글을 읽으며 억울하고 원통한 그의 죽음을 새롭게 알아보면서 천추의 눈물을 다시 흘릴 수밖에 없다. 세상에 그런 억울한 죽음이 어떻게 있을 수 있었던 말인가.
‘김장군전’은 조선 숙종 때의 학자요 판서에 대제학을 지낸 서하(西河) 이민서(李敏敍, 1633∼1688)의 작품이다. 김덕령 장군의 일생을 가장 소상하고 바르게 기술한 역사적인 글이다. 이민서는 김 장군이 세상을 떠난 지 81년 째인 1677년 광주 목사로 부임한 뒤 김 장군의 아우 김덕보가 기록한 유사(遺事)를 참고하고, 광주 사람들이나 후손들의 이야기 등 자료를 수집하여 신빙성이 높은 전기를 저술하였다. 한자로 1700여 자가 넘는 장문으로 웅혼한 문체에 유려한 글솜씨는 대제학을 지낸 문장가의 실력을 그대로 보여 준다.
김 장군은 광주의 무등산 석저촌 출신이고 대대로 유학을 하던 집안의 후손이라 말하고 향교에 가서 유학 공부에 열중하였음도 말했다. 특히 어려서부터 용력이 뛰어나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행위를 했음도 기록했다. 맨손으로 호랑이를 이겨낸 이야기, 큰 칼을 차고 큰 말을 타며, 무등산 일대를 달려가던 모습을 그대로 적었다.
전설적인 무용담을 세세히 적어 얼마나 뛰어난 장수의 기질이 있었음도 자세히 기술했다. 탁월하고 특이한 이인(異人)의 모습으로 항상 한 쌍의 철추를 늘 좌우에 차고 다녔는데, 철추의 무게가 각각 백 근이었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2백 근의 무게를 들고 나는 듯이 달려다녔다니 그 근력과 용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냥 알 만하다.
때는 선조 25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장군의 형님 김덕홍은 고경명 장군을 따라 의병으로 전투하다 목숨을 바친다. 때마침 장군은 모친상을 당해 집상하던 중이었다. 하지만 담양부사 이경린과 장성부사 이귀 등이 장군의 뛰어난 용맹과 위력을 알아보고 의병을 일으키기를 권유한다. 이에 불효의 죄를 면하지 못한다면서도 나라를 지켜내야 한다는 명분으로 의병을 일으켜 왜병과의 싸움에 가담하였다. 김장군의 능력을 인정한 나라에서는 형조좌랑을 제수하고 익호장군·총용장군 등의 칭호를 부여해 왜적의 섬멸을 지원하였다.
큰 싸움도 없이 왜적은 김장군의 이름만 듣고도 모두 달아났고, 얼마 뒤 화의(和議)가 논의되면서 전투를 멈추게 된다. 그리고 전공을 크게 이룩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의 뛰어난 충의와 용기를 시기하는 사람들의 모함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군율을 엄하게 하느라 군율을 어긴 사람을 처벌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러더니 끝내는 충청도 홍산(현 부여)에서 이몽학이 반란을 일으키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김장군이 반란에 가담했다는 턱없는 무고로 인해 옥에 갇히게 된다. 이어 국문의 고문으로 옥에서 목숨을 버려야 했으니 천하에 그런 억울함이 어디에 또 있었겠는가.
장군이 세상을 떠난 지 370여 년이 된 1970년 대 초. 장군의 묘소를 이장하느라 파묘를 했는데 깊고 깊이 묻힌 장군의 시체는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다 하니 이 또한 무슨 일인가. 후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어떻게 해서 관을 찾아내 관 뚜껑을 열자, 장군의 부릅뜬 눈이 생전의 모습대로였고 관이나 수의도 그대로인 미라로 있었다는 것이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400년이 가깝도록 눈을 감지 못하고 있었단 말인가.
장군은 죽기 전에 ‘춘사가’라는 시조 한 수를 남겼다. “춘산(春山)에 불이 나니 / 못다 핀 꽃 다 불붙는다 / 저 뫼 저 불은 끌 물이나 있거니와 / 이 몸에 내 없는 불 일어나니 끌 물 없어 하노라.” 기가 막히고 원한이 사무치는 내용이다.
정의와 진실은 묻힐 수 없다. 조선 현종 때에 이르러 장군의 억울함이 풀려 신원이 되고 벼슬이 내려졌다. 정조 때에 이르러 석저촌을 충효리라 호칭하게 했고 장군에게는 충장공이라는 시호를 하사했다. 나중에 충장사라는 그의 충의의 의혼을 기리는 사당도 건립되었다. 이민서는 전(傳)에서 당시 영의정 유성룡의 ‘장군이 역모에 의심할 부분이 있다’는 말 때문에 생명을 구할 수 없었다고 했다. 광주의 큰 거리는 충장로다. 그의 의로움을 기리자는 뜻이다. 충장공에 대한 억울함과 분노는 광주의 의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전설적인 무용담을 세세히 적어 얼마나 뛰어난 장수의 기질이 있었음도 자세히 기술했다. 탁월하고 특이한 이인(異人)의 모습으로 항상 한 쌍의 철추를 늘 좌우에 차고 다녔는데, 철추의 무게가 각각 백 근이었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2백 근의 무게를 들고 나는 듯이 달려다녔다니 그 근력과 용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냥 알 만하다.
때는 선조 25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장군의 형님 김덕홍은 고경명 장군을 따라 의병으로 전투하다 목숨을 바친다. 때마침 장군은 모친상을 당해 집상하던 중이었다. 하지만 담양부사 이경린과 장성부사 이귀 등이 장군의 뛰어난 용맹과 위력을 알아보고 의병을 일으키기를 권유한다. 이에 불효의 죄를 면하지 못한다면서도 나라를 지켜내야 한다는 명분으로 의병을 일으켜 왜병과의 싸움에 가담하였다. 김장군의 능력을 인정한 나라에서는 형조좌랑을 제수하고 익호장군·총용장군 등의 칭호를 부여해 왜적의 섬멸을 지원하였다.
큰 싸움도 없이 왜적은 김장군의 이름만 듣고도 모두 달아났고, 얼마 뒤 화의(和議)가 논의되면서 전투를 멈추게 된다. 그리고 전공을 크게 이룩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의 뛰어난 충의와 용기를 시기하는 사람들의 모함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군율을 엄하게 하느라 군율을 어긴 사람을 처벌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러더니 끝내는 충청도 홍산(현 부여)에서 이몽학이 반란을 일으키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김장군이 반란에 가담했다는 턱없는 무고로 인해 옥에 갇히게 된다. 이어 국문의 고문으로 옥에서 목숨을 버려야 했으니 천하에 그런 억울함이 어디에 또 있었겠는가.
장군이 세상을 떠난 지 370여 년이 된 1970년 대 초. 장군의 묘소를 이장하느라 파묘를 했는데 깊고 깊이 묻힌 장군의 시체는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다 하니 이 또한 무슨 일인가. 후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어떻게 해서 관을 찾아내 관 뚜껑을 열자, 장군의 부릅뜬 눈이 생전의 모습대로였고 관이나 수의도 그대로인 미라로 있었다는 것이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400년이 가깝도록 눈을 감지 못하고 있었단 말인가.
장군은 죽기 전에 ‘춘사가’라는 시조 한 수를 남겼다. “춘산(春山)에 불이 나니 / 못다 핀 꽃 다 불붙는다 / 저 뫼 저 불은 끌 물이나 있거니와 / 이 몸에 내 없는 불 일어나니 끌 물 없어 하노라.” 기가 막히고 원한이 사무치는 내용이다.
정의와 진실은 묻힐 수 없다. 조선 현종 때에 이르러 장군의 억울함이 풀려 신원이 되고 벼슬이 내려졌다. 정조 때에 이르러 석저촌을 충효리라 호칭하게 했고 장군에게는 충장공이라는 시호를 하사했다. 나중에 충장사라는 그의 충의의 의혼을 기리는 사당도 건립되었다. 이민서는 전(傳)에서 당시 영의정 유성룡의 ‘장군이 역모에 의심할 부분이 있다’는 말 때문에 생명을 구할 수 없었다고 했다. 광주의 큰 거리는 충장로다. 그의 의로움을 기리자는 뜻이다. 충장공에 대한 억울함과 분노는 광주의 의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