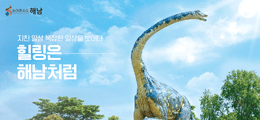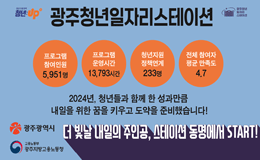[이덕일의 ‘역사의 창’] 1980년 5월 광주
 |
올해는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이다. 나는 사석에서는 운동보다는 항쟁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지만 공식 명칭은 운동이다. 그런데 이 운동은 한 해 전 10월 26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격살(擊殺)한 사건과 연속선상에 있다.
10·26사건 당시 나는 고교생이었는데 그 다음날부터 세상이 바뀐 듯한 풍경이 펼쳐졌다. 정치에는 무관해 보였던 기술 선생님이 박정희 독재를 비판하는 생경한 풍경이 벌어졌다. 쉬는 시간에 비로소 우리들은 박정희를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 있었다. 일부 ‘박정희교 신자들’이 반박했지만 이미 소수로 밀려 있었다.
얼마 전만 해도 우리는 반미 관제데모를 했다. 김영삼 신민당 총재는 1979년 9월 16일자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미국에 박정희 정권에 대한 지지 철회를 요구했고, 박정희 유신정권은 10월 4일 김영삼 총재의 의원직을 박탈했다. 정권이 언론으로 하여금 김대중이란 이름 석 자도 쓰지 못하게 할 때였다. 미국의 카터 정부가 박정희 정권을 압박하자 박정희 정권은 고교생들까지 관제 반미데모로 내몰았다. 교실 밖으로 우르르 나가자 굳게 닫힌 교문 뒤로 경찰들이 와 있었으나 그들이나 우리 사이에 긴장감은 없었다. 관제데모라는 것을 서로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나는 지금도 우리 고교생들을 교실 밖으로 불러냈던 그 메커니즘이 궁금하다.
10·26 사건 이후 언론에서 ‘재야인사’라고 모호하게 표현하던 그 인사의 실명은 ‘김대중’이었다. 언론은 이를 밝히며 보도하기 시작했다. 김종필 전 총리까지 가세해 ‘3김’이란 이니셜이 언론을 뒤덮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가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를 내리면서 정치판을 싹쓸이했다.
이후 광주에서 ‘폭동’이 발생했다는 언론보도가 쏟아졌다. 언론은 ‘폭동’이라고 매도했지만 우리들은 신군부에 저항하는 민주화 운동이란 ‘유비통신’을 더 신봉했다. 광주 소식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것은 ‘국군이 국민을 학살했다’는 사실이었다. 이후 발생한 80년대의 수많은 사건들은 이 사실을 떼어 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 국군이 국민을 학살한 사건은 정권은 물론 국가의 존재 가치까지 의심하게 하는 사고를 가져왔다.
게다가 전두환 정권은 국민들을 적으로 삼는 폭압 정치를 자행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삼청교육대’였다. 각 고등학교에도 학생들을 보내라고 할당했고, 교사들은 미운털 박힌 제자들을 삼청교육대라는 ‘지옥’으로 보냈다. 국민에게 총을 쏜 국군과 제자들을 삼청교육대에 보낸 교사들, 이렇게 군과 교육은 무너졌다.
나는 지금도 내가 다닌 고교의 학생과장 선생님이 제자들을 삼청교육대에 보내지 않은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다. 그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엄했고, 사랑의 매도 자주 들었지만 그 매는 절제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삼청교육대 파견을 거부했다는 소문이 들면서 우리들은 그 선생님을 존경했다.
국민을 적으로 삼았던 전두환 정권의 몰락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전두환은 5·16 군사 쿠데타 때 육사 생도들의 지지 시위를 조직했고, 이를 계기로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소장의 총애 속에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만들었다. 이 하나회가 ‘5·17사태’의 몸통이었다. 훗날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회를 해체하지 않았더라면 김대중·노무현 두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충분히 설득력 있는 말이었다.
전두환 일당의 ‘싹쓸이’ 이후 40년의 역사는 1980년 광주를 ‘민주화운동’으로 보는 국민과 이를 ‘폭동’으로 보는 세력이 맞서 싸운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역사는 올해의 4·15 총선으로 비로소 대단원의 막이 내려졌다. 우리 국민들은 1980년 광주를 ‘폭동’으로 보는 세력에 사망선고를 내렸다.
올해 유승민·주호영 등 미래통합당 의원 일부가 광주 망월동 묘지를 찾은 것은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해석하고 싶다. 80년 광주 이후 40년 만에 비로소 우리 역사가 정상으로 한 발 내디딘 것이다.
<신한대 대학원 교수>
10·26사건 당시 나는 고교생이었는데 그 다음날부터 세상이 바뀐 듯한 풍경이 펼쳐졌다. 정치에는 무관해 보였던 기술 선생님이 박정희 독재를 비판하는 생경한 풍경이 벌어졌다. 쉬는 시간에 비로소 우리들은 박정희를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 있었다. 일부 ‘박정희교 신자들’이 반박했지만 이미 소수로 밀려 있었다.
이후 광주에서 ‘폭동’이 발생했다는 언론보도가 쏟아졌다. 언론은 ‘폭동’이라고 매도했지만 우리들은 신군부에 저항하는 민주화 운동이란 ‘유비통신’을 더 신봉했다. 광주 소식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것은 ‘국군이 국민을 학살했다’는 사실이었다. 이후 발생한 80년대의 수많은 사건들은 이 사실을 떼어 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 국군이 국민을 학살한 사건은 정권은 물론 국가의 존재 가치까지 의심하게 하는 사고를 가져왔다.
게다가 전두환 정권은 국민들을 적으로 삼는 폭압 정치를 자행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삼청교육대’였다. 각 고등학교에도 학생들을 보내라고 할당했고, 교사들은 미운털 박힌 제자들을 삼청교육대라는 ‘지옥’으로 보냈다. 국민에게 총을 쏜 국군과 제자들을 삼청교육대에 보낸 교사들, 이렇게 군과 교육은 무너졌다.
나는 지금도 내가 다닌 고교의 학생과장 선생님이 제자들을 삼청교육대에 보내지 않은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다. 그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엄했고, 사랑의 매도 자주 들었지만 그 매는 절제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삼청교육대 파견을 거부했다는 소문이 들면서 우리들은 그 선생님을 존경했다.
국민을 적으로 삼았던 전두환 정권의 몰락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전두환은 5·16 군사 쿠데타 때 육사 생도들의 지지 시위를 조직했고, 이를 계기로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소장의 총애 속에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만들었다. 이 하나회가 ‘5·17사태’의 몸통이었다. 훗날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회를 해체하지 않았더라면 김대중·노무현 두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충분히 설득력 있는 말이었다.
전두환 일당의 ‘싹쓸이’ 이후 40년의 역사는 1980년 광주를 ‘민주화운동’으로 보는 국민과 이를 ‘폭동’으로 보는 세력이 맞서 싸운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역사는 올해의 4·15 총선으로 비로소 대단원의 막이 내려졌다. 우리 국민들은 1980년 광주를 ‘폭동’으로 보는 세력에 사망선고를 내렸다.
올해 유승민·주호영 등 미래통합당 의원 일부가 광주 망월동 묘지를 찾은 것은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해석하고 싶다. 80년 광주 이후 40년 만에 비로소 우리 역사가 정상으로 한 발 내디딘 것이다.
<신한대 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