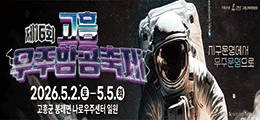[고규홍의 ‘나무 생각’] 30년 넘은 나무, 벨 것인가 키울 것인가
 |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하나의 생명만 옮겨 놓는 게 아니다. 모든 생명이 그렇듯이 나무의 몸에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미생물이 공생한다. 이를테면 황폐화한 숲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개척자 식물의 뿌리에는 ‘뿌리혹박테리아’라는 미생물이 있다. 뿌리혹박테리아는 땅을 비옥하게 한다.
나무가 자라면 나무를 먹이로 하는 생명체가 찾아드는 건 자연스러운 이치다. 식물이 그랬던 것처럼 곤충과 새도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의 미생물과 공생한다. 또 곤충과 새들은 이동 경로에 따라 다양한 생명들을 데리고 온다. 뱃속에 다른 나무의 씨앗을 담고 들어오기도 하고, 허공에 떠돌던 다양한 식물의 씨앗을 품고 오기도 한다.
새와 곤충의 몸에서 떨어진 씨앗들은 다양한 나무를 키우고, 그 나무를 먹이 삼아 다른 생명들이 잇따라 찾아온다. 무한히 되풀이되는 숲의 자연스러운 천이(遷移) 과정이다. 숲은 다양한 생명체들이 상호 의존하며 살아가는 복합적 생태계다. 가장 ‘알맞춤한’ 먹이와 환경을 찾아온 것이어서, 큰 갈등 없이 살아가며 생태적 안정성을 갖춘다.
숲이 이처럼 평안한 생태 환경을 갖추는 데에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얼핏 생각해 봐도 백 년, 이백 년 정도의 짧은 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건 분명하다. 미국의 환경운동가 데릭 젠슨과 조지 드레펀은 함께 펴낸 역저 ‘약탈자들’에서 숲이 생태적 안정성을 갖추려면 대략 500년 정도 걸린다고 했다. 물론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다. 생육 환경과 나무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짧은 시간에 완성되지 않는다는 건 분명하다.
30년 넘으면 나무의 탄소 흡수량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걸 근거로, 우리 숲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식목일 즈음에 터져 나왔다. ‘숲의 체계적 관리’는 사실은 ‘나무를 베자’는 주장인데, 애써 점잔을 빼며 이처럼 표현한 것일 뿐이다. 수령 30년이면, 천년을 살아가는 나무로서는 아직 유년기라 할 만하다. 평균 수명의 10분의 1도 채 안 된 어린 생명인 것이다. 호모 사피엔스에게는 긴 시간이라 해도 나무에게는 매우 짧은 순간이다. 더구나 다양한 생명들이 복합적 생태계를 이루고 안정성을 갖춘 숲을 이루기에는 턱없이 짧은 기간이다.
물론 거개의 나무들이 어린 시절에는 빠르게 자라고 탄소 흡수량도 높다. 그러나 그것도 나무마다 성장 속도가 다르고, 탄소 흡수량도 제가끔 다르다. 한반도에 자생하는 약 5000 종의 식물이 모두 다르다. 한마디로 재단할 수 없다.
백보 양보해서 탄소 흡수량이 줄어든다는 걸 받아들인다 해도 문제는 남는다. 그토록 간단없이 내놓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나무를 심어야 한다던 주장은 어찌할 것인가. 나무는 나뭇잎 표면의 숨구멍으로 미세먼지를 흡착해 대기를 정화한다. 잎의 숫자가 늘고, 크기가 커지면 당연히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늘어난다. 미세먼지를 흡착하는 건 잎 표면의 미세한 숨구멍이다. 숨구멍이 많을수록 즉, 잎의 표면적이 넓을수록 효과가 커진다. 결국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라면 나무를 크게 오래 키워야 한다.
하지만 탄소 흡수나 미세먼지 저감 등의 실용적 이유만으로 나무를 보는 건 지극히 단편적이다. 나무와 숲에서 우리가 얻는 혜택은 한두 가지로 단정할 수 없다. 나무는 천년을 살아가며 사람살이에 초록의 평화와 정서적 안정감을 준다. 실용의 잣대만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나무와 숲에 들어 있다. 그 가치는 나무와 숲이 오래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30년 넘은 나무를 베어 내자는 건, 우리 생태계의 안정성을 깡그리 무너뜨리자는 반문명적 발상에서 나온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 그건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겨우 숨통을 틔워 볼까 하는 희망의 불씨에 재를 끼얹는 일이다.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숲에서 평안히 살다가 갑자기 보금자리를 잃은 미생물은 급속히 우리 안으로 들어와 퍼질 것이다. 결국 우리 땅은 알 수 없는 바이러스들의 천국이 될 수밖에 없다. 또 잎의 숫자와 표면적이 작은 나무만 무성한 이 땅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되어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미세먼지 왕국이 될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할 것인가. 숲을 베어 내는 바람에 창졸간에 멸망의 길을 걸어야 했던 역사 속의 숱한 문명 세계의 경고에 귀 기울여야 할 때다. <나무 칼럼니스트>
나무가 자라면 나무를 먹이로 하는 생명체가 찾아드는 건 자연스러운 이치다. 식물이 그랬던 것처럼 곤충과 새도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의 미생물과 공생한다. 또 곤충과 새들은 이동 경로에 따라 다양한 생명들을 데리고 온다. 뱃속에 다른 나무의 씨앗을 담고 들어오기도 하고, 허공에 떠돌던 다양한 식물의 씨앗을 품고 오기도 한다.
30년 넘으면 나무의 탄소 흡수량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걸 근거로, 우리 숲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식목일 즈음에 터져 나왔다. ‘숲의 체계적 관리’는 사실은 ‘나무를 베자’는 주장인데, 애써 점잔을 빼며 이처럼 표현한 것일 뿐이다. 수령 30년이면, 천년을 살아가는 나무로서는 아직 유년기라 할 만하다. 평균 수명의 10분의 1도 채 안 된 어린 생명인 것이다. 호모 사피엔스에게는 긴 시간이라 해도 나무에게는 매우 짧은 순간이다. 더구나 다양한 생명들이 복합적 생태계를 이루고 안정성을 갖춘 숲을 이루기에는 턱없이 짧은 기간이다.
물론 거개의 나무들이 어린 시절에는 빠르게 자라고 탄소 흡수량도 높다. 그러나 그것도 나무마다 성장 속도가 다르고, 탄소 흡수량도 제가끔 다르다. 한반도에 자생하는 약 5000 종의 식물이 모두 다르다. 한마디로 재단할 수 없다.
백보 양보해서 탄소 흡수량이 줄어든다는 걸 받아들인다 해도 문제는 남는다. 그토록 간단없이 내놓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나무를 심어야 한다던 주장은 어찌할 것인가. 나무는 나뭇잎 표면의 숨구멍으로 미세먼지를 흡착해 대기를 정화한다. 잎의 숫자가 늘고, 크기가 커지면 당연히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늘어난다. 미세먼지를 흡착하는 건 잎 표면의 미세한 숨구멍이다. 숨구멍이 많을수록 즉, 잎의 표면적이 넓을수록 효과가 커진다. 결국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라면 나무를 크게 오래 키워야 한다.
하지만 탄소 흡수나 미세먼지 저감 등의 실용적 이유만으로 나무를 보는 건 지극히 단편적이다. 나무와 숲에서 우리가 얻는 혜택은 한두 가지로 단정할 수 없다. 나무는 천년을 살아가며 사람살이에 초록의 평화와 정서적 안정감을 준다. 실용의 잣대만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나무와 숲에 들어 있다. 그 가치는 나무와 숲이 오래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30년 넘은 나무를 베어 내자는 건, 우리 생태계의 안정성을 깡그리 무너뜨리자는 반문명적 발상에서 나온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 그건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겨우 숨통을 틔워 볼까 하는 희망의 불씨에 재를 끼얹는 일이다.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숲에서 평안히 살다가 갑자기 보금자리를 잃은 미생물은 급속히 우리 안으로 들어와 퍼질 것이다. 결국 우리 땅은 알 수 없는 바이러스들의 천국이 될 수밖에 없다. 또 잎의 숫자와 표면적이 작은 나무만 무성한 이 땅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되어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미세먼지 왕국이 될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할 것인가. 숲을 베어 내는 바람에 창졸간에 멸망의 길을 걸어야 했던 역사 속의 숱한 문명 세계의 경고에 귀 기울여야 할 때다. <나무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