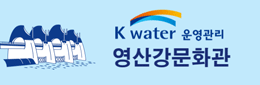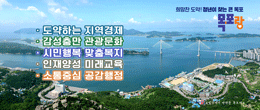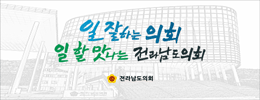[박찬일의 ‘밥 먹고 합시다’] 먹는 역사가 궁금해서
 |
학교에서 우린 역사를 배운다. 대체로 왕조사, 정치사 중심이다. 누가 누구를 쳐서 멸망하고 새 왕조를 세웠네, 관료제도를 어떻게 정비하고 세금을 어떻게 거둘지 논의했네, 이런 얘기가 거의 대부분이다. 역사 공부를 하면서 나는 늘 ‘그 당시 사람들은 무얼 어떻게 먹었을까’하고 궁금해 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는 기록광(?)이었던 조선시대 위정자들은 어마어마한 분량의 실록과 여러 문서를 꼼꼼하게 남겼다. 어른이 되어서 알게 된 일이지만, 그런 기록만 살펴도 수백 년 전 우리 조상들은 무얼 먹고 살았는지 얼추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최 역사책에서는 피비린내는 정치투쟁사는 자세히도 다루면서 이런 민중의 미시사는 거들떠도 안 본다. 이를 테면, 된장찌개와 김치찌개가 지금의 모습을 갖춘 건 언제부터인지, 두부와 콩나물은 어떻게 먹게 되었는지 학교 과정에 자세히 나온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부족한 지면에 다 실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어쩌면 정작 궁금한 건 우리 할배 할매들의 의식주 역사일지도 모르겠다.
예전에 최불암 선생을 만난 적이 있다. 그에게 ‘한국인의 밥상’에 왜 그리도 애착을 갖고 있는지 물었다. 대략 이런 말씀이 있었다.
“우리가 무얼 먹고 살았는지 후손들이 다 필름으로 볼 수 있게끔 의무감이 들더라고. 산골이나 도시 빌딩에서나 이 지방이나 저 지방이나 다 먹고 사는 게 일인데 이 프로가 그걸 기록하거든.”
이런 음식사, 민중 미시사는 현장에 가지 않고는 알 수 없다. 한번은 인천의 오래된 닭튀김집(신포야채치킨)에 가서 주인장을 만나 인터뷰를 하는데 기막힌 얘기를 들었다. 요즘과 달리 주문만 하면 닭이 배달 오는 시절이 아니어서 1960년대부터 선친을 따라 산 닭을 사러 다녔다는 그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충청도에 가면 시골 마을에서 닭을 많이 길러요. 이걸 흥정해서 사오는데, 인천까지는 뱃길을 이용하곤 했지. 싸게 실을 수 있으니까요.” 육로가 좋지 않고, 트럭도 형편없던 시대에 대형 화물은 바다와 강의 수로를 많이 이용했다. 이런 역사를 들을 수 있다는 건 역시 현장이다.
좋은 소고기를 파는 걸로 유명한 서울 팔판동의 식육점(팔판정육점) 사장님의 쇠고기 수집 방법도 지금처럼 포장된 고기가 경매로 팔리는 시대에서는 상상도 못할 옛날이야기가 있다.
“전국 큰 우시장에 가서 소를 봅니다. 소 보는 기술이 있어야 해요. 덩치 크다고 좋은 고기가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노하우가 있어요. 엉덩이에 살집이 좋은 소라든가. 소가 마음에 들면 큰소리로 ‘이건 내가 골랐소’하고 점을 찍어요. 다른 이들이 붙지 않게 하는 것이지요.”
두부와 콩나물의 기억도 있다. 50년 전 서울 변두리라면 이런 재료는 대개 지역마다 공장이 있었던 것 같다. 두부공장집 아들, 콩나물공장집 딸이 동급생이고 그랬다. 두부공장은 아주 서늘했고, 큰 시멘트 수조 가득 두부가 열기를 식히고 있던 게 생각난다. 새벽에 노동자들이 두부를 쑤어 수조에 담가 식혀 동네 구멍가게와 시장에 납품했을 것이다. 그 두부 위로 찰랑찰랑하던 맑은 물의 흔들림이 아직도 선명하게 뇌리에 남아 있다.
그러던 동네 두부도 포장되어 납품하는 슈퍼마켓 두부에 밀려났던 역사도 여러분은 알 것이다. 집집마다, 물 맛따라 콩따라 다른 두부를 먹을 수 있는 시대는 사뭇 저물어버린 걸까.
봄이니 미나리도 각별한 추억으로 돋는다. 서울이라 해도 그때 변두리는 거의 반 농촌이라 동무들따라 동네 한 쪽에 가면 밭이 연이어 있었다. 개천 옆으로 둑이 있고 그 한쪽으로 물을 대는 밭에는 퍼런 미나리가 쑥쑥 자라고 있었다. 거기서 풍덩거리며 노는 게 좋았는데 거머리가 다리에 붙는 걸 보고는 다시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물이 맑아 거머리도 살던 때가 서울 동네에서도 있었고, 자기 동네서 나는 미나리로 국 끓여 해장하고 나물도 무치던 게 그리 오래된 시절도 아닌 것 같아 왠지 더 억울하고 서글프다.
마침 시장에 가니 그 퍼런 미나리의 후손들이 그 색깔 그대로 잔뜩 나와 있다. 요즘은 삼겹살에 미나리 싸먹는 게 유행이라는데, 한 단 사서 먹어볼 작정이다.
<음식 칼럼니스트>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는 기록광(?)이었던 조선시대 위정자들은 어마어마한 분량의 실록과 여러 문서를 꼼꼼하게 남겼다. 어른이 되어서 알게 된 일이지만, 그런 기록만 살펴도 수백 년 전 우리 조상들은 무얼 먹고 살았는지 얼추 알 수 있다.
“우리가 무얼 먹고 살았는지 후손들이 다 필름으로 볼 수 있게끔 의무감이 들더라고. 산골이나 도시 빌딩에서나 이 지방이나 저 지방이나 다 먹고 사는 게 일인데 이 프로가 그걸 기록하거든.”
이런 음식사, 민중 미시사는 현장에 가지 않고는 알 수 없다. 한번은 인천의 오래된 닭튀김집(신포야채치킨)에 가서 주인장을 만나 인터뷰를 하는데 기막힌 얘기를 들었다. 요즘과 달리 주문만 하면 닭이 배달 오는 시절이 아니어서 1960년대부터 선친을 따라 산 닭을 사러 다녔다는 그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충청도에 가면 시골 마을에서 닭을 많이 길러요. 이걸 흥정해서 사오는데, 인천까지는 뱃길을 이용하곤 했지. 싸게 실을 수 있으니까요.” 육로가 좋지 않고, 트럭도 형편없던 시대에 대형 화물은 바다와 강의 수로를 많이 이용했다. 이런 역사를 들을 수 있다는 건 역시 현장이다.
좋은 소고기를 파는 걸로 유명한 서울 팔판동의 식육점(팔판정육점) 사장님의 쇠고기 수집 방법도 지금처럼 포장된 고기가 경매로 팔리는 시대에서는 상상도 못할 옛날이야기가 있다.
“전국 큰 우시장에 가서 소를 봅니다. 소 보는 기술이 있어야 해요. 덩치 크다고 좋은 고기가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노하우가 있어요. 엉덩이에 살집이 좋은 소라든가. 소가 마음에 들면 큰소리로 ‘이건 내가 골랐소’하고 점을 찍어요. 다른 이들이 붙지 않게 하는 것이지요.”
두부와 콩나물의 기억도 있다. 50년 전 서울 변두리라면 이런 재료는 대개 지역마다 공장이 있었던 것 같다. 두부공장집 아들, 콩나물공장집 딸이 동급생이고 그랬다. 두부공장은 아주 서늘했고, 큰 시멘트 수조 가득 두부가 열기를 식히고 있던 게 생각난다. 새벽에 노동자들이 두부를 쑤어 수조에 담가 식혀 동네 구멍가게와 시장에 납품했을 것이다. 그 두부 위로 찰랑찰랑하던 맑은 물의 흔들림이 아직도 선명하게 뇌리에 남아 있다.
그러던 동네 두부도 포장되어 납품하는 슈퍼마켓 두부에 밀려났던 역사도 여러분은 알 것이다. 집집마다, 물 맛따라 콩따라 다른 두부를 먹을 수 있는 시대는 사뭇 저물어버린 걸까.
봄이니 미나리도 각별한 추억으로 돋는다. 서울이라 해도 그때 변두리는 거의 반 농촌이라 동무들따라 동네 한 쪽에 가면 밭이 연이어 있었다. 개천 옆으로 둑이 있고 그 한쪽으로 물을 대는 밭에는 퍼런 미나리가 쑥쑥 자라고 있었다. 거기서 풍덩거리며 노는 게 좋았는데 거머리가 다리에 붙는 걸 보고는 다시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물이 맑아 거머리도 살던 때가 서울 동네에서도 있었고, 자기 동네서 나는 미나리로 국 끓여 해장하고 나물도 무치던 게 그리 오래된 시절도 아닌 것 같아 왠지 더 억울하고 서글프다.
마침 시장에 가니 그 퍼런 미나리의 후손들이 그 색깔 그대로 잔뜩 나와 있다. 요즘은 삼겹살에 미나리 싸먹는 게 유행이라는데, 한 단 사서 먹어볼 작정이다.
<음식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