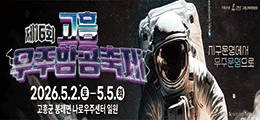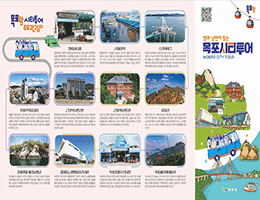황룡강 습지 보전 이대론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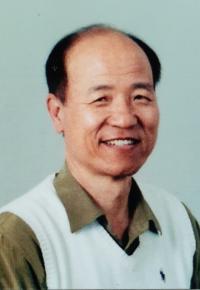 |
지난 한 해 동안 광주시민들은 ‘황룡강 장록습지’를 국가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놓고 찬반 논쟁으로 뜨거웠다. 그리고 공론화 여론조사에서 찬성 85.8%, 반대 14.2%란 결과가 나왔다. 찬반 해석을 두고 분분한 소리가 터져 나오지만 습지의 보존과 대책은 지금부터다.
황룡강은 본디 바다였다. 그러나 황룡강에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것은 일제 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가 태동을 무시하고 농경지를 확보하기 위해 제방을 축조하면서 황룡강이란 자연의 생명 줄은 그때부터 이미 변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70년대 농업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장성댐을 축조하자 황룡강은 자정 능력을 상실하고 샛강에 불과한 도랑물로 전락하고 말았다. 거기에다 산업 시설에서 쏟아진 오폐수와 농사철 농약 살포는 황룡강 수질을 1급수에서 4급수까지 떨어뜨려 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필자는 평생을 두고 황룡강을 지켜본 사람이다. 어렸을 때 황룡강에서는 섬진강에서만 볼 수 있는 은어들이 서식했다. 잉어, 붕어, 메기, 날치는 물론 자라까지 모래톱에서 발에 밟힐 정도로 고기가 많았다. 뿐만 아니라 목포 하구언을 축조하기 전에 큰물이 지면 숭어와 전어 등의 바닷고기들도 황룡강에서 흔히 볼 수 있었다.
이처럼 풍부한 물고기 생태계가 없어지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부터다. 건축 자재인 골재 채취가 무작위로 이루어져 강을 망가뜨렸으며, 공장과 주택가의 폐수 유입으로 하급수로 전락한 것이다.
이 때문에 강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시민들은 잘 모른다. 하절기 큰물이 지면 위에서 내려온 쓰레기 더미가 흉측스럽다 못해 역겨울 정도로 내려온다. 바로 요즈음 습지 보존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수생 식물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큰물만 지면 쓰레기 더미가 나뭇가지에 걸려 흉할 뿐만 아니라 웅덩이에 동물 사체까지 떠 내려와 부식되는 바람에 썩은 냄새가 여름 내내 지독하게 풍긴다.
1989년 광주·전남에 대홍수가 일어났다. 황룡강 제방이 범람하자 송정동을 비롯해 동곡동과 평동동 일대가 침수되어 큰 피해를 입었다. 황룡강 제방을 끼고 있는 주민들은 홍수의 범람을 공포 속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으며 다행히 나주시 영산포의 둑이 무너져 광산 지역의 더 큰 피해는 줄일 수가 있었다.
생태계 보존 사업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과거에 일어났던 피해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되 미래를 보고 추진해야 한다. 잘못되면 큰 재앙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홍수를 피해 가려면 직강 공사부터 서둘러야 한다. 과거 무작위로 파헤쳐 버린 황룡강은 여기저기 웅덩이가 많아 물 흐름이 제멋대로다. 그래서 지금의 꾸불꾸불한 형태를 직강으로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 물 흐름을 방해하는 수생 식물들을 모두 강 양쪽으로 옮겨 정비하고 강물은 한가운데로 흐르도록 유도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홍수가 나도 막힘없이 흘러갈 수 있으며 쓰레기도 정체되지 않아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둘째, 황룡강은 수량이 부족해 약간의 담수로 물을 채워 주어야 한다. 중간 중간에 징검다리 형식으로 담수를 해 주면 수생 식물이나 물고기들의 생태 기능을 확보해 주는 한편 사람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셋째, 현재 장록교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한다고 한다. 과거 이 지역은 물이 많아 보트장이 운영된 지역이었다. 따라서 강과 다리를 이용해 볼거리를 만들고 시민들이 멀리 장성이나 장흥까지 가지 않고 쉬어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황룡강은 본디 바다였다. 그러나 황룡강에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것은 일제 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가 태동을 무시하고 농경지를 확보하기 위해 제방을 축조하면서 황룡강이란 자연의 생명 줄은 그때부터 이미 변화되기 시작했다.
필자는 평생을 두고 황룡강을 지켜본 사람이다. 어렸을 때 황룡강에서는 섬진강에서만 볼 수 있는 은어들이 서식했다. 잉어, 붕어, 메기, 날치는 물론 자라까지 모래톱에서 발에 밟힐 정도로 고기가 많았다. 뿐만 아니라 목포 하구언을 축조하기 전에 큰물이 지면 숭어와 전어 등의 바닷고기들도 황룡강에서 흔히 볼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강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시민들은 잘 모른다. 하절기 큰물이 지면 위에서 내려온 쓰레기 더미가 흉측스럽다 못해 역겨울 정도로 내려온다. 바로 요즈음 습지 보존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수생 식물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큰물만 지면 쓰레기 더미가 나뭇가지에 걸려 흉할 뿐만 아니라 웅덩이에 동물 사체까지 떠 내려와 부식되는 바람에 썩은 냄새가 여름 내내 지독하게 풍긴다.
1989년 광주·전남에 대홍수가 일어났다. 황룡강 제방이 범람하자 송정동을 비롯해 동곡동과 평동동 일대가 침수되어 큰 피해를 입었다. 황룡강 제방을 끼고 있는 주민들은 홍수의 범람을 공포 속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으며 다행히 나주시 영산포의 둑이 무너져 광산 지역의 더 큰 피해는 줄일 수가 있었다.
생태계 보존 사업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과거에 일어났던 피해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되 미래를 보고 추진해야 한다. 잘못되면 큰 재앙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홍수를 피해 가려면 직강 공사부터 서둘러야 한다. 과거 무작위로 파헤쳐 버린 황룡강은 여기저기 웅덩이가 많아 물 흐름이 제멋대로다. 그래서 지금의 꾸불꾸불한 형태를 직강으로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 물 흐름을 방해하는 수생 식물들을 모두 강 양쪽으로 옮겨 정비하고 강물은 한가운데로 흐르도록 유도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홍수가 나도 막힘없이 흘러갈 수 있으며 쓰레기도 정체되지 않아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둘째, 황룡강은 수량이 부족해 약간의 담수로 물을 채워 주어야 한다. 중간 중간에 징검다리 형식으로 담수를 해 주면 수생 식물이나 물고기들의 생태 기능을 확보해 주는 한편 사람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셋째, 현재 장록교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한다고 한다. 과거 이 지역은 물이 많아 보트장이 운영된 지역이었다. 따라서 강과 다리를 이용해 볼거리를 만들고 시민들이 멀리 장성이나 장흥까지 가지 않고 쉬어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