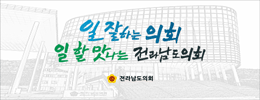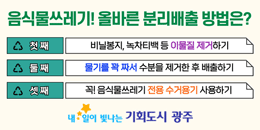GDP 4만달러 시대 - 박진표 경제부장
1960년대 초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GDP)은 ‘아프리카 최빈국 수준’인 70달러였다. 1963년 들어 GDP 100달러를 겨우 돌파했지만 6·25전쟁 이후 세계 최빈국 신세는 여전했다. 갖은 노력과 고생 끝에 1987년 처음으로 3000달러를 돌파했을 때는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가 현실이 되는 듯 했다.
1995년에는 1만달러의 문턱까지 들어섰고 ‘선진국 진입’이라는 단어가 신문지면을 장식했다. 2006년 2만달러, 2016년에는 3만달러 시대를 질주했다. 그런데 곧 손에 잡힐 듯 하던 4만달러 시대 진입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2018년 3만5000달러까지 올라섰던 GDP는 2019~2020년 두 해 연속 하락했다. 글로벌 무역 둔화와 코로나19 충격 등이 겹친 탓이었다. 2021년 3만7000달러까지 깜짝 반등하기도 했지만 다음 해인 2022년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수출 둔화 등으로 다시 3만4000달러대로 내려앉았다.
이재명 정부 들어 코스피가 연일 최고치를 찍는 등 국내 경제가 활기를 띠면서 다시 한번 GDP ‘4만달러’ 진입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최근 2027년이면 GDP 4만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자료를 내놨다.
문제는 환율이다. 지난해 평균 환율인 달러당 1364원을 기준으로 잡으면 2027년 4만달러 돌파가 가능하지만 올해 평균인 1400원대에선 1년 이상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1390원을 가정해도 2027년 GDP는 3만9000달러대에 그쳐 2028년으로 늦춰진다. IMF 전망은 더 인색하다. IMF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GDP 4만달러 진입 시점을 2027년에서 2029년으로 수정했다.
4만달러 시대가 되면 국민의 삶이 풍요롭게 변할지에 대한 질문도 남는다.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소득 불평등 구조와 가계부채, 청년 고용 불안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4만달러라는 숫자는 허수에 불과할 뿐이라고 경고하는 전문가도 있다. 광주·전남의 현실은 더 냉혹하다. GDP가 오를수록 수도권 집중과 지방 제조업 공동화, 청년 유출 문제 등이 더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진표 경제부장 lucky@
1995년에는 1만달러의 문턱까지 들어섰고 ‘선진국 진입’이라는 단어가 신문지면을 장식했다. 2006년 2만달러, 2016년에는 3만달러 시대를 질주했다. 그런데 곧 손에 잡힐 듯 하던 4만달러 시대 진입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2018년 3만5000달러까지 올라섰던 GDP는 2019~2020년 두 해 연속 하락했다. 글로벌 무역 둔화와 코로나19 충격 등이 겹친 탓이었다. 2021년 3만7000달러까지 깜짝 반등하기도 했지만 다음 해인 2022년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수출 둔화 등으로 다시 3만4000달러대로 내려앉았다.
4만달러 시대가 되면 국민의 삶이 풍요롭게 변할지에 대한 질문도 남는다.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소득 불평등 구조와 가계부채, 청년 고용 불안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4만달러라는 숫자는 허수에 불과할 뿐이라고 경고하는 전문가도 있다. 광주·전남의 현실은 더 냉혹하다. GDP가 오를수록 수도권 집중과 지방 제조업 공동화, 청년 유출 문제 등이 더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진표 경제부장 luc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