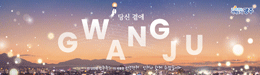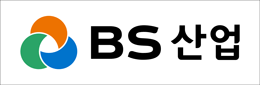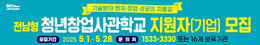자은도 여인송(女人松) 전설- 황옥주 수필가
 |
사람은 인연 따라 움직인다. 인연이 선연(善緣)이라면 이별 뒤에도 그리움은 지워지지 않는다. 그게 순박한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다. 이른 봄, 소중한 사람들과 자은도를 다녀왔다. 신실한 믿음을 주고 먼 임지로 떠나신 신부님을 만나보고자 해서다. 실천은 빠를수록 좋고 짧은 이별이라도 계산 없는 정 나눔은 해묵은 해후만큼이나 설렌다.
점심을 마치고 신부님 안내로 섬 일주에 나섰다. 산길에 들어서니 수줍은 듯 얼굴 내민 풀꽃들이 예쁘다. 일주 마지막에 다다른 곳은 분계라는 해수욕장이다. 모래알을 희롱하는 물결이며 햇빛에 반짝이는 윤슬, 썰물에 떠내려갈 듯한 작은 섬들, 솔바람 소리가 정겹다.
모래밭을 반라로 거니는 나를 그려보는 사이 기이한 형상의 소나무가 나타난다. ‘여인송 전설’의 주인공이다. 그 앞에 세워 둔 안내문의 내용인즉, “옛날 분계마을에 고기잡이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부가 있었다. 어느 날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고 바다에 나간 남편이 큰 풍랑을 만나 돌아오지 않았다. 후회한 부인은 날마다 이곳 솔등에 올라 우각도 너머 수평선을 바라보며 남편의 무사 귀환을 애타게 빌며 기다렸다. 그러나 날이 가고 달이 가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다. 기다리다 지친 부인은 어느 날 밤 꿈속에서 물구나무를 서서 나무를 보니 배를 타고 돌아오는 남편의 모습이 보였다.
다음 날부터 부인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닷가 제일 큰 소나무에 올라 남편이 배를 타고 오는 환상을 그려보곤 하였다. 어느 추운 겨울날 아내는 소나무에서 거꾸로 떨어져 동사하고 말았다. 그 후 돌아온 남편이 아내의 시신을 수습하여 소나무 아래에 묻어주자 나무는 거꾸로 선 아름다운 여인의 자태를 닮은 여인송으로 변하여 지금까지 남아있다. (후략)전설은 만들어진 얘기다. 자연현상이나 사물, 인물, 지명 등 조금 색다르다 싶으면 그럴듯한 상상력을 동원하고 의미를 부여하여 상을 얽어 만든다.
사람은 누구나 맘속에 창작 욕망을 품고 있다. 그 욕망이 시나 소설, 수필 등을 잉태하는 문학의 씨다. 씨는 싹이 터야 구실을 한다. ‘25시’의 작가 게오르규는 “달이나 바람을 교수형에 처할 수 없는 것처럼 전설을 처벌할 수는 없다. 전설은 육체가 아니고 영혼이기 때문이다. 전설은 창작이기 때문에 어떤 장군도 거기에 대적할 수 없다”고 설파한 바 있다. 전설은 그 대상을 무엇으로 삼았든 결국 사람 얘기며 결말은 애절하다. 고뇌와 눈물에 찌든 삶, 반전이 없는 불가역적 비극의 종말, 이것이 전설의 특징이고 구성상 전략이며 노리는 기대일 터이다.
안내문을 거듭 읽고 나니 마음이 숙연해진다. 어둠이 바다를 삼킬 때까지 기다리다 지친 여인은 바람에 꽃잎 지듯 힘없이 떨어졌으리라. 소나무 모습은 영락없는 물구나무선 여자의 나신이다. 방사림은 거의 모두 뿌리가 드러나 있다. 파도와 바람과 빗물에 깎이며 살아온 고난의 흔적이다. 일행 중 한 분이 여인송을 가리켜 백년쯤은 됐으리라 하기에 나는 단연 오백 년은 넘으리라 장담했다.
50년 전쯤 됐을까? 고 송수권 시인의 안내로 지리산 빨치산 부대 본거지인 동굴 사무실을 답사한 적이 있다. 왼쪽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면 하늘 아래 첫 동네에 ‘천년송’이 있다기에 시간 부족 경고도 무시한 채 세 사람만 나섰다. 서둘러 이르러보니 ‘천년송’이란 기록에 믿음이 가지 않았다. 퍼뜩 그때 기억이 떠올라 5백 년을 말했으나 자신이 있었던 건 아니다. 이 글을 쓰면서 신안군 관광과에 물었더니 2백 년은 넘었으나 안내판 설치는 2011년이란다. 내 추량은 한참 빗나간 엉터리였다. 멀리서 작은 파도를 앞세우고 밀물도 몰려온다. 쫓기듯 송림을 떠나는 발길이 마냥 무겁다. 여인송과 우각도가 눈에 밟혀서….
모래밭을 반라로 거니는 나를 그려보는 사이 기이한 형상의 소나무가 나타난다. ‘여인송 전설’의 주인공이다. 그 앞에 세워 둔 안내문의 내용인즉, “옛날 분계마을에 고기잡이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부가 있었다. 어느 날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고 바다에 나간 남편이 큰 풍랑을 만나 돌아오지 않았다. 후회한 부인은 날마다 이곳 솔등에 올라 우각도 너머 수평선을 바라보며 남편의 무사 귀환을 애타게 빌며 기다렸다. 그러나 날이 가고 달이 가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다. 기다리다 지친 부인은 어느 날 밤 꿈속에서 물구나무를 서서 나무를 보니 배를 타고 돌아오는 남편의 모습이 보였다.
사람은 누구나 맘속에 창작 욕망을 품고 있다. 그 욕망이 시나 소설, 수필 등을 잉태하는 문학의 씨다. 씨는 싹이 터야 구실을 한다. ‘25시’의 작가 게오르규는 “달이나 바람을 교수형에 처할 수 없는 것처럼 전설을 처벌할 수는 없다. 전설은 육체가 아니고 영혼이기 때문이다. 전설은 창작이기 때문에 어떤 장군도 거기에 대적할 수 없다”고 설파한 바 있다. 전설은 그 대상을 무엇으로 삼았든 결국 사람 얘기며 결말은 애절하다. 고뇌와 눈물에 찌든 삶, 반전이 없는 불가역적 비극의 종말, 이것이 전설의 특징이고 구성상 전략이며 노리는 기대일 터이다.
안내문을 거듭 읽고 나니 마음이 숙연해진다. 어둠이 바다를 삼킬 때까지 기다리다 지친 여인은 바람에 꽃잎 지듯 힘없이 떨어졌으리라. 소나무 모습은 영락없는 물구나무선 여자의 나신이다. 방사림은 거의 모두 뿌리가 드러나 있다. 파도와 바람과 빗물에 깎이며 살아온 고난의 흔적이다. 일행 중 한 분이 여인송을 가리켜 백년쯤은 됐으리라 하기에 나는 단연 오백 년은 넘으리라 장담했다.
50년 전쯤 됐을까? 고 송수권 시인의 안내로 지리산 빨치산 부대 본거지인 동굴 사무실을 답사한 적이 있다. 왼쪽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면 하늘 아래 첫 동네에 ‘천년송’이 있다기에 시간 부족 경고도 무시한 채 세 사람만 나섰다. 서둘러 이르러보니 ‘천년송’이란 기록에 믿음이 가지 않았다. 퍼뜩 그때 기억이 떠올라 5백 년을 말했으나 자신이 있었던 건 아니다. 이 글을 쓰면서 신안군 관광과에 물었더니 2백 년은 넘었으나 안내판 설치는 2011년이란다. 내 추량은 한참 빗나간 엉터리였다. 멀리서 작은 파도를 앞세우고 밀물도 몰려온다. 쫓기듯 송림을 떠나는 발길이 마냥 무겁다. 여인송과 우각도가 눈에 밟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