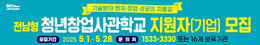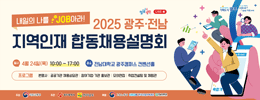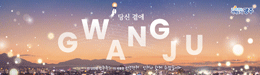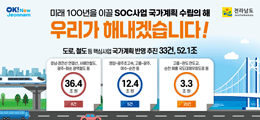거문도, 동아시아 뱃길 중심 ‘전략 요충지’…15개 방어시설 깊은 상흔
<8>
국제 정세 휘말려 수차례 외세 침탈 ‘고초’
1854년 러시아·1855년 영국 무단 점령
日, 러·일 전쟁 요충지·어업기지로 삼아
1944년부터 남해연안 방어시설 본격 구축
통신시설·전망대 등 갖추고 주변 관측
견고한 콘크리트 쌓아 ‘엄폐 진지’ 사용도
국제 정세 휘말려 수차례 외세 침탈 ‘고초’
1854년 러시아·1855년 영국 무단 점령
日, 러·일 전쟁 요충지·어업기지로 삼아
1944년부터 남해연안 방어시설 본격 구축
통신시설·전망대 등 갖추고 주변 관측
견고한 콘크리트 쌓아 ‘엄폐 진지’ 사용도
 음달산 토치카 입구 |
제주도를 제외하고 우리나라 최남단에 있는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는 국제 정세에 휘말려 수차례 외세 ‘침탈’을 당한 아픔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1854년 러시아 함대가 기항한 것을 시작으로 1885년에는 영국군이 2년에 걸쳐 거문도를 무단 점령하기도 했다. 일제강점기 이후에는 일본이 거문도를 점거하고 러·일 전쟁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어업 기지로 삼았다.
거문도는 동도(東島)·서도(西島)·고도(古島) 등 작은 섬들이 모여 있는 형태로 총면적은 12㎢에 불과한데다 여수시로부터 남쪽으로 114여㎞ 떨어져 있을 만큼 외딴 곳이지만, 영국, 일본 등은 일찍부터 이 곳을 지정학적 군사 요충지로 눈여겨봤다. 여수시와 제주도 사이에 있는데다 동해와 서해를 잇는 항로 중심에 있는 등 ‘중간 지점’에 있는 섬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본은 아·태전쟁보다 한참 이른 1904년부터 사세보에서 거문도까지 이어지는 해저케이블을 설치해 군사 통신 시설을 만들고 거문도를 진해만방비대의 전초기지로 삼았다.
일본의 거문도 침탈이 심해진 것은 1941년 12월 아·태전쟁이 발발한 직후다.
거문도는 진해 경비부 사령관의 지휘 아래 들어가고 만 내에는 구축함 등 전함의 출입이 더욱 빈번해져 거문리 해안에는 초계정들이 상주했다. 거문도 인근 해안을 방어하기 위해 진해 경비부 소속의 방비부대가 편성, 배치됐고 1944년 말부터는 일본과 중국을 오가는 수송선단을 호위하기 위한 해방함들도 배치돼 주변의 주정기지를 오가며 호송임무를 수행했다.
이 무렵 일본은 거문도 곳곳에 군사 시설을 마구 지어대기 시작했다. 1944년 12월 방위총사령부에서 제주도, 목포, 여수를 포함한 남해연안의 방어시설 구축을 지시하면서다. 동도 해안가와 산중턱에 아홉 곳, 음달산 두 곳 불탄봉 관측시설로 추정되는 세 곳, 서도 토치카 한 곳 등이 현재에도 남아있다.
거문도의 시설물은 자연암반이나 토갱으로 구축된 다른 지역의 시설물과 달리 콘크리트 입구를 만든 것이 특징이다. 전쟁 중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시간과 물자가 많이 요구되는 콘크리트 타설까지 해 견고히 구축했다는 점은, 일본이 이 곳 군사시설에 상당한 공을 들였음을 암시한다.
서도 불탄봉에 있는 기지 시설이 대표적이다.
시설물 내부는 모두 콘크리트 타설로 구축돼 견고하고 입구 두께만 해도 35㎝에 이르며 가로, 세로 50㎝의 굴뚝이 2개나 만들어져 있다.
‘거문도 수비대 진지 배비요도’에는 불탄봉의 군사기지가 통신시설이었다고 명확히 기록돼 있다. 현재 불탄봉 시설물 내부에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지만, 아·태전쟁 당시에는 통신시설을 갖추고 거문도 주위의 남해안 연안을 관측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일본은 군수물품을 실은 배가 거문도에 들어오면 주민들이 시멘트, 목재 등 군수품을 불탄봉 산 중턱까지 운반했고 일본 군인들이 물품을 받아 가져가는 식으로 시설을 활용했다.
현재 불탄봉 시설에는 ‘일제시대 군사시설 불탄봉 관측소’라는 이름으로 고도의 전경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세워져 있다.
서도 음달산에는 일본이 만든 토치카 시설도 남아있다. 토치카는 제1차 세계대전 전후로 등장한 ‘엄폐 진지’로, 총이나 포로 적을 공격하는 동시에 적의 공격으로부터 전투원을 보호하도록 콘크리트를 쌓아 올려 구축한 진지다.
독특하게도 거문도 토치카의 벽면은 콘크리트로 만들어졌지만, 천장은 주변 산에서 베어온 굵은 나무를 갱도 버팀목으로 사용해 쌓아올렸다. 이는 전쟁 도중 일본이 시멘트와 철근 등 물자 부족에 시달렸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밖에도 ‘거문도수비대 진지배비 요도’에 따르면 일본군은 서도의 음달산 정상부에 지휘소를 설치, 주변 산기슭에 7~8개의 기관총 설치용 진지동굴과 2개의 포대를 구축한 것으로 확인된다.
동도 죽촌마을에는 산 중턱에 만들어진 콘크리트 동굴 두 개가 남아있다. 이 동굴은 거문도를 넓은 시야로 조망할 수 있어 지휘소의 용도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내부 벽면과 천장, 입구와 내부엔 가로·세로 0.15m, 높이 0.3m 육면체 나무토막이 박혀 있는 것이 특징인데, 사방이 가로막힌 시설물에서 총 등을 발포했을 때 소리를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물로 추정된다.
또 죽촌마을 해안가에는 높이 2.5m, 폭 3m, 길이 16~28m 수준의 해안 동굴 일곱 개가 그대로 남아있다. 이곳 해안 동굴들은 거문도 근해의 남해안을 지나는 큰 함선을 보호하기 위한 작은 고속정을 보관하는 동굴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동굴 입구에는 포대를 쌓아올려 동굴의 존재를 은폐하고자 했다.
일본은 이들 시설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주민들을 강제 동원했다. 거문도가 외딴 섬인 만큼 특히 거문도 주민들을 강제 노역에 투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거문도 주민들은 동도 시설물 구축을 위해 하루 약 60여 명 정도의 할당인원을 채워야 했고, 거문도 군사기지 구축에는 거문도 주민뿐만 아니라 육지의 광산 노무자 수백 명도 동원됐다.
남자들은 재향군인회 중심으로 매일같이 군사훈련을 실시했고 여자들도 각종 노역과 훈련에 동원됐다. 밤마다 등화관제 연습이 실시됐고 집집마다 뒷마당에 방공호를 파야만했다. 지금도 거문리에 남아있는 일본식 가옥의 뒤뜰에는 당시 파놓은 방공호들이 남아있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한 이후 일본인들은 거문도를 떠났고, 거문도에 남아있던 일본인 묘지들도 모두 철거됐으나 지금도 남아있는 전쟁 유적들은 그 당시 거문도 주민들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1854년 러시아 함대가 기항한 것을 시작으로 1885년에는 영국군이 2년에 걸쳐 거문도를 무단 점령하기도 했다. 일제강점기 이후에는 일본이 거문도를 점거하고 러·일 전쟁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어업 기지로 삼았다.
이 때문에 일본은 아·태전쟁보다 한참 이른 1904년부터 사세보에서 거문도까지 이어지는 해저케이블을 설치해 군사 통신 시설을 만들고 거문도를 진해만방비대의 전초기지로 삼았다.
거문도는 진해 경비부 사령관의 지휘 아래 들어가고 만 내에는 구축함 등 전함의 출입이 더욱 빈번해져 거문리 해안에는 초계정들이 상주했다. 거문도 인근 해안을 방어하기 위해 진해 경비부 소속의 방비부대가 편성, 배치됐고 1944년 말부터는 일본과 중국을 오가는 수송선단을 호위하기 위한 해방함들도 배치돼 주변의 주정기지를 오가며 호송임무를 수행했다.
 동도에 있는 해안진지동굴 입구 |
거문도의 시설물은 자연암반이나 토갱으로 구축된 다른 지역의 시설물과 달리 콘크리트 입구를 만든 것이 특징이다. 전쟁 중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시간과 물자가 많이 요구되는 콘크리트 타설까지 해 견고히 구축했다는 점은, 일본이 이 곳 군사시설에 상당한 공을 들였음을 암시한다.
서도 불탄봉에 있는 기지 시설이 대표적이다.
시설물 내부는 모두 콘크리트 타설로 구축돼 견고하고 입구 두께만 해도 35㎝에 이르며 가로, 세로 50㎝의 굴뚝이 2개나 만들어져 있다.
‘거문도 수비대 진지 배비요도’에는 불탄봉의 군사기지가 통신시설이었다고 명확히 기록돼 있다. 현재 불탄봉 시설물 내부에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지만, 아·태전쟁 당시에는 통신시설을 갖추고 거문도 주위의 남해안 연안을 관측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일본은 군수물품을 실은 배가 거문도에 들어오면 주민들이 시멘트, 목재 등 군수품을 불탄봉 산 중턱까지 운반했고 일본 군인들이 물품을 받아 가져가는 식으로 시설을 활용했다.
현재 불탄봉 시설에는 ‘일제시대 군사시설 불탄봉 관측소’라는 이름으로 고도의 전경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세워져 있다.
 불탄봉 군사시설 내부 |
독특하게도 거문도 토치카의 벽면은 콘크리트로 만들어졌지만, 천장은 주변 산에서 베어온 굵은 나무를 갱도 버팀목으로 사용해 쌓아올렸다. 이는 전쟁 도중 일본이 시멘트와 철근 등 물자 부족에 시달렸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밖에도 ‘거문도수비대 진지배비 요도’에 따르면 일본군은 서도의 음달산 정상부에 지휘소를 설치, 주변 산기슭에 7~8개의 기관총 설치용 진지동굴과 2개의 포대를 구축한 것으로 확인된다.
동도 죽촌마을에는 산 중턱에 만들어진 콘크리트 동굴 두 개가 남아있다. 이 동굴은 거문도를 넓은 시야로 조망할 수 있어 지휘소의 용도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내부 벽면과 천장, 입구와 내부엔 가로·세로 0.15m, 높이 0.3m 육면체 나무토막이 박혀 있는 것이 특징인데, 사방이 가로막힌 시설물에서 총 등을 발포했을 때 소리를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물로 추정된다.
또 죽촌마을 해안가에는 높이 2.5m, 폭 3m, 길이 16~28m 수준의 해안 동굴 일곱 개가 그대로 남아있다. 이곳 해안 동굴들은 거문도 근해의 남해안을 지나는 큰 함선을 보호하기 위한 작은 고속정을 보관하는 동굴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동굴 입구에는 포대를 쌓아올려 동굴의 존재를 은폐하고자 했다.
일본은 이들 시설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주민들을 강제 동원했다. 거문도가 외딴 섬인 만큼 특히 거문도 주민들을 강제 노역에 투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거문도 수비대 진지배비 요도 |
남자들은 재향군인회 중심으로 매일같이 군사훈련을 실시했고 여자들도 각종 노역과 훈련에 동원됐다. 밤마다 등화관제 연습이 실시됐고 집집마다 뒷마당에 방공호를 파야만했다. 지금도 거문리에 남아있는 일본식 가옥의 뒤뜰에는 당시 파놓은 방공호들이 남아있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한 이후 일본인들은 거문도를 떠났고, 거문도에 남아있던 일본인 묘지들도 모두 철거됐으나 지금도 남아있는 전쟁 유적들은 그 당시 거문도 주민들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