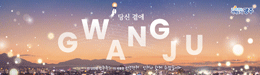인간은 기억과 분리될 수 있을까?…장편소설 ‘시작된 일’
광주일보 신춘 출신 박이수 작가
한 공간 둘러싼 세 인물 기억 그려
“소설은 기억을 다스리는 작업”
한 공간 둘러싼 세 인물 기억 그려
“소설은 기억을 다스리는 작업”
 박이수 작가 |
“ 5년째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기억에 남는 사람들도 다소 있어요. 언젠가는 이들이 소설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죠. 사람들은 거의 비슷하구나, 사람들은 천차만별이구나, 둘 중 정답은 없는 거 같아요. 어느 게 맞는지 가끔 깊이 생각해보지만 답을 내기는 어렵네요.”
다른 직업 없이 온전히 소설 쓰는 일에 몰두하는 이를 일컬어 전업작가라 한다. 글을 쓰는 것으로 밥벌이를 하는 이들의 고통을 감히 상상하기는 어렵다. ‘숭고하다’고 말하기도 벅차다.
작가는 누구나 마음 한 켠에 전업작가에 대한 로망, 아니 열망이 있다. 생계를 신경쓰지 않고 오로지 글만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마는, 그러나 대부분은 현실에 얽매여 있기 마련이다.
직장일을 하면서 작품을 쓰는 주경야작(晝耕夜作)이 일반적인 건 그 때문이다. 박이수 작가도 마찬가지다. 그는 ‘북스테이’를 운영하는 한편 틈틈이 소설을 쓴다. 몇 해 전 북스테이를 운영하기 위해 나주 남평에 건물을 짓고 있다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다. “두 번 다시 집 짓는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어찌나 힘들든지 이럴 줄 알았다면 시작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던 그의 말을 들은 지가 바로 엊그제인 듯 했다.
그로부터 5년 여가 흘렀다. 얼마 전 박 작가가 장편 소설을 발간했다는 소식을 어느 작가가 전했다. 광주일보 신춘문예(2014)에 ‘컨테이너’가 당선돼 등단하면서 문단에 나온 박 작가는 천천히 그러나 뚝심있게 자신만의 창작세계를 열어가는 소설가다.
이번에 펴낸 장편 ‘시작된 일’(걷는 사람)은 한 공간을 둘러싼 세 인물의 기억에 관한 작품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눈과 관점으로 특정 공간을 기억하기 마련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공간의 기억은 윤색이 되기도 하고,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도 한다.
“세 인물에게 각각 다른 색깔과 형질로 남아 존재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기억과 온전히 분리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해요. 어떤 인물에 대한 기억 또는 특정 공간이 심어준 기억 등요. 그러한 기억들이 결국엔 ‘꿈’으로 안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 작가는 이번 작품은 오래 전 집 근처 실내포장마차에서 우연히 만난 한 사람을 통해 왔다고 했다. 자신과 동갑내기였던 그녀가 체념적인 투로 한 말들은 고스란히 소설의 ‘재료’가 됐다. “그녀 이야기는 대부분 지난 과거였는데, 스스럼없이 쏟아내는 독백형 말투가 내면을 흔들었고, 고단하고 치열한 삶의 단면을 보게 됐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바로 소설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흔히 말하는 ‘숙성’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 “기억과 꿈에 대한 연결고리를 만들기가 쉽지 않았다” 는 말은 창작은 고통스럽다는 다른 의미로 들려왔다. 작가에게 쓰고 있을 때보다 안 쓰고 있을 때가 더 힘든 경우가 바로 그런 시간일 터다.
소설에는 지실, 혜영, 이정선이라는 인물이 나온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늙어감’이라는 어찌할 수 없는 숙명에 맞서야 한다. 유년 시절 함께 ‘등대집’이라는 공간을 공유하고 있지만 이들은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다. 지실은 소설가를 지망했으며 정선은 시인이 되고 싶었다. 그리고 혜영은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다. 그러나 인생은 뜻대로만 흘러가지는 않는 법. 시난고난한 고통과 우여곡절은 ‘늙음’ 그리고 ‘좌절’과 맞물리면서 변곡을 만들며 저마다의 ‘서사’가 된다.
문종필 평론가에 따르면 이 작품은 “삶을 치열하게 견디는 과정에서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버티는 이야기”인 셈이다.
문 평론가는 “무엇보다도 이 소설의 인물을 응원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이유 역시 이 인물들이 ‘아웃사이더’라는 점이다. 아웃사이더는 늘 변방에 위치한 존재이지만 잣대를 중앙에 의지할 필요는 없다”며 “인정 욕망에서 벗어나면 정말로 나다운 예술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박 작가는 앞으로도 북스테이를 운영하며 소설 쓰기를 지속할 예정이다. 어렵게 집짓기를 마치고 시설을 갖추는 일이 녹록지 않았지만 결국 그런 과정을 견뎌왔고, 그 과정을 토대로 현재 삶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안다.
“제게 소설은 역시 ‘기억’을 다스리는 작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의 삶은 훗날 또 다른 기억으로 남겠죠. 좋은 소설을 위해서라도 좋은 기억을 엮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다른 직업 없이 온전히 소설 쓰는 일에 몰두하는 이를 일컬어 전업작가라 한다. 글을 쓰는 것으로 밥벌이를 하는 이들의 고통을 감히 상상하기는 어렵다. ‘숭고하다’고 말하기도 벅차다.
직장일을 하면서 작품을 쓰는 주경야작(晝耕夜作)이 일반적인 건 그 때문이다. 박이수 작가도 마찬가지다. 그는 ‘북스테이’를 운영하는 한편 틈틈이 소설을 쓴다. 몇 해 전 북스테이를 운영하기 위해 나주 남평에 건물을 짓고 있다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다. “두 번 다시 집 짓는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어찌나 힘들든지 이럴 줄 알았다면 시작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던 그의 말을 들은 지가 바로 엊그제인 듯 했다.
이번에 펴낸 장편 ‘시작된 일’(걷는 사람)은 한 공간을 둘러싼 세 인물의 기억에 관한 작품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눈과 관점으로 특정 공간을 기억하기 마련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공간의 기억은 윤색이 되기도 하고,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도 한다.
“세 인물에게 각각 다른 색깔과 형질로 남아 존재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기억과 온전히 분리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해요. 어떤 인물에 대한 기억 또는 특정 공간이 심어준 기억 등요. 그러한 기억들이 결국엔 ‘꿈’으로 안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 작가는 이번 작품은 오래 전 집 근처 실내포장마차에서 우연히 만난 한 사람을 통해 왔다고 했다. 자신과 동갑내기였던 그녀가 체념적인 투로 한 말들은 고스란히 소설의 ‘재료’가 됐다. “그녀 이야기는 대부분 지난 과거였는데, 스스럼없이 쏟아내는 독백형 말투가 내면을 흔들었고, 고단하고 치열한 삶의 단면을 보게 됐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바로 소설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흔히 말하는 ‘숙성’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 “기억과 꿈에 대한 연결고리를 만들기가 쉽지 않았다” 는 말은 창작은 고통스럽다는 다른 의미로 들려왔다. 작가에게 쓰고 있을 때보다 안 쓰고 있을 때가 더 힘든 경우가 바로 그런 시간일 터다.
소설에는 지실, 혜영, 이정선이라는 인물이 나온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늙어감’이라는 어찌할 수 없는 숙명에 맞서야 한다. 유년 시절 함께 ‘등대집’이라는 공간을 공유하고 있지만 이들은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다. 지실은 소설가를 지망했으며 정선은 시인이 되고 싶었다. 그리고 혜영은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다. 그러나 인생은 뜻대로만 흘러가지는 않는 법. 시난고난한 고통과 우여곡절은 ‘늙음’ 그리고 ‘좌절’과 맞물리면서 변곡을 만들며 저마다의 ‘서사’가 된다.
문종필 평론가에 따르면 이 작품은 “삶을 치열하게 견디는 과정에서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버티는 이야기”인 셈이다.
문 평론가는 “무엇보다도 이 소설의 인물을 응원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이유 역시 이 인물들이 ‘아웃사이더’라는 점이다. 아웃사이더는 늘 변방에 위치한 존재이지만 잣대를 중앙에 의지할 필요는 없다”며 “인정 욕망에서 벗어나면 정말로 나다운 예술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박 작가는 앞으로도 북스테이를 운영하며 소설 쓰기를 지속할 예정이다. 어렵게 집짓기를 마치고 시설을 갖추는 일이 녹록지 않았지만 결국 그런 과정을 견뎌왔고, 그 과정을 토대로 현재 삶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안다.
“제게 소설은 역시 ‘기억’을 다스리는 작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의 삶은 훗날 또 다른 기억으로 남겠죠. 좋은 소설을 위해서라도 좋은 기억을 엮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