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을 읽는 법, 단 장지연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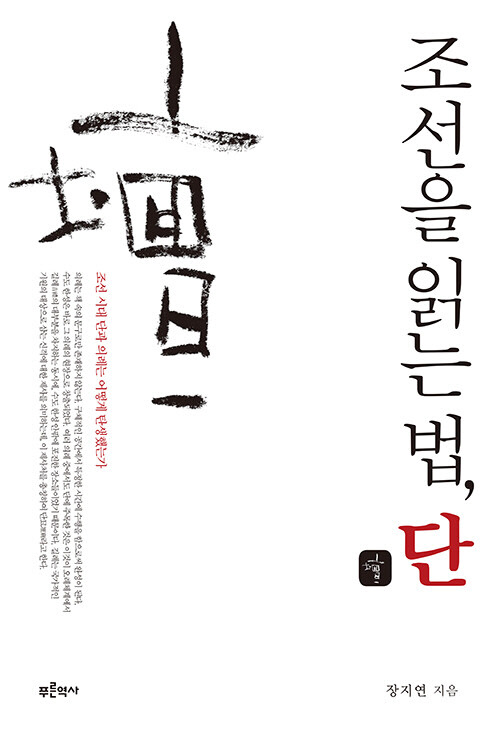 |
‘유교의 나라’라는 수식어로 단정되곤 하는 조선. 한성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성리학적 세계관, 왕과 신하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부터 ‘국조오례의’와 같은 예서로 치밀하게 구성된 의례까지. 이러한 촘촘한 규범은 조선을 이념에 갇힌 탁상공론의 국가처럼 보이게 한다. 하지만 조선은 과연 그렇게 일방적인 질서로만 움직였을까?
최근 출간된 ‘조선을 읽는 법, 단壇’은 그러한 통념에 의문을 던진다. 저자인 장지연 대전대 교수는 ‘단’이라는 의례의 공간을 매개로 조선의 예치(禮治)가 지향한 이상과 그것을 둘러싼 현실의 긴장 관계를 분석했다.
의례 중에서도 ‘단’은 하늘, 땅, 산천, 농경의 신처럼 신격에 대해 제사를 지내는 장소다. 책은 조선 한성을 중심으로 도성 안팎에 자리한 단들을 분석하며, 조선이 의례를 통해 어떤 국가적 비전과 사회적 규범을 실현하려 했는지를 탐색한다. 사직단, 선농단, 여제단, 선잠단, 풍운뢰우산천성황단, 우사단 등 수도를 둘러싼 다양한 단은 단순한 제사의 장소가 아닌, 조선이 이상국가로서의 자의식을 형상화하고 드러내는 의례적 무대였다.
저자는 조선의 의례가 오늘날 ‘이념의 과잉’ 혹은 ‘탁상공론’으로 읽히는 이유는, 우리가 그 의미망과 작동 논리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고려가 무너지고 조선이 들어선 전환의 시기, 단은 새로운 권력과 공동체의 형식, 그리고 사회적 규범이 구현되는 상징적 공간이었다는 것이다. 책은 단을 중심으로 조선을 해석하는 작업을 통해 과거에 대한 잘못한 인상을 교정하고, 우리가 지나온 길에 대한 이해를 넓힐 기회를 제공한다. <푸른역사·2만9800원>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의례 중에서도 ‘단’은 하늘, 땅, 산천, 농경의 신처럼 신격에 대해 제사를 지내는 장소다. 책은 조선 한성을 중심으로 도성 안팎에 자리한 단들을 분석하며, 조선이 의례를 통해 어떤 국가적 비전과 사회적 규범을 실현하려 했는지를 탐색한다. 사직단, 선농단, 여제단, 선잠단, 풍운뢰우산천성황단, 우사단 등 수도를 둘러싼 다양한 단은 단순한 제사의 장소가 아닌, 조선이 이상국가로서의 자의식을 형상화하고 드러내는 의례적 무대였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