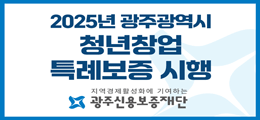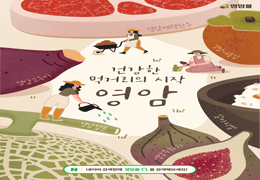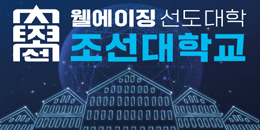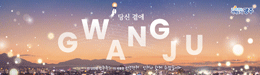[이소영의 ‘우리지역 우리식물’] 전정되지 않을 자유, 중계리 꽝꽝나무
 |
식물을 관찰하기 위해 방문하는 식물원과 정원에는 늘 식물을 가꾸는 원예가가 있다. 이들은 쭈그려 앉아 풀을 심거나 나뭇잎을 긁어 모으고 호스를 끌어다 식물에 물을 주곤 한다.
싱가포르, 베트남과 같은 동남아 국가에서는 유독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원예가를 자주 만났다. 습하고 무더운 날씨에 나무가 무척 빨리 자라기 때문에 그 속도에 맞춰 전정을 자주 해야 한다고 한다. 사다리를 타고 수십 미터 높이의 나무에 올라 가지에 몸을 기대어 가위를 이리저리 대어 보는 원예가의 모습을 잊을 수 없다.
우리 곁의 나무는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심어진다. 가로수와 조경수의 경우 도시 미관을 위해 심어지며, 우리가 먹는 사과와 배, 감 등의 과수는 오로지 식용을 위해 심어진다. 우리가 이런 식물을 전정하는 목적도 두 가지다. 경관을 위한 식물은 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과수는 더 많은 양을 수확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식재되는 나무 중 하나가 회양목이 아닐까 싶다. 길가의 크고 작은 화단, 도로와 건축물 주변에는 늘 회양목이 있다. 이들은 공해와 기온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병해충도 적고 강건하다. 물론 회양목의 최대 장점은 따로 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전정한 대로 형태를 오래도록 유지한다는 점이다. 전정해도 금방 제멋대로 가지와 잎을 뻗는 나무가 있는 반면 회양목은 한번 전정 해 두면 수년 간 특별한 관리가 필요 없다. 이들은 1미터가 되지 않는 높이로 직사각 혹은 구형 형태의 ‘가구’처럼 이용된다. 지나는 사람에게 동선을 유도하고, 공간을 구분 짓는 것이 도시 회양목의 역할이다.
그러나 숲에서 스스로 번식해 자라난 회양목은 우리가 도시에서 보는 것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인간이 끼어들지 않는 삶을 사는 회양목은 높이 3미터까지 자라며 가지는 사방으로 뻗어 난다.
재작년 인천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들과 교내의 식물을 관찰해 그림으로 기록하는 수업을 하던 중 한 어린이가 회양목을 ‘네모 나무’ 부르는 것을 보았다. 늘 네모난 모양의 나무로 존재해서 네모 나무라고. 나는 언젠가 산에서 만난 회양목 사진을 찾아 어린이에게 보여 주었다. “이 나무도 회양목이야. 회양목은 숲에서 이렇게 자유로운 모습으로 살아간단다.”
비단 어린이만 회양목을 네모 나무로 부르는 건 아니다. 도시에서 단정히 전정된 형태의 나무만 보아온 사람들은 산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회양목, 향나무, 측백나무를 만나더라도 자신이 아는 그 식물이라고 생각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남부 지역에서는 꽝꽝나무가 회양목의 역할을 대신한다. 따뜻한 환경을 좋아하는 이들은 제주도를 비롯해 우리나라 남부 지역에서 자란다. 꽝꽝나무라는 다소 독특한 이름은 불에 탈 때 ‘꽝꽝’ 소리를 낸다고 붙여졌다.
이들 잎의 크기는 회양목보다는 조금 더 크고 잎에는 거치가 있다. 여름에 흰 꽃이 지면 둥근 열매가 가지에 매달려 난다. 빛깔은 연두색으로 시작해 보라색, 검은색으로 익어가고 다시 검은색에서 보라색 그리고 흰색으로 물이 빠진다. 나는 이 열매 색의 변화를 좋아한다. 물론 우리가 이들에게 필요로 하는 건 단정하게 전정된 수형이기에 꽃과 열매의 색 변화는 큰 의미가 없다.
전북 부안 중계리에는 천연기념물로 보호 받는 꽝꽝나무 군락이 있다. 이들은 도시에서 마구 전정되는 꽝꽝나무와는 다른 삶을 산다. 가지가 사방으로 뻗으며 도시의 것보다 잎 색도 더 진한 청록색이다. 가지마다 잎이 풍성히 들어차 있지도 않다. 숲의 나무를 볼 때면 도시 나무의 과도한 풍성함 또한 인간이 자연에 기대하는 요소라고 느낄 때가 많다. 오히려 잎의 빈자리가 있을 때, 가지가 마구잡이로 난 모습일 때 비로소 ‘이것이 자연스러움이구나’ 싶다.
중계리의 꽝꽝나무 사진을 열심히 찍으며 생각했다. 누군가 도시의 꽝꽝나무를 두고 네모 나무라 부른다면 이 사진을 보여 주리라고.
나는 우리 곁의 나무들이 더 자유로워지기를 바란다. <식물 세밀화가>
싱가포르, 베트남과 같은 동남아 국가에서는 유독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원예가를 자주 만났다. 습하고 무더운 날씨에 나무가 무척 빨리 자라기 때문에 그 속도에 맞춰 전정을 자주 해야 한다고 한다. 사다리를 타고 수십 미터 높이의 나무에 올라 가지에 몸을 기대어 가위를 이리저리 대어 보는 원예가의 모습을 잊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식재되는 나무 중 하나가 회양목이 아닐까 싶다. 길가의 크고 작은 화단, 도로와 건축물 주변에는 늘 회양목이 있다. 이들은 공해와 기온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병해충도 적고 강건하다. 물론 회양목의 최대 장점은 따로 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전정한 대로 형태를 오래도록 유지한다는 점이다. 전정해도 금방 제멋대로 가지와 잎을 뻗는 나무가 있는 반면 회양목은 한번 전정 해 두면 수년 간 특별한 관리가 필요 없다. 이들은 1미터가 되지 않는 높이로 직사각 혹은 구형 형태의 ‘가구’처럼 이용된다. 지나는 사람에게 동선을 유도하고, 공간을 구분 짓는 것이 도시 회양목의 역할이다.
재작년 인천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들과 교내의 식물을 관찰해 그림으로 기록하는 수업을 하던 중 한 어린이가 회양목을 ‘네모 나무’ 부르는 것을 보았다. 늘 네모난 모양의 나무로 존재해서 네모 나무라고. 나는 언젠가 산에서 만난 회양목 사진을 찾아 어린이에게 보여 주었다. “이 나무도 회양목이야. 회양목은 숲에서 이렇게 자유로운 모습으로 살아간단다.”
비단 어린이만 회양목을 네모 나무로 부르는 건 아니다. 도시에서 단정히 전정된 형태의 나무만 보아온 사람들은 산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회양목, 향나무, 측백나무를 만나더라도 자신이 아는 그 식물이라고 생각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남부 지역에서는 꽝꽝나무가 회양목의 역할을 대신한다. 따뜻한 환경을 좋아하는 이들은 제주도를 비롯해 우리나라 남부 지역에서 자란다. 꽝꽝나무라는 다소 독특한 이름은 불에 탈 때 ‘꽝꽝’ 소리를 낸다고 붙여졌다.
이들 잎의 크기는 회양목보다는 조금 더 크고 잎에는 거치가 있다. 여름에 흰 꽃이 지면 둥근 열매가 가지에 매달려 난다. 빛깔은 연두색으로 시작해 보라색, 검은색으로 익어가고 다시 검은색에서 보라색 그리고 흰색으로 물이 빠진다. 나는 이 열매 색의 변화를 좋아한다. 물론 우리가 이들에게 필요로 하는 건 단정하게 전정된 수형이기에 꽃과 열매의 색 변화는 큰 의미가 없다.
전북 부안 중계리에는 천연기념물로 보호 받는 꽝꽝나무 군락이 있다. 이들은 도시에서 마구 전정되는 꽝꽝나무와는 다른 삶을 산다. 가지가 사방으로 뻗으며 도시의 것보다 잎 색도 더 진한 청록색이다. 가지마다 잎이 풍성히 들어차 있지도 않다. 숲의 나무를 볼 때면 도시 나무의 과도한 풍성함 또한 인간이 자연에 기대하는 요소라고 느낄 때가 많다. 오히려 잎의 빈자리가 있을 때, 가지가 마구잡이로 난 모습일 때 비로소 ‘이것이 자연스러움이구나’ 싶다.
중계리의 꽝꽝나무 사진을 열심히 찍으며 생각했다. 누군가 도시의 꽝꽝나무를 두고 네모 나무라 부른다면 이 사진을 보여 주리라고.
나는 우리 곁의 나무들이 더 자유로워지기를 바란다. <식물 세밀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