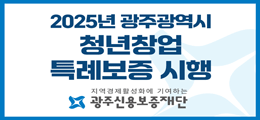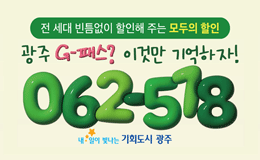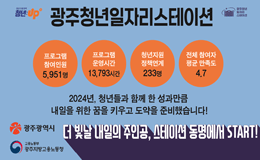위미항- 중현 광주 증심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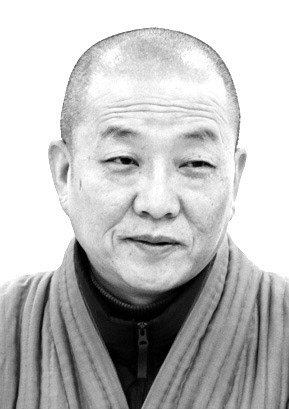 |
위미항은 작은 어촌 마을이다. 제주 서귀포에서 쇠소깍을 지나 동쪽으로 10여 분 정도 더 가면 나타난다. 처음 가면 양쪽으로 길게 뻗은 이국적인 가로수가 사람들을 반긴다. 마을을 가로지르는 왕복 2차선의 텅빈 도로는 언제 봐도 아름답고, 거리는 한산하다. 그러나 마을엔 생기가 흐른다. 젊은 여성이 독립 책방을 하고, 저녁 6시에 문을 여는 퓨전 일식 식당 겸 주점엔 젊은 사람들이 찾아온다. 건물들은 낡았어도 대부분 깔끔하다.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작은 포구니까 오로지 어업만으로 마을을 이렇듯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상당 부분 육지에서 찾아오는 나 같은 여행객들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리라 짐작된다. 관광지는 아니지만, 마을엔 여행객을 위한 숙박시설, 식당, 카페, 편의점 같은 시설들이 구석구석 숨어 있다.
20대 초반 무렵, 동아리에서 지리산으로 MT를 간 적 있었다. 남원역에서 내린 우리 일행은 구경 삼아 광한루까지 걸어갔는데, 불과 10여 분만에 도착했다. 도착해서 보니 광한루가 남원의 끝자락이었다. 대도시에서 태어나 자랐던 내게, 남원 같은 소도시는 매우 신선한 경험이었다. 기억의 정확성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그 기억은 내게 지방 소도시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원천이 되었다.
청년 시절의 동경 때문일까, 처음 가본 위미항은 내 마음을 적잖이 설레이게 하고, 심지어 눌러 앉아 살고 싶은 충동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충동의 이면에는 지난 20여 년 넘게 산속에서만 산 피로감도 한 몫하고 있다. 그러나 나의 이런 설렘이 단순히 이런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이 나라의 일반적인 읍 소재지는 위미항처럼 그렇게 활력이 넘쳐 흐르지 않는다. 물론 군청이 있는 읍 소재지는 나름 약간의 활기가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읍 소재지에서 생기를 찾아보기는 매우 힘들다.
전형적인 읍 소재지의 모습은 대충 이렇다. 눈에 띄는 사람들은 노인네들이다. 건물들도 사는 사람들을 닮아, 낡고 손보지 않은 티가 많이 난다. 길가엔 이빨 빠진 것처럼 문을 닫은 가게들이 듬성듬성 있다. 주변엔 논과 밭이 펼쳐져 있는데, 폐비닐 같은 농업용 폐기물, 낡은 비닐하우스, 폐가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나마 도회지의 사람들이 드라이브 삼아 다녀올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마을들은 나은 편이다. 도회지 사람들이 도시의 갑갑함을 풀 수 있는 곳으로 소비되기 때문이다.
갈수록 이 나라는 도시 국가로 변하고 있다. 사람들은 도시로 몰려들고 있다. 덩달아 모든 자원 역시 도시로 집중되고 있다. 심지어 이런 집중화 현상은 도시들 간에도 매우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어 모든 자원들은 갈수록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 수도권 자체가 하나의 도시 공화국으로 이미 변하였다. 명실상부한 제2의 도시였던 부산이 졸지에 그 자리를 인천에게 뺏겼지만 그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상황이 이러하니 소도시는 고사하고 고작 읍 소재지는 말해 무엇할까.
차라리 청년 시절의 막연한 동경, 산중 생활의 피로감이었다면 다행이다. 안타깝게도 위미항을 향한 나의 설렘은 도시 국가 아니, 서울 공화국으로 변해버린 이 사회에 대한 염증, 그리고 몰락하고 있는 시골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다.
그건 그렇다 치고 여기 그냥 눌러앉고 싶다는 나의 생각은 과연 실현 가능할까? 잠시 와서 돈을 뿌리고 가는 여행객이야 상관없겠지만 아예 눌러 앉겠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시골 특유의 폐쇄성을 감수해야 한다. 오히려 정갈하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폐쇄성은 반드시 감수해야 한다. 폐쇄성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그저 겉도는 이방인에 불과하다. 설령 기존의 구성원들이 받아준다 해도 폐쇄성은 여전히 건재하다. 폐쇄성은 두개의 얼굴을 하고 있다. 이방인을 향한 폐쇄성이 일종의 방패라면, 일원이 된 이후의 폐쇄성은 사람을 옥죄는 족쇄와도 같은 것이다.
점점 죽어가는 육지의 시골 마을들은 스산한 기운마저 풍긴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런 이유 때문에 폐쇄성도 함께 사라지고 있다. 이유야 뭐가 되었건 폐쇄성이 사라지는 건 좋은 일이다. 바닥을 치게 되면 뭐가 되었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쇠락한 시골에서 오히려 희망을 찾는다. 비록 낡은 부대라도 잘만 손보면 세월을 머금은 새 술을 담글 수 있다.
전형적인 읍 소재지의 모습은 대충 이렇다. 눈에 띄는 사람들은 노인네들이다. 건물들도 사는 사람들을 닮아, 낡고 손보지 않은 티가 많이 난다. 길가엔 이빨 빠진 것처럼 문을 닫은 가게들이 듬성듬성 있다. 주변엔 논과 밭이 펼쳐져 있는데, 폐비닐 같은 농업용 폐기물, 낡은 비닐하우스, 폐가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나마 도회지의 사람들이 드라이브 삼아 다녀올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마을들은 나은 편이다. 도회지 사람들이 도시의 갑갑함을 풀 수 있는 곳으로 소비되기 때문이다.
갈수록 이 나라는 도시 국가로 변하고 있다. 사람들은 도시로 몰려들고 있다. 덩달아 모든 자원 역시 도시로 집중되고 있다. 심지어 이런 집중화 현상은 도시들 간에도 매우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어 모든 자원들은 갈수록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 수도권 자체가 하나의 도시 공화국으로 이미 변하였다. 명실상부한 제2의 도시였던 부산이 졸지에 그 자리를 인천에게 뺏겼지만 그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상황이 이러하니 소도시는 고사하고 고작 읍 소재지는 말해 무엇할까.
차라리 청년 시절의 막연한 동경, 산중 생활의 피로감이었다면 다행이다. 안타깝게도 위미항을 향한 나의 설렘은 도시 국가 아니, 서울 공화국으로 변해버린 이 사회에 대한 염증, 그리고 몰락하고 있는 시골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다.
그건 그렇다 치고 여기 그냥 눌러앉고 싶다는 나의 생각은 과연 실현 가능할까? 잠시 와서 돈을 뿌리고 가는 여행객이야 상관없겠지만 아예 눌러 앉겠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시골 특유의 폐쇄성을 감수해야 한다. 오히려 정갈하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폐쇄성은 반드시 감수해야 한다. 폐쇄성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그저 겉도는 이방인에 불과하다. 설령 기존의 구성원들이 받아준다 해도 폐쇄성은 여전히 건재하다. 폐쇄성은 두개의 얼굴을 하고 있다. 이방인을 향한 폐쇄성이 일종의 방패라면, 일원이 된 이후의 폐쇄성은 사람을 옥죄는 족쇄와도 같은 것이다.
점점 죽어가는 육지의 시골 마을들은 스산한 기운마저 풍긴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런 이유 때문에 폐쇄성도 함께 사라지고 있다. 이유야 뭐가 되었건 폐쇄성이 사라지는 건 좋은 일이다. 바닥을 치게 되면 뭐가 되었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쇠락한 시골에서 오히려 희망을 찾는다. 비록 낡은 부대라도 잘만 손보면 세월을 머금은 새 술을 담글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