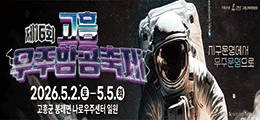[정후식 칼럼] 국회 지역구 의석, 왜 유권자가 걱정해야 하나-논설실장·이사
 |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심의하는 동시에 자신의 지역구를 대표한다. 이런 이유로 국회의원 의석수는 특정 지역의 정치적 위상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되곤 한다.
제헌국회 선거 이래 다양한 정치적 실험이 진행되면서 국회의원 선거구와 의석수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헌법상 국회의원 정수 및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도 이에 한 몫을 했다. 호남의 지역구 의석수 역시 변동이 컸다. 그만큼 정치적 부침이 심했다는 얘기다.
호남 39석→28석 축소 정치 위상 약화
5·16 군사쿠데타와 5차 개헌으로 입법부가 민의원·참의원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바뀐 1963년 제6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호남의 지역구 의석수는 전남 19석, 전북 11석 등 모두 30석이었다. 이후 선거구마다 두 명씩 선출하는 중선거구제가 도입된 9대~12대 총선에는 32석~36석을 유지했다. 민주화 이후 첫 총선이었던 1988년 제13대에 37석, 14대 때는 39석까지 늘며 정점을 찍었다. 소선거구와 비례대표제가 적용돼 의원 정수가 299명(지역구 224명)으로 증가하고 광주가 분리된 영향이었다.
그러다 17대에 31석, 19대 30석, 20대 이후엔 28석으로 감소했다. 20여 년 사이 11석이나 줄어든 것이다. 중앙 정치 무대에서 호남의 목소리가 그만큼 작아졌다는 의미다. 특히 6대와 21대 총선을 비교하면 전국 지역구 의원 정수는 131명에서 253명으로 늘어난 반면에 호남 의석수 비중은 22.9%에서 11.1%로 반토막 났다.
전국 인구에서 호남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6대 총선 당시 전국 선거인 수(1334만 명) 가운데 호남 유권자(295만 명)는 22.1%에 달했으나 21대에는 10.1%로 쪼그라들었다.
반면 수도권 의석수는 6대 때 27석에서 21대에는 121석으로 네 배 이상 폭증했다. 선거인 수 비중도 24.0%(320만 명)에서 50.1%(2204만 명)로 급증했다. 이처럼 국회 의석수마저 갈수록 수도권에 편중되니 국토 균형 발전이 제대로 이뤄질 리 만무하다.
국회의원 선거구를 정할 때는 행정구역과 인구수, 생활구역, 교통, 지세(地勢)는 물론 정치·경제·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한데 우리나라는 인구수를 절대 기준으로 삼아 왔다. 특히 1995년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인구 비례 원칙이 선거구 획정의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선거구 간 인구 상·하한 편차도 지난 20여 년 간 4 대 1에서 3 대 1, 다시 2대 1로 줄어들었다.
이런 추세는 인구 감소가 가속화하는 지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또다시 광주·전남 지역구 의석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거나 근접하는 선거구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면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상·하한선을 조정하는데, 지난 21대 총선의 인구 상한선은 27만 8000명, 하한선은 13명 9000명이었다.
한데 지난 8월 말 현재 주민등록 인구수는 여수 갑 선거구의 경우 12만 7254명에 불과했다. 이처럼 21대 총선 인구 하한선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지역구 유지에 빨간불이 켜진 곳이 적지 않다. 광주 서구 을(13만 9589명)과 동남 갑(14만 325명), 서구 갑(14만 8511명), 해남·완도·진도(14만 3977명) 등이 대표적이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선거일 1년 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수 기준일은 그보다 빠른 내년 1월 30일이어서 하한선을 넘지 못하는 지역구는 기준일 이전에 주민을 늘리거나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해야 유지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은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며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광주의 경우 자치구 간 경계 조정으로 인구 편차를 해소하는 것이 의석수 유지의 관건이다. 북구의 4분의 1에 불과한 동구 인구 때문에 남구를 합쳐 ‘동남 갑’과 ‘동남 을’이라는 기형적 선거구를 유지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그렇다. 하지만 지난 7월 지역 국회의원과 지자체장들이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모처럼 한 자리에 모였지만 의원들 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8년을 끌어온 논의가 또다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더욱이 충청의 인구가 호남을 추월하면서 영호남으로 양분되던 지역 정치 지형은 ‘영충호’(영남·충청·호남)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국회 의석수만 해도 19대 총선 때는 호남 30석, 충청 25석이었으나 지금은 28석으로 똑같다. 나아가 현재 충청 인구는 554만여 명으로 호남보다 50만 명 이상 많아졌고,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지역 정치권에서 위기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다.
면적 반영 농어촌 대표성 강화해야
국회의원 수가 줄면 지역 현안과 관련한 입법·예산 확보는 물론 지역 여론조차 중앙에 제대로 전달하기 어렵다. 정치적 변방으로 밀려나는 셈이다. 특히 인구 비례만 강조하면 도농 간 인구수 차이로 농어촌을 대변하는 의원들이 계속 줄어 지역 대표성이 크게 약화된다. 인구 과소(過小) 지역 통폐합에 따라 의원 한 명이 여러 시군을 대표하는 공룡 선거구도 속출한다. 전남만 해도 네 개 시군이 모여 한 개 선거구를 이루는 지역이 네 곳이나 된다. 그렇다 보니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을 선거구의 면적은 2364㎢로 의원 49명을 뽑는 서울(605㎢)의 네 배에 육박한다.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영국·캐나다 등처럼 면적 기준을 도입해 지역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 국회는 그동안 선거구 획정 때마다 법정 시한을 어겨가며 투표를 불과 30~40일 남겨 놓고 게리맨더링을 되풀이했다. 이러한 기득권 구태에서 벗어나 사전 숙의를 통해 호남과 농어촌이 소외받지 않는 선거구를 마련하는 데 지역 의원들이 앞장서야 한다. 의석마저 스스로 지키지 못한다면 무슨 낯으로 또 표를 달라고 할 것인가.
제헌국회 선거 이래 다양한 정치적 실험이 진행되면서 국회의원 선거구와 의석수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헌법상 국회의원 정수 및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도 이에 한 몫을 했다. 호남의 지역구 의석수 역시 변동이 컸다. 그만큼 정치적 부침이 심했다는 얘기다.
5·16 군사쿠데타와 5차 개헌으로 입법부가 민의원·참의원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바뀐 1963년 제6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호남의 지역구 의석수는 전남 19석, 전북 11석 등 모두 30석이었다. 이후 선거구마다 두 명씩 선출하는 중선거구제가 도입된 9대~12대 총선에는 32석~36석을 유지했다. 민주화 이후 첫 총선이었던 1988년 제13대에 37석, 14대 때는 39석까지 늘며 정점을 찍었다. 소선거구와 비례대표제가 적용돼 의원 정수가 299명(지역구 224명)으로 증가하고 광주가 분리된 영향이었다.
전국 인구에서 호남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6대 총선 당시 전국 선거인 수(1334만 명) 가운데 호남 유권자(295만 명)는 22.1%에 달했으나 21대에는 10.1%로 쪼그라들었다.
반면 수도권 의석수는 6대 때 27석에서 21대에는 121석으로 네 배 이상 폭증했다. 선거인 수 비중도 24.0%(320만 명)에서 50.1%(2204만 명)로 급증했다. 이처럼 국회 의석수마저 갈수록 수도권에 편중되니 국토 균형 발전이 제대로 이뤄질 리 만무하다.
국회의원 선거구를 정할 때는 행정구역과 인구수, 생활구역, 교통, 지세(地勢)는 물론 정치·경제·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한데 우리나라는 인구수를 절대 기준으로 삼아 왔다. 특히 1995년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인구 비례 원칙이 선거구 획정의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선거구 간 인구 상·하한 편차도 지난 20여 년 간 4 대 1에서 3 대 1, 다시 2대 1로 줄어들었다.
이런 추세는 인구 감소가 가속화하는 지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또다시 광주·전남 지역구 의석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거나 근접하는 선거구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면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상·하한선을 조정하는데, 지난 21대 총선의 인구 상한선은 27만 8000명, 하한선은 13명 9000명이었다.
한데 지난 8월 말 현재 주민등록 인구수는 여수 갑 선거구의 경우 12만 7254명에 불과했다. 이처럼 21대 총선 인구 하한선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지역구 유지에 빨간불이 켜진 곳이 적지 않다. 광주 서구 을(13만 9589명)과 동남 갑(14만 325명), 서구 갑(14만 8511명), 해남·완도·진도(14만 3977명) 등이 대표적이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선거일 1년 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수 기준일은 그보다 빠른 내년 1월 30일이어서 하한선을 넘지 못하는 지역구는 기준일 이전에 주민을 늘리거나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해야 유지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은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며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광주의 경우 자치구 간 경계 조정으로 인구 편차를 해소하는 것이 의석수 유지의 관건이다. 북구의 4분의 1에 불과한 동구 인구 때문에 남구를 합쳐 ‘동남 갑’과 ‘동남 을’이라는 기형적 선거구를 유지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그렇다. 하지만 지난 7월 지역 국회의원과 지자체장들이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모처럼 한 자리에 모였지만 의원들 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8년을 끌어온 논의가 또다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더욱이 충청의 인구가 호남을 추월하면서 영호남으로 양분되던 지역 정치 지형은 ‘영충호’(영남·충청·호남)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국회 의석수만 해도 19대 총선 때는 호남 30석, 충청 25석이었으나 지금은 28석으로 똑같다. 나아가 현재 충청 인구는 554만여 명으로 호남보다 50만 명 이상 많아졌고,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지역 정치권에서 위기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다.
면적 반영 농어촌 대표성 강화해야
국회의원 수가 줄면 지역 현안과 관련한 입법·예산 확보는 물론 지역 여론조차 중앙에 제대로 전달하기 어렵다. 정치적 변방으로 밀려나는 셈이다. 특히 인구 비례만 강조하면 도농 간 인구수 차이로 농어촌을 대변하는 의원들이 계속 줄어 지역 대표성이 크게 약화된다. 인구 과소(過小) 지역 통폐합에 따라 의원 한 명이 여러 시군을 대표하는 공룡 선거구도 속출한다. 전남만 해도 네 개 시군이 모여 한 개 선거구를 이루는 지역이 네 곳이나 된다. 그렇다 보니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을 선거구의 면적은 2364㎢로 의원 49명을 뽑는 서울(605㎢)의 네 배에 육박한다.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영국·캐나다 등처럼 면적 기준을 도입해 지역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 국회는 그동안 선거구 획정 때마다 법정 시한을 어겨가며 투표를 불과 30~40일 남겨 놓고 게리맨더링을 되풀이했다. 이러한 기득권 구태에서 벗어나 사전 숙의를 통해 호남과 농어촌이 소외받지 않는 선거구를 마련하는 데 지역 의원들이 앞장서야 한다. 의석마저 스스로 지키지 못한다면 무슨 낯으로 또 표를 달라고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