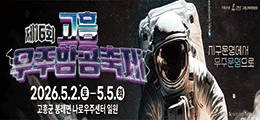[정후식 칼럼] ‘무등’(無等)을 꿈꾸며 무돌길을 걷다-논설실장·이사
 |
“나는 걸을 때만 사색할 수 있다. 내 걸음이 멈추면 내 생각도 멈춘다. 내 두 발이 움직여야 내 머리가 움직인다.”(루소) 유인원에서 갈라져 나온 인간이 네 발 보행을 포기하고 두 발 걷기를 선택한 것은 그야말로 ‘신의 한수’였다. 직립 보행과 두 손의 자유가 도구 사용과 언어·인지 능력 향상을 가져다주었기 때문이다. “모든 위대한 생각은 걷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는 니체의 통찰 역시 과장이 아니다.
길을 걷는 것이 때로 영감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걷기를 체화하기 전까지는 실감하지 못했다. 걷기는 나아가 인간과 자연을 이어 준다. 대자연을 거닐다 보면 지친 몸과 마음이 절로 치유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나무는 산소를 배출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데 사람은 정반대이니 들숨과 날숨의 절묘한 조화다. 그 숨결에 집중하여 걷다 보면 아득하게 잊고 있던, 우리 모두가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마을에서 마을로…호남 문화 소통길
걷기의 가치에 새삼 눈뜨게 된 것은 3년째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를 관통하면서다. 팬데믹(대유행)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날려 버리는 데 걷기 만한 게 없었다. 감염병에 대항할 면역력을 키우는 것은 덤이다.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모델로 지난 2007년 제주에 올레길이 탄생한 이후 국내 곳곳에 걷기 좋은 길이 조성됐다. 해파랑길·남파랑길·서해랑길로 구성된 ‘코리아 둘레길’은 길이가 4500㎞에 달한다. 광주에도 무등산 자락을 따라 한 바퀴 빙 도는 무돌길(60㎞)과 옛사람들이 도심에서 무등산 정상에 오르던 길을 복원한 무등산 옛길(23.2㎞), 도심 외곽을 연결한 빛고을 산들길(81.5㎞) 등이 잇따라 조성됐다. 그중에서도 무돌길은 산티아고 순례길이나 올레길 못지않은 반산반야(半山半野)의 명품 길이다.
무돌길은 단순히 무등산 둘레를 따라 길을 만든 것이 아니라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이 봇짐을 메고, 지게를 지고, 자손들 손을 잡고 걸었던 길을 복원해 연결한 것이다. 30여 개 마을과 마을, 계곡과 숲정이를 이어 주는 생활문화 소통의 길이다.
무돌길이 처음 열린 것은 지난 2010년. 증심계곡과 원효계곡 쪽으로 집중되던 탐방객들을 분산시키고, 정상만을 향한 수직적 등산이 아니라 수평적 탐방을 즐길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자연공원을 확대해 보자는 게 그 취지였다. 무등산 보호 운동에 헌신해 온 김인주 (사)무등산무돌길협의회 상임의장과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1910년대 제작된 지도를 토대로 길을 개척했다. 무돌길이라는 이름은 백제시대 쓰였던 무등산의 맨 처음 명칭 ‘무돌뫼’에서 따온 것이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광주 북구 각화마을에서 출발해 담양과 화순, 광주 동구를 거쳐 광주역까지 수백 년 역사를 간직한 길들을 연결할 수 있었다. 의병운동과 동학농민운동, 학생독립운동의 자양분이 되었던 무등 정신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자는 의미에서 애초 길이는 51.8㎞로 정했다. 여기에 2017년에는 광주역에서 전남대를 관통하는 ‘민주의 길’과 북구 ‘천지인길’을 거쳐 각화마을까지 8㎞를 추가해 무등산 자락 한 바퀴를 완전히 돌아 볼 수 있는 환상(環狀)형 길이 완성됐다.
무돌길은 크게 16개 구간으로 나뉘며 남녀노소 누구나 사부자기 걸을 수 있다. 1길은 각화마을부터 시작하지만 경사도와 접근성을 고려하면 광주역(15길)에서 푸른길 공원과 대추여울(광주천)을 따라 역순으로 도는 것이 수월하다. 무돌길은 호남정맥을 기준으로 광주 북구·담양 쪽의 영산강 수계와 화순 쪽 섬진강 수계로 구분되는데, 북구·담양 쪽에서 오르는 길의 경사가 약간 더 가파르기 때문이다. 표고 차는 해발 200~400m가량.
그곳에는 인문의 향기와 역사의 숨결이 그윽하다. 무등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곡인 원효계곡 줄기를 따라 자리한 소쇄원·식영정·환벽당은 면앙정 송순을 비롯해 사촌 김윤재, 석천 임억령, 소쇄옹 양산보 등 호남 유림들이 교류하며 시를 짓던 시가문학과 계산풍류(溪山風流)의 산실이다. 방랑시인 김삿갓의 자취도 산재해 있다. 충효동 도요지와 복조리 마을, 동네 어귀마다 자리한 정자와 샘터에는 전통문화와 공동체 의식이 살아 숨 쉰다.
무돌길은 또한 나라가 위태로울 때 분연히 일어섰던 호남 의병의 활동 무대이다. 김덕령 장군을 기리는 충장사와 김태원 장군 전적비, 의병들이 넘어 다녔던 백남정재 등에 그들의 충혼의백이 서려 있다. 시대정신과 대의를 지키려는 자기희생의 저항 정신은 면면히 이어져 5·18민주화운동으로 타올랐다. 그 주 무대 역시 무돌길을 따라 이어진다. 무돌길을 ‘지구촌 민주화운동의 성지 순례길’로 조성하자는 취지로 지난 6월 전국에서 2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회 전국 무돌길완주대회’가 열린 배경이다.
차별과 배제 없는 조화의 세계로
무돌길 걷기의 백미는 무등산 조망이다. 산자락을 따라 동서남북 한 바퀴를 도는 내내 변화무쌍하게 형상을 달리하며 길잡이이자 푯대가 되어 준다. 부드러운 육산(肉山) 곳곳에 파격으로 얹혀 있는 주상절리, 서석·입석·광석대와 너널들은 신비감을 더한다.
무등(無等)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등급이나 차별이 없음이요, 다른 하나는 그 이상 더할 수 없는 정도를 가리킨다. 평등을 넘어선 무등의 세계, 비할 데 없는 경지다. 정상 삼봉에 천왕·지왕·인왕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도 천지인삼재(天地人三才)가 하나이고 ‘사람이 곧 하늘’(人乃天)이라는 인간 존중의 발로였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무돌길을 걷는 것은 차등과 배제에서 벗어나 다양성과 조화의 세계로 들어서는 것이다.
폭염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지만 낼모레면 입추다. 걷기 좋은 사색의 계절이다. 무돌길은 혼자 걸어도 좋지만, 무돌길협의회가 봄가을에 주최하는 무돌길대학에 참여하면 길벗들과 함께 해설을 들으며 완주할 수 있다. 무돌길의 ‘국가 숲길’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주변 지자체들도 생태 환경과 안내 표지판, 탐방로 정비에 더 큰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마을에서 마을로…호남 문화 소통길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모델로 지난 2007년 제주에 올레길이 탄생한 이후 국내 곳곳에 걷기 좋은 길이 조성됐다. 해파랑길·남파랑길·서해랑길로 구성된 ‘코리아 둘레길’은 길이가 4500㎞에 달한다. 광주에도 무등산 자락을 따라 한 바퀴 빙 도는 무돌길(60㎞)과 옛사람들이 도심에서 무등산 정상에 오르던 길을 복원한 무등산 옛길(23.2㎞), 도심 외곽을 연결한 빛고을 산들길(81.5㎞) 등이 잇따라 조성됐다. 그중에서도 무돌길은 산티아고 순례길이나 올레길 못지않은 반산반야(半山半野)의 명품 길이다.
무돌길은 단순히 무등산 둘레를 따라 길을 만든 것이 아니라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이 봇짐을 메고, 지게를 지고, 자손들 손을 잡고 걸었던 길을 복원해 연결한 것이다. 30여 개 마을과 마을, 계곡과 숲정이를 이어 주는 생활문화 소통의 길이다.
무돌길이 처음 열린 것은 지난 2010년. 증심계곡과 원효계곡 쪽으로 집중되던 탐방객들을 분산시키고, 정상만을 향한 수직적 등산이 아니라 수평적 탐방을 즐길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자연공원을 확대해 보자는 게 그 취지였다. 무등산 보호 운동에 헌신해 온 김인주 (사)무등산무돌길협의회 상임의장과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1910년대 제작된 지도를 토대로 길을 개척했다. 무돌길이라는 이름은 백제시대 쓰였던 무등산의 맨 처음 명칭 ‘무돌뫼’에서 따온 것이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광주 북구 각화마을에서 출발해 담양과 화순, 광주 동구를 거쳐 광주역까지 수백 년 역사를 간직한 길들을 연결할 수 있었다. 의병운동과 동학농민운동, 학생독립운동의 자양분이 되었던 무등 정신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자는 의미에서 애초 길이는 51.8㎞로 정했다. 여기에 2017년에는 광주역에서 전남대를 관통하는 ‘민주의 길’과 북구 ‘천지인길’을 거쳐 각화마을까지 8㎞를 추가해 무등산 자락 한 바퀴를 완전히 돌아 볼 수 있는 환상(環狀)형 길이 완성됐다.
무돌길은 크게 16개 구간으로 나뉘며 남녀노소 누구나 사부자기 걸을 수 있다. 1길은 각화마을부터 시작하지만 경사도와 접근성을 고려하면 광주역(15길)에서 푸른길 공원과 대추여울(광주천)을 따라 역순으로 도는 것이 수월하다. 무돌길은 호남정맥을 기준으로 광주 북구·담양 쪽의 영산강 수계와 화순 쪽 섬진강 수계로 구분되는데, 북구·담양 쪽에서 오르는 길의 경사가 약간 더 가파르기 때문이다. 표고 차는 해발 200~400m가량.
그곳에는 인문의 향기와 역사의 숨결이 그윽하다. 무등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곡인 원효계곡 줄기를 따라 자리한 소쇄원·식영정·환벽당은 면앙정 송순을 비롯해 사촌 김윤재, 석천 임억령, 소쇄옹 양산보 등 호남 유림들이 교류하며 시를 짓던 시가문학과 계산풍류(溪山風流)의 산실이다. 방랑시인 김삿갓의 자취도 산재해 있다. 충효동 도요지와 복조리 마을, 동네 어귀마다 자리한 정자와 샘터에는 전통문화와 공동체 의식이 살아 숨 쉰다.
무돌길은 또한 나라가 위태로울 때 분연히 일어섰던 호남 의병의 활동 무대이다. 김덕령 장군을 기리는 충장사와 김태원 장군 전적비, 의병들이 넘어 다녔던 백남정재 등에 그들의 충혼의백이 서려 있다. 시대정신과 대의를 지키려는 자기희생의 저항 정신은 면면히 이어져 5·18민주화운동으로 타올랐다. 그 주 무대 역시 무돌길을 따라 이어진다. 무돌길을 ‘지구촌 민주화운동의 성지 순례길’로 조성하자는 취지로 지난 6월 전국에서 2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회 전국 무돌길완주대회’가 열린 배경이다.
차별과 배제 없는 조화의 세계로
무돌길 걷기의 백미는 무등산 조망이다. 산자락을 따라 동서남북 한 바퀴를 도는 내내 변화무쌍하게 형상을 달리하며 길잡이이자 푯대가 되어 준다. 부드러운 육산(肉山) 곳곳에 파격으로 얹혀 있는 주상절리, 서석·입석·광석대와 너널들은 신비감을 더한다.
무등(無等)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등급이나 차별이 없음이요, 다른 하나는 그 이상 더할 수 없는 정도를 가리킨다. 평등을 넘어선 무등의 세계, 비할 데 없는 경지다. 정상 삼봉에 천왕·지왕·인왕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도 천지인삼재(天地人三才)가 하나이고 ‘사람이 곧 하늘’(人乃天)이라는 인간 존중의 발로였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무돌길을 걷는 것은 차등과 배제에서 벗어나 다양성과 조화의 세계로 들어서는 것이다.
폭염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지만 낼모레면 입추다. 걷기 좋은 사색의 계절이다. 무돌길은 혼자 걸어도 좋지만, 무돌길협의회가 봄가을에 주최하는 무돌길대학에 참여하면 길벗들과 함께 해설을 들으며 완주할 수 있다. 무돌길의 ‘국가 숲길’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주변 지자체들도 생태 환경과 안내 표지판, 탐방로 정비에 더 큰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