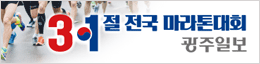‘지방’ 없는 지방선거 이제는 끝내야-논설실장·이사
 |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막을 내리고 선택의 날이 밝았다. 지난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여덟 번째 치러지는 ‘풀뿌리 민주주의 축제’다. 올해는 특히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자치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주민이 직접 의회에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게 됐고, 감사 청구 요건도 크게 완화됐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도 신설됐다.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지역 살림을 책임지고 현안을 해결하며 발전을 이끌어 갈 일꾼들을 뽑는 지방선거는 여전히 중앙 정치의 그늘에 갇혀 있다. 중앙 집권형 국가인 우리나라의 지방 정치는 오랫동안 중앙 정치의 종속 변수로 여겨져 온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번 지방선거는 과거에 비해 그 정도가 훨씬 심해 ‘지방’이 보이지 않는다는 한탄이 쏟아진다.
거대 양당 독과점 ‘민심 위에 당심’
지방선거에서 지역이 실종된 요인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와 같은 해에 치러지는 점이 우선 꼽힌다. 그것도 역대 최소 격차(0.73%포인트)로 승부가 갈린 ‘비호감 네거티브’ 대선의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시점에. 대선이 끝난 지 85일, 윤석열 정부 출범 22일 만이다. 여기에 대선 주자급 인사들이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선수로 뛰어들어 ‘대선 연장전’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이렇다 보니 5년만의 정권 교체로 공수가 바뀐 여야는 총력전을 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승리가 진정한 대선 승리라며 ‘국정 안정론’과 ‘무한 책임론’을 내세운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견제를 위한 ‘국정 균형론’으로 대선 패배의 설욕을 벼르고 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새 정부 내각 인사청문회 등 중앙 정치 이슈가 선거전을 잠식하면서 자치 분권 확대나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어젠다는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지역 실종의 근원적인 배경에는 적대적 공생을 이어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거대 양당의 독과점 구도가 자리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그 해악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는 영호남의 무투표 당선자 숫자다. 전국적으로 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 선거구 321곳에서 509명이 선거운동도 없이 사실상 당선됐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영호남에서 나왔다. 모두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이다.
광주·전남의 경우 70명으로 지난 2018년에 비해 네 배 가까이 늘어 역대 최대 규모다. 전체 선출 인원(431명) 여섯 명 중 한 명(16.2%)꼴이다. 기초단체장도 세 명이나 되고 지역구 시도의원은 절반 이상이 투표 없이 당선됐다. 민주당 지지세가 워낙 강하다 보니 다른 정당들이 후보조차 내지 못해 빚어진 현상이다. 당락이 사실상 정당 공천 과정에서 당원들에 의해 결정되어 유권자들은 투표할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곧바로 당선이니 선출직이 아니라 거대 정당이 지명하는 임명직이나 다름없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는 형식적 절차로 전락하고, 후보자들은 유권자보다 공천권자의 눈치를 보기 마련이다. ‘민심 위에 당심’이 있는 셈이다.
더욱이 후보를 선정하는 공천 과정마저 투명하지 못했다. 민주당 전남도당의 경우 다섯 명의 국회의원이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으로 공천 심사에 참여했고 나머지 다섯 명은 자신들이 추천한 인사를 참가시켰다. 이 때문에 2년 뒤 치러질 총선을 의식해 ‘짬짜미 공천’에 나선 게 아니냐는 시선이 따가웠다. 경선 및 공천 심사 기준이 오락가락하는가 하면 내천(內薦), 줄 세우기, 금품 거래설 등 의혹들이 잇따라 터져 나왔다. 일부 후보들은 범죄 전과와 징계 이력에도 공천을 받았다. 이런 난맥상은 탈락한 후보들이 대거 무소속 출마에 나서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유권자들은 거대 정당이 내세운 후보를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선에 이은 ‘비호감 지방선거’로 “찍을 사람이 없다”는 개탄이 나오는 이유다.
다당제 선거 개혁·지역 정당 허용을
당심이 민심보다 우위에 서게 되는 현실에는 일당 지배와 양당 나눠 먹기를 가능하게 하는 선거제도가 있다. 특히 지방자치 일꾼을 뽑는 선거에 정당 공천이 허용돼 거대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후보 공천에 일일이 개입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거대 양당은 기초단체장 당선자의 90.3%, 광역의원 95.7%, 기초의원은 90.5%를 차지했다. 양당의 독과점으로 지방자치는 형식만 남고 가치와 다양성을 상실한 채 형해화(形骸化)되고 있다.
비정상의 지방선거를 정상화하려면 게임의 규칙, 즉 선거제도부터 바꿔야 한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 전 당론으로 약속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공감했던 중·대선거구제를 서둘러 도입하고, 각 정당이 지지율만큼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것이 우선 과제다.
또한 ‘지역 정당’을 허용해 주민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야 한다. 현행 정당법은 중앙당을 수도에 두고 다섯 개 이상의 시도당을 설치해야 정당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정당은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당 설립 요건을 완화해 지방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치 집단의 참여를 늘려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 체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정당 공천제의 폐지를 적극 논의해야 한다. 책임 정치와 소수자 참여 증진이라는 당초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지방 정치의 중앙 예속, 지역 분할 구도 고착화, 혼탁 선거 등 폐단만 낳고 있기 때문이다. 정당 공천 폐지는 지방자치를 더 이상 국회의원들이 쥐락펴락하지 말고 주민들에게 돌려 달라는 요구다. 최소한 주민과 가장 밀착되어 생활정치를 펴야 할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만큼은 정당 추천을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
이들 대안을 통해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야 말로 주권자인 주민들이 거대 양당의 ‘정치적 볼모’에서 벗어나 자치의 주체로 우뚝 서는 길이다.
거대 양당 독과점 ‘민심 위에 당심’
이렇다 보니 5년만의 정권 교체로 공수가 바뀐 여야는 총력전을 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승리가 진정한 대선 승리라며 ‘국정 안정론’과 ‘무한 책임론’을 내세운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견제를 위한 ‘국정 균형론’으로 대선 패배의 설욕을 벼르고 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새 정부 내각 인사청문회 등 중앙 정치 이슈가 선거전을 잠식하면서 자치 분권 확대나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어젠다는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지역 실종의 근원적인 배경에는 적대적 공생을 이어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거대 양당의 독과점 구도가 자리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그 해악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는 영호남의 무투표 당선자 숫자다. 전국적으로 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 선거구 321곳에서 509명이 선거운동도 없이 사실상 당선됐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영호남에서 나왔다. 모두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이다.
광주·전남의 경우 70명으로 지난 2018년에 비해 네 배 가까이 늘어 역대 최대 규모다. 전체 선출 인원(431명) 여섯 명 중 한 명(16.2%)꼴이다. 기초단체장도 세 명이나 되고 지역구 시도의원은 절반 이상이 투표 없이 당선됐다. 민주당 지지세가 워낙 강하다 보니 다른 정당들이 후보조차 내지 못해 빚어진 현상이다. 당락이 사실상 정당 공천 과정에서 당원들에 의해 결정되어 유권자들은 투표할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곧바로 당선이니 선출직이 아니라 거대 정당이 지명하는 임명직이나 다름없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는 형식적 절차로 전락하고, 후보자들은 유권자보다 공천권자의 눈치를 보기 마련이다. ‘민심 위에 당심’이 있는 셈이다.
더욱이 후보를 선정하는 공천 과정마저 투명하지 못했다. 민주당 전남도당의 경우 다섯 명의 국회의원이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으로 공천 심사에 참여했고 나머지 다섯 명은 자신들이 추천한 인사를 참가시켰다. 이 때문에 2년 뒤 치러질 총선을 의식해 ‘짬짜미 공천’에 나선 게 아니냐는 시선이 따가웠다. 경선 및 공천 심사 기준이 오락가락하는가 하면 내천(內薦), 줄 세우기, 금품 거래설 등 의혹들이 잇따라 터져 나왔다. 일부 후보들은 범죄 전과와 징계 이력에도 공천을 받았다. 이런 난맥상은 탈락한 후보들이 대거 무소속 출마에 나서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유권자들은 거대 정당이 내세운 후보를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선에 이은 ‘비호감 지방선거’로 “찍을 사람이 없다”는 개탄이 나오는 이유다.
다당제 선거 개혁·지역 정당 허용을
당심이 민심보다 우위에 서게 되는 현실에는 일당 지배와 양당 나눠 먹기를 가능하게 하는 선거제도가 있다. 특히 지방자치 일꾼을 뽑는 선거에 정당 공천이 허용돼 거대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후보 공천에 일일이 개입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거대 양당은 기초단체장 당선자의 90.3%, 광역의원 95.7%, 기초의원은 90.5%를 차지했다. 양당의 독과점으로 지방자치는 형식만 남고 가치와 다양성을 상실한 채 형해화(形骸化)되고 있다.
비정상의 지방선거를 정상화하려면 게임의 규칙, 즉 선거제도부터 바꿔야 한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 전 당론으로 약속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공감했던 중·대선거구제를 서둘러 도입하고, 각 정당이 지지율만큼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것이 우선 과제다.
또한 ‘지역 정당’을 허용해 주민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야 한다. 현행 정당법은 중앙당을 수도에 두고 다섯 개 이상의 시도당을 설치해야 정당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정당은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당 설립 요건을 완화해 지방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치 집단의 참여를 늘려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 체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정당 공천제의 폐지를 적극 논의해야 한다. 책임 정치와 소수자 참여 증진이라는 당초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지방 정치의 중앙 예속, 지역 분할 구도 고착화, 혼탁 선거 등 폐단만 낳고 있기 때문이다. 정당 공천 폐지는 지방자치를 더 이상 국회의원들이 쥐락펴락하지 말고 주민들에게 돌려 달라는 요구다. 최소한 주민과 가장 밀착되어 생활정치를 펴야 할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만큼은 정당 추천을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
이들 대안을 통해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야 말로 주권자인 주민들이 거대 양당의 ‘정치적 볼모’에서 벗어나 자치의 주체로 우뚝 서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