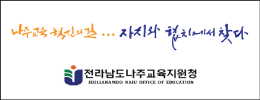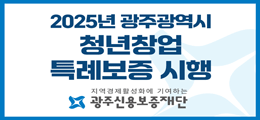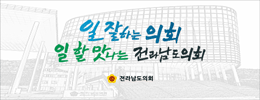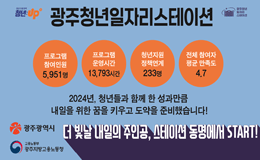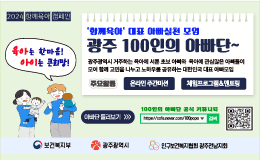[이덕일의 ‘역사의 창’] 진영론과 탕평론
 |
우리 사회는 정치와 관련된 사안이 발생하면 그 사안의 성격이 무엇이든지 간에 양 극단으로 갈린다. 진영(陣營)이란 표현까지 쓰는데 진영이란 군대가 진을 친 곳을 뜻하는 군사용어다.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을 적으로 본다는 뜻이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짐작할 수 있다.
진영론에 빠진 사람들은 두 개의 자를 가지고 사안을 본다. 반대 측 진영의 사람은 밀리미터(㎜)의 자를 들이대 없는 죄도 찾아내지만, 자기 진영의 사람은 미터(m)의 자로 재어 면죄부를 준다.
물론 사람들이 모여 정치적 견해를 피력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니다. 나쁘기는커녕 이런 관심이 현대 정치의 핵심인 정당정치의 기본이 된다. 그러나 그 판단 기준이 대한민국이란 사회 공동체 전체의 이익이어야지, 지지하는 정파의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옛날 선현들의 말대로 왕도(王道)를 추구해야 한다는 말이다.
‘서경’(書經) 홍범(洪範)장의 ‘황극’(皇極)조에 “치우침이 없고 당이 없으니 왕도는 탕탕하며, 당이 없고 치우침이 없으니 왕도는 평평하다(無偏無黨, 王道蕩蕩. 無黨無偏, 王道平平)”라는 구절이 있다. 왕도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편애하는 당(黨)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당은 현대적 의미의 ‘당’이 아니라 ‘무리’라는 뜻이다. 이 구절에서 탕평(蕩平)이란 말이 나왔다. 탕(蕩)이란 치우친 것을 쓸어버린다는 뜻이고, 평(平)은 바르게 다스린다는 뜻이다.
조선에서 탕평책을 추구했던 임금들은 숙종·영조·정조 등이 있는데, 정조를 제외하고는 모두 실패했다. 숙종이나 영조는 구호로는 탕평을 내세웠지만 국왕 자신들이 특정 정파를 편드는 편당심(偏黨心)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정조는 자신의 아버지 사도세자를 죽인 노론 벽파도 정치의 상대로 삼는 탕평책을 펼쳐 나갔지만, 결국 노론 벽파에 의해 독살당했다는 의문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 이후 조선은 멸망의 길로 접어들었다.
원래 왕조국가는 당을 만드는 것을 엄금했다. 전국시대(戰國時代·서기전 475~222)의 일을 기록한 ‘전국책’(戰國策)에는 각국을 다니며 유세했던 소진(蘇秦)이 조(趙)나라 숙후(肅侯)에게 유세한 일이 기록되어 있다. 소진은 “신이 듣기에 현명한 군주는 의심을 끊고 참소를 제거하며, 떠도는 말의 자취를 가리고, 붕당(朋黨)의 문을 막는다고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당시에는 붕당 자체를 나라를 좀먹는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사대부 계급이 집단으로 형성된 북송(北宋) 때부터는 사대부들이 당(黨)을 결성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없었다. 대신 당에 대한 성격 논쟁이 활발해졌는데 그중 하나가 구양수(歐陽修)의 ‘붕당론’(朋黨論)이다. 구양수는 “군자(君子)는 군자와 더불어 도(道)를 행하지만 소인은 소인과 더불어 이익을 추구한다”면서 대의를 추구하는 군자들의 당을 진붕(眞朋), 사익을 추구하는 소인들의 당을 위붕(僞朋)으로 구분했다. 위붕은 군주가 멀리해야 하지만 진붕은 가까이 지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자신들의 당은 진붕(眞朋)이고, 상대당은 위붕(僞朋)이라고 주장하기 마련이었다.
조선 후기 당쟁이 격화되던 시대를 살았던 ‘택리지’(擇里志)의 저자 이중환(李重煥)은 소론이었는데, 영조 즉위 후 정권을 잡은 노론에 의해 사형 위기까지 몰렸다가 겨우 목숨을 건졌다. 그 후 이중환은 정치를 멀리한 채 전국을 다니면서 살 만한 곳을 찾았고 ‘택리지’를 썼다. 이 책에서 이중환은 “하늘에 가득 찬 죄를 지은 사람도 다른 당파의 탄핵을 받으면 시비곡직(是非曲直)을 따지지 않고 떼거리로 일어나 변호하고, 큰 덕을 쌓은 사람도 자기 당파가 아니면 먼저 그 사람에게 나쁜 점이 있는지 살핀다”고 비판했다. 마치 진영론에 빠진 지금의 우리 사회를 말하는 듯하다.
그는 “무릇 사대부가 사는 곳 치고 인심이 무너져 내리지 않은 곳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역시 “진영론에 빠진 사람들이 사는 곳 치고 인심이 무너져 내리지 않은 곳이 없다”고 바꾸어도 이상할 것이 없다. 국민 각자가 왕이라는 생각으로 탕평의 마음을 가져야 할 때다.
<신한대 대학원 교수>
진영론에 빠진 사람들은 두 개의 자를 가지고 사안을 본다. 반대 측 진영의 사람은 밀리미터(㎜)의 자를 들이대 없는 죄도 찾아내지만, 자기 진영의 사람은 미터(m)의 자로 재어 면죄부를 준다.
‘서경’(書經) 홍범(洪範)장의 ‘황극’(皇極)조에 “치우침이 없고 당이 없으니 왕도는 탕탕하며, 당이 없고 치우침이 없으니 왕도는 평평하다(無偏無黨, 王道蕩蕩. 無黨無偏, 王道平平)”라는 구절이 있다. 왕도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편애하는 당(黨)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당은 현대적 의미의 ‘당’이 아니라 ‘무리’라는 뜻이다. 이 구절에서 탕평(蕩平)이란 말이 나왔다. 탕(蕩)이란 치우친 것을 쓸어버린다는 뜻이고, 평(平)은 바르게 다스린다는 뜻이다.
원래 왕조국가는 당을 만드는 것을 엄금했다. 전국시대(戰國時代·서기전 475~222)의 일을 기록한 ‘전국책’(戰國策)에는 각국을 다니며 유세했던 소진(蘇秦)이 조(趙)나라 숙후(肅侯)에게 유세한 일이 기록되어 있다. 소진은 “신이 듣기에 현명한 군주는 의심을 끊고 참소를 제거하며, 떠도는 말의 자취를 가리고, 붕당(朋黨)의 문을 막는다고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당시에는 붕당 자체를 나라를 좀먹는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사대부 계급이 집단으로 형성된 북송(北宋) 때부터는 사대부들이 당(黨)을 결성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없었다. 대신 당에 대한 성격 논쟁이 활발해졌는데 그중 하나가 구양수(歐陽修)의 ‘붕당론’(朋黨論)이다. 구양수는 “군자(君子)는 군자와 더불어 도(道)를 행하지만 소인은 소인과 더불어 이익을 추구한다”면서 대의를 추구하는 군자들의 당을 진붕(眞朋), 사익을 추구하는 소인들의 당을 위붕(僞朋)으로 구분했다. 위붕은 군주가 멀리해야 하지만 진붕은 가까이 지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자신들의 당은 진붕(眞朋)이고, 상대당은 위붕(僞朋)이라고 주장하기 마련이었다.
조선 후기 당쟁이 격화되던 시대를 살았던 ‘택리지’(擇里志)의 저자 이중환(李重煥)은 소론이었는데, 영조 즉위 후 정권을 잡은 노론에 의해 사형 위기까지 몰렸다가 겨우 목숨을 건졌다. 그 후 이중환은 정치를 멀리한 채 전국을 다니면서 살 만한 곳을 찾았고 ‘택리지’를 썼다. 이 책에서 이중환은 “하늘에 가득 찬 죄를 지은 사람도 다른 당파의 탄핵을 받으면 시비곡직(是非曲直)을 따지지 않고 떼거리로 일어나 변호하고, 큰 덕을 쌓은 사람도 자기 당파가 아니면 먼저 그 사람에게 나쁜 점이 있는지 살핀다”고 비판했다. 마치 진영론에 빠진 지금의 우리 사회를 말하는 듯하다.
그는 “무릇 사대부가 사는 곳 치고 인심이 무너져 내리지 않은 곳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역시 “진영론에 빠진 사람들이 사는 곳 치고 인심이 무너져 내리지 않은 곳이 없다”고 바꾸어도 이상할 것이 없다. 국민 각자가 왕이라는 생각으로 탕평의 마음을 가져야 할 때다.
<신한대 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