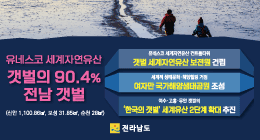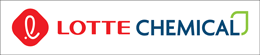골칫거리 ‘해양쓰레기’, ‘지속가능한’ 관리 체계 구축 시급
전남바다에서 연간 6만 t의 해양쓰레기가 발생, 생태계 파괴와 수산자원 피해, 어업 생산성 저감, 선박사고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지역 특화형 관리체계 확립, 자원 순환 모델 마련, 해양쓰레기 방제와 수거를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고도화 등 ‘지속가능한’ 해양쓰레기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전남연구원이 10일 발표한 ‘해양쓰레기 관리 효율화를 위한 전남의 정책 방향’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전남의 해양쓰레기 연간 유입량은 5만 8173t(2022년 기준)에 달한다. 이 중 절반 이상(55%)이 어업·양식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상기인 쓰레기’였으며, 특히 양식장에서 버려지는 폐스티로폼 부표나 폐어구 등이 전체의 32.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 더 심각하게 쌓여있다는 점이다. 현재 전남 해역에 존재하는 쓰레기(현존량) 8만 9298t 중 72.1%는 바닷속에 가라앉은 ‘침적쓰레기’이며, 이 중 62.5%가 양식장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렇게 방치된 쓰레기는 해양생태계 파괴는 물론, 어업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인명·재산 피해로 직결되고 있다. 실제로 2022년 기준 전남해역에서 발생한 부유물 감김 선박사고는 115건으로, 전국(339건)의 33.9%를 차지할 만큼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연구원은 이처럼 심각한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관리 체계의 한계를 꼽았다. 발생원에 대한 통계가 부족하고 시·군별 관리 기준이 달라 사각지대가 발생하며, 수거하더라도 전용 처리 시설이나 임시 적치 공간이 부족해 방치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연구원은 먼저 지역 특화형 관리체계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시·군별로 제각각인 신고·수거·처리 절차를 통일해 도 차원의 조례를 정비하고, 어구·양식 품목별로 분류 체계를 세분화해 수거부터 보상까지 일원화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양쓰레기를 ‘골칫거리’가 아닌 ‘자원’으로 인식하는 정책의 대전환을 주문했다. 드론과 고해상도 위성영상,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기반으로 쓰레기 발생 위치, 종류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폐어구·패각·괭생이모자반 등 다양한 부산물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순환 모델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업인 등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해양쓰레기 수거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청소년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재활용 인식을 높이며, 민간기업과 연구기관이 협력하는 업사이클 기업을 유치·지원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은옥 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전남의 해양쓰레기 문제는 양식업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과 맞물려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지자체 간 대응 일관성을 확보하고, 첨단 기술을 접목한 과학적 관리와 민관 협력을 통해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과 자원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혁신 전략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 더 심각하게 쌓여있다는 점이다. 현재 전남 해역에 존재하는 쓰레기(현존량) 8만 9298t 중 72.1%는 바닷속에 가라앉은 ‘침적쓰레기’이며, 이 중 62.5%가 양식장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렇게 방치된 쓰레기는 해양생태계 파괴는 물론, 어업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인명·재산 피해로 직결되고 있다. 실제로 2022년 기준 전남해역에서 발생한 부유물 감김 선박사고는 115건으로, 전국(339건)의 33.9%를 차지할 만큼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연구원은 먼저 지역 특화형 관리체계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시·군별로 제각각인 신고·수거·처리 절차를 통일해 도 차원의 조례를 정비하고, 어구·양식 품목별로 분류 체계를 세분화해 수거부터 보상까지 일원화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양쓰레기를 ‘골칫거리’가 아닌 ‘자원’으로 인식하는 정책의 대전환을 주문했다. 드론과 고해상도 위성영상,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기반으로 쓰레기 발생 위치, 종류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폐어구·패각·괭생이모자반 등 다양한 부산물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순환 모델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업인 등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해양쓰레기 수거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청소년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재활용 인식을 높이며, 민간기업과 연구기관이 협력하는 업사이클 기업을 유치·지원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은옥 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전남의 해양쓰레기 문제는 양식업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과 맞물려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지자체 간 대응 일관성을 확보하고, 첨단 기술을 접목한 과학적 관리와 민관 협력을 통해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과 자원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혁신 전략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