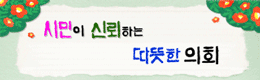“짓는 이의 ‘고민’ 잘 드러나야 좋은 건축이죠”
문체부 ‘젊은 건축가상’ 수상 김선형 전남대 여수캠퍼스 교수
건물 외형부터 재료 선택·동선 계획 등 과정 담아야
목조 등 친환경 재료 사용해 환경에 도움 주고 싶어
건물 외형부터 재료 선택·동선 계획 등 과정 담아야
목조 등 친환경 재료 사용해 환경에 도움 주고 싶어
 |
르네상스 시대 건축이 비슷한 형태에 머물렀다면 오늘날 건축은 무수한 선택지 위에 서 있다. 형태와 공간 구성, 재료 등 다양한 선택의 기로 속 건축가들은 어떤 고민을 할까.
지난 3일 문화체육관광부 ‘2025년 젊은 건축가상’을 수상한 김선형(42·사진) 전남대 여수캠퍼스 건축디자인학과 교수는 건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건물의 외형, 구조재, 친환경 재료 선택, 동선 계획 등 선택의 기로마다 ‘고민의 흔적이 드러나는’ 건축을 해야 한다고 그는 부연했다.
김 교수가 받은 젊은 건축가상은 건축에 대한 기본 소양 및 태도, 맥락에 대한 진지한 탐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작품이 아닌 건축가의 일관성, 주제의식을 주로 다룬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미시간대 건축대학원에 장학생으로 입학한 그는 졸업 후 미국아키타이저 건축상을 수상하고 2023년에는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대상, 한국건축가협회상을 받은 실력자다.
그의 건축 인생은 건축가였던 아버지로부터 시작됐다. 아버지가 직접 설계한 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서재에 꽂힌 건축 서적을 읽고, 아버지의 일에 대한 열정을 바라보며 자연스레 꿈을 키웠다. 그의 동생 역시 건축가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그는 광주와 연고는 없지만 광주가 친정인 아내를 따라 내려와 지금은 여수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다.
그는 “요즘은 툴도 다양하고 기술도 좋아져서 예쁘고 화려한 건축 이미지가 많아졌지만 점점 사람들이 외관만 바라보고, 만드는 과정에는 집중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과정에 대한 고민이 잘 드러나야 좋은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건축은 일종의 ‘형식’이고 ‘틀’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영화는 감독이 설명하지 않아도 감독의 의도와 감동 포인트, 메시지 등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처럼 건축가가 설계한 ‘형식’ 안에 들어온 이들이 자연스레 좋은 느낌을 받고 건축가의 의도를 제대로 읽어낼 수 있다면 좋은 건축물입니다. 예를 들면 ‘이 공간에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떤 감정을 느꼈으면 좋겠다’와 같은 건축가의 세심한 의도를 알아채는 것 말이죠.”
교수로서 건축학도들에게는 ‘작가관 형성’을 강조한다. 건축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고가고 클라이언트의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에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타협하지 않는 자기만의 고집, 신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젊은 건축가상 심사평에서 ‘목조 건축 구법을 섬세하고 치밀하게 완성’ 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그의 목조 건축에 대한 관심은 환경 보호에 대한 책무에서 시작한다.
목조 건축은 건식과 습식(콘크리트)으로 나뉜다. 우리나라 목조 건축은 습식이 대부분이지만 김 교수는 보다 친환경적인 건식을 선호한다.
그는 “최근 광주가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것처럼 기후위기는 오늘날 실감할 수 있는 공포로 한발짝 다가왔다”며 “건축 과정에서 최대한 환경에 피해를 입히지 않는 목조 등 친환경 재료를 사용해 조금이라도 환경에 도움이 되는 건축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지난 3일 문화체육관광부 ‘2025년 젊은 건축가상’을 수상한 김선형(42·사진) 전남대 여수캠퍼스 건축디자인학과 교수는 건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가 받은 젊은 건축가상은 건축에 대한 기본 소양 및 태도, 맥락에 대한 진지한 탐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작품이 아닌 건축가의 일관성, 주제의식을 주로 다룬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미시간대 건축대학원에 장학생으로 입학한 그는 졸업 후 미국아키타이저 건축상을 수상하고 2023년에는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대상, 한국건축가협회상을 받은 실력자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그는 광주와 연고는 없지만 광주가 친정인 아내를 따라 내려와 지금은 여수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다.
그는 “요즘은 툴도 다양하고 기술도 좋아져서 예쁘고 화려한 건축 이미지가 많아졌지만 점점 사람들이 외관만 바라보고, 만드는 과정에는 집중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과정에 대한 고민이 잘 드러나야 좋은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건축은 일종의 ‘형식’이고 ‘틀’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영화는 감독이 설명하지 않아도 감독의 의도와 감동 포인트, 메시지 등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처럼 건축가가 설계한 ‘형식’ 안에 들어온 이들이 자연스레 좋은 느낌을 받고 건축가의 의도를 제대로 읽어낼 수 있다면 좋은 건축물입니다. 예를 들면 ‘이 공간에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떤 감정을 느꼈으면 좋겠다’와 같은 건축가의 세심한 의도를 알아채는 것 말이죠.”
교수로서 건축학도들에게는 ‘작가관 형성’을 강조한다. 건축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고가고 클라이언트의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에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타협하지 않는 자기만의 고집, 신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젊은 건축가상 심사평에서 ‘목조 건축 구법을 섬세하고 치밀하게 완성’ 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그의 목조 건축에 대한 관심은 환경 보호에 대한 책무에서 시작한다.
목조 건축은 건식과 습식(콘크리트)으로 나뉜다. 우리나라 목조 건축은 습식이 대부분이지만 김 교수는 보다 친환경적인 건식을 선호한다.
그는 “최근 광주가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것처럼 기후위기는 오늘날 실감할 수 있는 공포로 한발짝 다가왔다”며 “건축 과정에서 최대한 환경에 피해를 입히지 않는 목조 등 친환경 재료를 사용해 조금이라도 환경에 도움이 되는 건축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