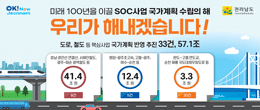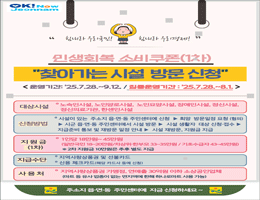낡은 교육과정 뜯어 고쳐야 청년 일자리 나온다 - 문승태 순천대 대외협력 부총장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구직을 포기한 청년 중 41.3%가 대졸자다. 2024년에 취업을 포기하고 ‘쉬었음’이라고 답한 청년 42만1000명 중 대졸 이상 청년이 17만400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채용이 중단됐던 코로나 때(41.1%)보다 높은 수치다. 이러한 청년의 취업포기 증가는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 청년 취업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와 지방소멸 문제의 중심에 서있기 때문이다. 최근 6년 동안 한국 청년(만 15∼29세) 91만명이 줄어들었음을 감안한다면 청년 구직 포기 43%라는 수치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중 기업의 경력직 채용공고 비율은 82.0%에 달했다. 신입과 경력 직원을 모두 뽑겠다는 채용 공고는 15.4%, 신입 직원만 뽑겠다는 공고는 2.6%에 불과했다. 기업은 당장 현장에 투입이 가능한 인재를 원하고 있지만 현실은 기업의 주문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양질의 일자리 감소도 청년 취업률 감소 원인으로 작용했다. 300인 이상 대형 사업체 일자리는 2022년 18만2000명에서 2023년 9만명, 2024년 5만8000명으로 감소했다. 경제인연합회는 5년 동안 ‘쉬었음’ 청년으로 생긴 경제적 비용이 44조5000억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청년 퇴사율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대목이다. 잡코리아 조사 결과 청년 퇴사율은 2019년 12.5%에서 2023년 22.5%로 급등했다. 입사 후 3개월 이내 퇴사율은 무려 56.4%에 달했다. 퇴사 사유로는 업무 기대와 현실의 차이(45.7%), 직무 적성 불일치(41.4%)가 가장 컸다. 이쯤이면 청년 취업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감이 잡힌다.
20대~30대의 특징과 그들이 처한 현실을 이해해야 한다. 취업을 바라보는 심리적 배경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 이들은 과거 세대보다 자아실현 욕구가 훨씬 강하다. 일(직업)을 단순히 생계수단을 넘어 자기실현의 도구로 인식한다. 미국 심리학자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에 따르면 현대의 청년계층은 안전욕구보다 자아실현 욕구를 더 강하게 추구한다. 자기표현이나 성취감을 우선으로 둔다는 것이다. 청년 세대들은 퇴사와 이직을 ‘피로 사회’에서 살아남는 생존 방식으로 선택하기도 한다.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은 ‘창업-취업 장벽 낮출 때’라며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담지 못했다. 역대 정부는 청년 취업률을 높이겠다며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실효성을 높이지 못했다. 오히려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대졸 실업자는 증가했다. 양질의 직업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외쳤지만 대부분 이벤트에 그쳤다. 정부가 외친 ‘맞춤형 인재양성’은 현장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했고 사회문제로 번졌다.
사회 양극화는 청년 취업률을 결정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다. 지난해 상·하위 10%의 소득 격차는 2억원을 넘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생 적성과 재능을 살린 충분한 현장경험과 실습,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과정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 교육과정도 기업이 원하는 인재 양성과는 거리가 멀다. 케케묵은 교육과정과 낡은 실험장비, 부족한 현장경험, 사회와 고립된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청년들의 삶을 설계하고 안내하는 교육으로 혁신 방향을 잡아야 하는 이유다.
가장 시급한 대안은 정부와 지자체, 대학, 기업이 손잡고 융합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입시구조를 개선하고 사교육비를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이 취업까지 이어지는 자아실현 교육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AI·데이터 전문가를 비롯한 로봇공학, 기후위기와 지구환경, 사이버 보안 전문가, 노인 케어 등 미래 유망직종에 맞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지역 산업과 연계한 산학협력 모델을 강화해야 취업률을 높이고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다. 전남의 경우 농생명·바이오·에너지·관광 분야를 묶어 교육과정에 담아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기업-지자체가 손을 잡아야 가능해진다. 현장에 맞는 융합정책을 통해 문제해결 능력과 창의적이고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한다. 그래야 사회가 원하는 미래형 인재양성이 가능해진다.
양질의 일자리 감소도 청년 취업률 감소 원인으로 작용했다. 300인 이상 대형 사업체 일자리는 2022년 18만2000명에서 2023년 9만명, 2024년 5만8000명으로 감소했다. 경제인연합회는 5년 동안 ‘쉬었음’ 청년으로 생긴 경제적 비용이 44조5000억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20대~30대의 특징과 그들이 처한 현실을 이해해야 한다. 취업을 바라보는 심리적 배경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 이들은 과거 세대보다 자아실현 욕구가 훨씬 강하다. 일(직업)을 단순히 생계수단을 넘어 자기실현의 도구로 인식한다. 미국 심리학자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에 따르면 현대의 청년계층은 안전욕구보다 자아실현 욕구를 더 강하게 추구한다. 자기표현이나 성취감을 우선으로 둔다는 것이다. 청년 세대들은 퇴사와 이직을 ‘피로 사회’에서 살아남는 생존 방식으로 선택하기도 한다.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은 ‘창업-취업 장벽 낮출 때’라며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담지 못했다. 역대 정부는 청년 취업률을 높이겠다며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실효성을 높이지 못했다. 오히려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대졸 실업자는 증가했다. 양질의 직업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외쳤지만 대부분 이벤트에 그쳤다. 정부가 외친 ‘맞춤형 인재양성’은 현장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했고 사회문제로 번졌다.
사회 양극화는 청년 취업률을 결정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다. 지난해 상·하위 10%의 소득 격차는 2억원을 넘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생 적성과 재능을 살린 충분한 현장경험과 실습,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과정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 교육과정도 기업이 원하는 인재 양성과는 거리가 멀다. 케케묵은 교육과정과 낡은 실험장비, 부족한 현장경험, 사회와 고립된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청년들의 삶을 설계하고 안내하는 교육으로 혁신 방향을 잡아야 하는 이유다.
가장 시급한 대안은 정부와 지자체, 대학, 기업이 손잡고 융합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입시구조를 개선하고 사교육비를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이 취업까지 이어지는 자아실현 교육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AI·데이터 전문가를 비롯한 로봇공학, 기후위기와 지구환경, 사이버 보안 전문가, 노인 케어 등 미래 유망직종에 맞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지역 산업과 연계한 산학협력 모델을 강화해야 취업률을 높이고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다. 전남의 경우 농생명·바이오·에너지·관광 분야를 묶어 교육과정에 담아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기업-지자체가 손을 잡아야 가능해진다. 현장에 맞는 융합정책을 통해 문제해결 능력과 창의적이고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한다. 그래야 사회가 원하는 미래형 인재양성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