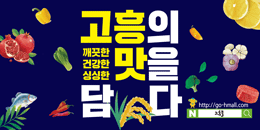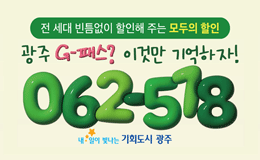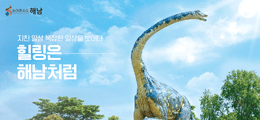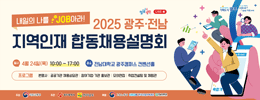숫자로만 평가되는 사회, 무엇을 잃고 있는가- 한근우 한국폴리텍대학 전남캠퍼스 전기과 교수
 |
숫자는 언제부터 인간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을까. 본래 숫자는 단순한 기록 도구였다. 고대 인류는 가축의 수를 세고 농작물의 양을 파악하기 위해 숫자를 사용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점토판, 이집트의 수학적 계산법, 인도에서 도입된 ‘0(無)’의 개념은 숫자가 문명의 발전을 이끌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숫자는 단순한 기록의 도구에서 벗어나 인간의 능력과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가 됐다. 학생들은 점수로 능력을 평가받게 되었고 직장인은 연봉과 성과지표로 가치를 판별 당한다. 그리고 한 사람의 신뢰도조차 신용점수라는 숫자로 결정되게 되었다.
숫자는 명확하고 비교하기 쉬워 사회는 점점 더 인간을 숫자로 평가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 방식은 인간의 모든 가치를 담을 수 없는 맹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대학 입시에서 학생의 학업 능력은 점수로 표현되지만 그 과정에서의 노력과 성장을 들여다 보기는 어렵다. 직장에서는 성과를 숫자로 측정하다 보면 창의적인 시도나 구성원들과 협업 같은 요소는 무시되고 단기적인 실적만을 중요하게 바라본다. 결국 사람들은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본질적인 가치를 포기하게 된다. 또한 숫자로 환원되는 사회에서는 작은 실수 하나가 개인의 삶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다. 신용점수가 한 번 낮아지면 좀 처럼 회복하기 어렵고 낮은 학점을 받은 대학생은 취업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 즉 과거의 숫자가 미래를 간섭하는 사회에서는 인간은 점점 더 숫자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다.
숫자로 평가하는 사회는 겉보기에 공정해 보인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성적이나 실적이 높으면 더 나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숫자는 때론 사회적 불평등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신용점수가 낮은 사람은 대출을 받을 때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이는 경제적 기회를 줄어들게 하고 신용점수를 높이기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비슷한 상황은 교육과 취업 시장에서도 살펴 볼 수 있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높은 성적이 필요하다. 높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사교육이 필요한데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이들은 애초에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
또 다른 문제는 숫자가 조작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부 몰지각한 기업들은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데이터를 조작한다. 일부 개인은 SNS에서 팔로워와 ‘좋아요’를 돈으로 사고파는 일을 벌이기도 한다. 숫자가 객관적이라고 믿지만 현실에서는 숫자조차도 인간의 개입에 의해 왜곡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숫자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크게 잃어가는 것은 인간적인 요소다. 창의성, 공감, 도덕성 등 같은 것들은 숫자로 측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본질적인 가치가 아닐까? 만약 모든 것이 숫자로 환산되는 사회라면 예술가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작품을 팔았는지로만 결정될 것이고, 교육의 가치는 학생들의 시험 성적으로만 평가될 것이다. 인간의 본성에 내재된 다양한 요소들은 숫자로 표현할 수 없기에 점점 더 그 중요성을 잃게 될 것이 두렵다.
숫자는 강력한 도구다. 하지만 도구는 어디까지나 도구일 뿐,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 될 수는 없다. 우리는 숫자의 편리함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만들어내는 부작용을 고민해야 한다.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면 숫자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학업 성취도는 성적뿐만 아니라 창의적 사고력과 인성 등을 포함해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직장내 성과 평가도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장기적인 기여도와 협업 능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
숫자는 세상의 이치를 설명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 그것이 곧 인간을 규정하거나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인간의 본질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인식하며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비슷한 상황은 교육과 취업 시장에서도 살펴 볼 수 있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높은 성적이 필요하다. 높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사교육이 필요한데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이들은 애초에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
또 다른 문제는 숫자가 조작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부 몰지각한 기업들은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데이터를 조작한다. 일부 개인은 SNS에서 팔로워와 ‘좋아요’를 돈으로 사고파는 일을 벌이기도 한다. 숫자가 객관적이라고 믿지만 현실에서는 숫자조차도 인간의 개입에 의해 왜곡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숫자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크게 잃어가는 것은 인간적인 요소다. 창의성, 공감, 도덕성 등 같은 것들은 숫자로 측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본질적인 가치가 아닐까? 만약 모든 것이 숫자로 환산되는 사회라면 예술가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작품을 팔았는지로만 결정될 것이고, 교육의 가치는 학생들의 시험 성적으로만 평가될 것이다. 인간의 본성에 내재된 다양한 요소들은 숫자로 표현할 수 없기에 점점 더 그 중요성을 잃게 될 것이 두렵다.
숫자는 강력한 도구다. 하지만 도구는 어디까지나 도구일 뿐,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 될 수는 없다. 우리는 숫자의 편리함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만들어내는 부작용을 고민해야 한다.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면 숫자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학업 성취도는 성적뿐만 아니라 창의적 사고력과 인성 등을 포함해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직장내 성과 평가도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장기적인 기여도와 협업 능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
숫자는 세상의 이치를 설명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 그것이 곧 인간을 규정하거나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인간의 본질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인식하며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