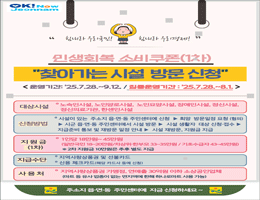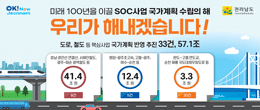헤맨 만큼 내 땅 - 박지인 조선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4년
 |
‘헤맨 만큼 내 땅’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는가? 목적지를 향하는 발자취가 전부 내 세계가 된다는 말이다. 잘못 걸어왔다고 생각하는 길이든, 어쩌다 발견한 지름길이든 상관없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말과 비슷한 맥락이다.
당장 주변만 둘러봐도 휴학을 고민하는 대학생 친구들이 많다. 나도 마찬가지다. 휴학하면 그동안 자격증을 따거나 토익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곧 강박처럼 작용해 주저하게 된다. 분명 ‘休(쉴 휴) 學(배울 학)’기간이지만 누구도 마음 놓고 ‘쉬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 무엇이든 배우고 성취해야 하는 기간처럼 여겨진다. 갈수록 취업 시장은 어두워지고 실업 급여에 관한 뉴스가 도배되고 있는 걸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면접관들은 공백기 동안 무엇을 했냐고 묻고 청년들은 ‘그냥 쉬었습니다’라고 용감하게 대답할 수 없다. 졸업 후 공백기도 마찬가지로 쉽게 용서받지 못한다. 여태 앞만 보고 달려온 만큼 안식년을 가져볼 수도 있겠지만 한시가 급한 한국 사회에서 우리에게 자유로운 공백기는 주어지지 않는다.
쉼에도 큰 용기가 필요한 세상은 우리가 마음껏 헤매기를 허락하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초·중·고를 무난히 졸업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 취업까지 막힘없길 요구한다. 그러나 각자의 삶에는 언제나 변수가 생기기 마련이지 않은가. 사회가 맞춰 놓은 길을 따라가기 바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기에 결국 개성이 없고 싱거운 사람만이 남게 된다.
우리는 남들이 정해둔 안전한 경로를 이탈하지 않으려 애쓰지만 그 길이 내가 가고 싶은 길이 맞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남들이 따는 자격증이라서 남들만큼 해야 한다는 이유로 억지로 끼워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그 고민 없이는 목적지 없이 달리고 있는 것과 같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달리는 행위에 중독이라도 된 듯 분명한 목표 없이 일단 향하는 것이다.
‘갓생’이라는 신조어가 출현했던 몇 년 전, 어쩌면 지금까지도 ‘갓생’에 담긴 사회 분위기는 변화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대학만 가면…’, ‘취업만 하면…’이라는 말로 행복을 나중으로 미루며 모든 게 좋아질 거라 믿고 오늘을 살아간다. 그 단순하고도 거창한 목표를 이룬 다음의 계획은 없다. 우리는 천천히 쉬었다 가도 된다는 위로의 말도 잘 들리지 않을 만큼 경쟁에 익숙해져 버렸고 이것이 사회라면 지나친 사회화가 되어 버린 셈이다. 우리는 대체 왜 ‘현실적’인 삶을 위해 나의 ‘현실’를 포기하고 있는 것일까. 현재는 그저 미래를 위해 이용되고 있는 시간처럼 여겨진다.
그만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현재다. 현재를 지나오며 거친 몇 번의 휴식과 실패가 내가 쌓아온 모든 것들을 부정하진 않는다는 것이다. 어쨌든 우리는 결과까지 도달하는 과정 그 자체에서 성장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처럼, 도전하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도 없다. 그 과정에서 따라오는 두려움과 절망감이 가끔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 곧 새살이 돋는 것은 확실하다. 도전하고 실패해 보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가는 과정 자체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결국 우리가 걸어온, 앞으로 걸어갈 걸음은 모두 나의 일부분이 되기에 무조건 빠른 경로가 아닌 내가 어떤 것을 경험하고 느꼈는지 집중해 보는 게 좋다. 나의 걸음을 헛되이 하지 않아야 한다. 길을 잃은 것만 같을 때 ‘헤맨 만큼 내 땅’이라는 말을 되새기며 다시금 걸어보자. 내 땅을 넓히며 걸음을 딛고 있는 지금, 발길이 이끄는 곳으로 마음껏 헤매도 보는 건 어떨까.
당장 주변만 둘러봐도 휴학을 고민하는 대학생 친구들이 많다. 나도 마찬가지다. 휴학하면 그동안 자격증을 따거나 토익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곧 강박처럼 작용해 주저하게 된다. 분명 ‘休(쉴 휴) 學(배울 학)’기간이지만 누구도 마음 놓고 ‘쉬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 무엇이든 배우고 성취해야 하는 기간처럼 여겨진다. 갈수록 취업 시장은 어두워지고 실업 급여에 관한 뉴스가 도배되고 있는 걸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면접관들은 공백기 동안 무엇을 했냐고 묻고 청년들은 ‘그냥 쉬었습니다’라고 용감하게 대답할 수 없다. 졸업 후 공백기도 마찬가지로 쉽게 용서받지 못한다. 여태 앞만 보고 달려온 만큼 안식년을 가져볼 수도 있겠지만 한시가 급한 한국 사회에서 우리에게 자유로운 공백기는 주어지지 않는다.
‘갓생’이라는 신조어가 출현했던 몇 년 전, 어쩌면 지금까지도 ‘갓생’에 담긴 사회 분위기는 변화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대학만 가면…’, ‘취업만 하면…’이라는 말로 행복을 나중으로 미루며 모든 게 좋아질 거라 믿고 오늘을 살아간다. 그 단순하고도 거창한 목표를 이룬 다음의 계획은 없다. 우리는 천천히 쉬었다 가도 된다는 위로의 말도 잘 들리지 않을 만큼 경쟁에 익숙해져 버렸고 이것이 사회라면 지나친 사회화가 되어 버린 셈이다. 우리는 대체 왜 ‘현실적’인 삶을 위해 나의 ‘현실’를 포기하고 있는 것일까. 현재는 그저 미래를 위해 이용되고 있는 시간처럼 여겨진다.
그만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현재다. 현재를 지나오며 거친 몇 번의 휴식과 실패가 내가 쌓아온 모든 것들을 부정하진 않는다는 것이다. 어쨌든 우리는 결과까지 도달하는 과정 그 자체에서 성장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처럼, 도전하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도 없다. 그 과정에서 따라오는 두려움과 절망감이 가끔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 곧 새살이 돋는 것은 확실하다. 도전하고 실패해 보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가는 과정 자체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결국 우리가 걸어온, 앞으로 걸어갈 걸음은 모두 나의 일부분이 되기에 무조건 빠른 경로가 아닌 내가 어떤 것을 경험하고 느꼈는지 집중해 보는 게 좋다. 나의 걸음을 헛되이 하지 않아야 한다. 길을 잃은 것만 같을 때 ‘헤맨 만큼 내 땅’이라는 말을 되새기며 다시금 걸어보자. 내 땅을 넓히며 걸음을 딛고 있는 지금, 발길이 이끄는 곳으로 마음껏 헤매도 보는 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