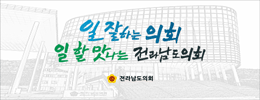BTS와 인문학-박성천 문화부장
K-컬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룹이 방탄소년단(BTS)이다. 이들은 한류의 첨병 역할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세계 대중음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2020년 1월 그래미 어워드 공식 홈페이지에 Ana Monroy Yglesias가 작성한 ‘BTS 현상’ 다섯 가지는 주목할 만하다. ‘BTS는 예상을 뛰어넘는다’, ‘우아하게 경계를 가로지른다’, ‘일곱 명의 멤버 모두가 그룹에 독특한 재능을 부여한다’, ‘그들의 음악은 팬들에게 진정성을 느끼게 한다’, ‘BTS는 그들의 아미를 가족으로 여긴다’ 등이다.
그러나 ‘BTS 현상’으로 제한하기에 이들의 영향력은 상상 이상이다. 성프란시스대학 작문교수로 있는 박경장 박사가 최근 펴낸 ‘BTS, 인문학 향연’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지구촌 아이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가 BTS 아미가 된 후 “깊은 우울증에 빠진 아이가 밝아졌으며, 무기력에 빠졌던 아이가 헤르만 헤세 ‘데미안’과 에리히 프롬 ‘사랑의 기술’을 읽고, 세상 밖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얘기한다.
BTS 음악의 근원은 무엇일까. 박경장 교수는 인문학에서 그 답을 찾는데 뮤비에 소설을 비롯해 시, 철학, 신화, 역사 등 다양한 학문과 예술이 긴밀하게 연계돼 있다고 본다. 즉 뮤비들의 서사와 구조에서 제임스 조이스의 ‘내적 독백’과 ‘의식의 흐름’ 기법 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물질만능의 자본주의가 확대되면서 인문학의 설자리는 좁아지고 있다. 한편으로 AI시대 도래로 인문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인간 근원을 탐구하고 인간다움을 성찰하는 방편으로서 인문학이 지닌 가치는 영원불변할 것이라는 의미다.
예술가는 본질적으로 새로움을 추구한다. BTS는 앞으로 어떻게 ‘성장’과 ‘변화’를 도모할 수 있을까.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 나오는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하나의 세계다. 새롭게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깨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유명한 구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인문학이라는 거대한 창작의 저수지에 답이 있을 것 같다.
/skypark@kwangju.co.kr
그러나 물질만능의 자본주의가 확대되면서 인문학의 설자리는 좁아지고 있다. 한편으로 AI시대 도래로 인문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인간 근원을 탐구하고 인간다움을 성찰하는 방편으로서 인문학이 지닌 가치는 영원불변할 것이라는 의미다.
예술가는 본질적으로 새로움을 추구한다. BTS는 앞으로 어떻게 ‘성장’과 ‘변화’를 도모할 수 있을까.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 나오는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하나의 세계다. 새롭게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깨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유명한 구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인문학이라는 거대한 창작의 저수지에 답이 있을 것 같다.
/skypark@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