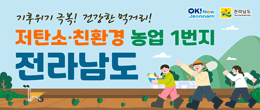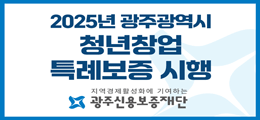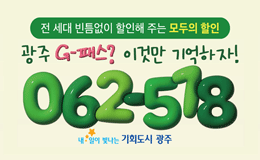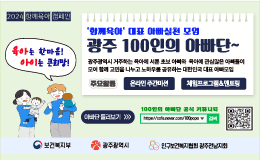[이소영의 ‘우리지역 우리식물’] 연꽃이 그리는 향기, 무안 회산백련지
 |
나는 조금 독특한 고등학교를 다녔다. 학교에는 불당이 있었고, 격주 토요일마다 듣는 교과목 중에는 불교 수업이 있었다. 우리 학교는 조계종에서 설립한 미션스쿨이었다. 내 종교가 불교이거나 이 방면에 특별히 뜻이 있어 이 학교에 입학한 것은 아니었다. 그저 입학하고 보니 이 학교였을 뿐이다.
다행히 종교에 관한 강제성이 없었던 터라 학교에 대한 거부감도 없었다. 야외 수업 차 절이 있는 숲에 가는 것도 좋았고 자연의 순리를 받아들이고 자연을 숭배하는 불교의 가르침도 마음에 들었다.
매년 5월이면 부처님 오신 날 행사 준비로 온 학교가 들썩였다. 일정 중에는 학생들이 직접 연꽃등을 만들어 근처 절에 기부하는 행사도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을 돌아보면 친구들과 강당에 둘러앉아 수다를 떨며 한지로 연꽃등을 만들던 모습이 떠오른다. 그때 내가 만든 연꽃 중에는 흰색도, 분홍색도 있었다. 내 고등학교는 비록 평범하지 않은 미션스쿨이었지만 덕분에 일찍이 종교의 교리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 자연과 친해지는 기회를 만들 수 있었고 심지어 연꽃에는 흰색과 분홍색 꽃잎의 종(種)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5년 전쯤 전남 무안의 한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식물 세밀화 강의를 하게 되었다. 무안까지 내려간 김에 1박 2일 동안 머물며 지역의 식물을 둘러보기로 결심하고 무안이 고향인 지인에게 내가 갈만한 장소를 물었다. 그는 곧바로 내게 회산백련지를 추천해 주었다.
무안을 방문하는 시기는 8월이었고 8월은 연꽃이 만개하는 계절이기에 나는 망설임 없이 그의 추천대로 회산백련지로 향했다.
회산백련지는 동양 최대 규모의 백련 재배지로 알려져 있다. 일제강점기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축조한 저수지였으나 개발로 인해 정체성을 잃은 공간이 되자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 마을 주민 정수동씨가 저수지 가장자리에 연뿌리 12주를 심었다고 한다. 그렇게 회산백련지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그후 지역 모두가 힘을 모아 백련을 가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백련 재배지가 된 것이다.
회산백련지에 다다르자 공기에서 진한 연꽃 향이 나기 시작했다. 불교에서 연꽃은 더러운 진흙탕에서 피는 맑고 성스러운 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연꽃 중에도 흰 꽃잎의 백련은 가장 깨끗한 존재, 연꽃 중의 연꽃으로 불린다.
불교의 ‘극락정토’에는 홍색, 청색, 황색, 백색의 다채로운 연꽃이 광채를 내며 피어 있다고 묘사되는데, 회산백련지에 빼곡히 핀 연꽃 풍경을 보며 이제야 그 풍경의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았다. 백련지에는 연꽃 외에도 다양한 수생식물이 살고 있고 우리가 자연을 통해 상상할 수 있는 극단의 화려함을 보여주고 있었다.
연꽃에서는 묘한 향기가 난다. 꽃 향이란 대부분 한 가지 뚜렷한 향을 중심에 두는데 연꽃 향은 처음에 나는 향과 끝 향이 다르고, 여러 향이 겹겹이 블렌딩된 듯 형용하기 힘든 오묘한 향이다. 품종에 따라 향의 강도가 다른지 모르겠으나 내가 느끼기에 백련이 많은 구역에 다다를수록 향이 더욱 진해졌다.
향이라는 감각은 매우 강렬해, 나는 이제 연꽃의 연이라는 글자만 보아도 회산백련지에서 맡은 오묘한 연꽃향을 코 끝에서 느낄 수 있다.
불교에서는 수면 위에 고이 피어 있는 연꽃이 세상을 초월한 성자의 모습과 같다고도 하고, 연꽃의 잎과 꽃 표면에 맺혀 있던 물방울이 떨어지는 모습은 근심을 떨쳐 버린 마음을 닮았다고 한다. 목재 데크 길을 따라 연꽃을 둘러보는 동안 서울에서 이곳까지 와 연꽃을 보는 스스로가 시공간을 초월한 기분마저 들었다.
회산백련지의 백련을 볼 땐 고등학교 시절 연꽃등을 만들던 내 모습이 떠올랐지만 이제 나는 어디에서든 연꽃을 만나면 회산백련지에서 맡았던 그 연꽃 향기를 떠올린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특정 장소, 사람 혹은 소재에 대한 기억과 감상을 새로운 경험으로 갱신시키는 과정이 아닐까 싶다. 그래서 현재의 나는 미래의 나를 위하여 자꾸만 식물을 찾아 나서고, 경험하고, 감각하려는 것인지도 모른다.
<식물 세밀화가>
매년 5월이면 부처님 오신 날 행사 준비로 온 학교가 들썩였다. 일정 중에는 학생들이 직접 연꽃등을 만들어 근처 절에 기부하는 행사도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을 돌아보면 친구들과 강당에 둘러앉아 수다를 떨며 한지로 연꽃등을 만들던 모습이 떠오른다. 그때 내가 만든 연꽃 중에는 흰색도, 분홍색도 있었다. 내 고등학교는 비록 평범하지 않은 미션스쿨이었지만 덕분에 일찍이 종교의 교리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 자연과 친해지는 기회를 만들 수 있었고 심지어 연꽃에는 흰색과 분홍색 꽃잎의 종(種)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무안을 방문하는 시기는 8월이었고 8월은 연꽃이 만개하는 계절이기에 나는 망설임 없이 그의 추천대로 회산백련지로 향했다.
회산백련지는 동양 최대 규모의 백련 재배지로 알려져 있다. 일제강점기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축조한 저수지였으나 개발로 인해 정체성을 잃은 공간이 되자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 마을 주민 정수동씨가 저수지 가장자리에 연뿌리 12주를 심었다고 한다. 그렇게 회산백련지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그후 지역 모두가 힘을 모아 백련을 가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백련 재배지가 된 것이다.
회산백련지에 다다르자 공기에서 진한 연꽃 향이 나기 시작했다. 불교에서 연꽃은 더러운 진흙탕에서 피는 맑고 성스러운 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연꽃 중에도 흰 꽃잎의 백련은 가장 깨끗한 존재, 연꽃 중의 연꽃으로 불린다.
불교의 ‘극락정토’에는 홍색, 청색, 황색, 백색의 다채로운 연꽃이 광채를 내며 피어 있다고 묘사되는데, 회산백련지에 빼곡히 핀 연꽃 풍경을 보며 이제야 그 풍경의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았다. 백련지에는 연꽃 외에도 다양한 수생식물이 살고 있고 우리가 자연을 통해 상상할 수 있는 극단의 화려함을 보여주고 있었다.
연꽃에서는 묘한 향기가 난다. 꽃 향이란 대부분 한 가지 뚜렷한 향을 중심에 두는데 연꽃 향은 처음에 나는 향과 끝 향이 다르고, 여러 향이 겹겹이 블렌딩된 듯 형용하기 힘든 오묘한 향이다. 품종에 따라 향의 강도가 다른지 모르겠으나 내가 느끼기에 백련이 많은 구역에 다다를수록 향이 더욱 진해졌다.
향이라는 감각은 매우 강렬해, 나는 이제 연꽃의 연이라는 글자만 보아도 회산백련지에서 맡은 오묘한 연꽃향을 코 끝에서 느낄 수 있다.
불교에서는 수면 위에 고이 피어 있는 연꽃이 세상을 초월한 성자의 모습과 같다고도 하고, 연꽃의 잎과 꽃 표면에 맺혀 있던 물방울이 떨어지는 모습은 근심을 떨쳐 버린 마음을 닮았다고 한다. 목재 데크 길을 따라 연꽃을 둘러보는 동안 서울에서 이곳까지 와 연꽃을 보는 스스로가 시공간을 초월한 기분마저 들었다.
회산백련지의 백련을 볼 땐 고등학교 시절 연꽃등을 만들던 내 모습이 떠올랐지만 이제 나는 어디에서든 연꽃을 만나면 회산백련지에서 맡았던 그 연꽃 향기를 떠올린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특정 장소, 사람 혹은 소재에 대한 기억과 감상을 새로운 경험으로 갱신시키는 과정이 아닐까 싶다. 그래서 현재의 나는 미래의 나를 위하여 자꾸만 식물을 찾아 나서고, 경험하고, 감각하려는 것인지도 모른다.
<식물 세밀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