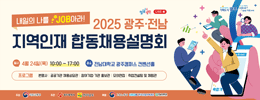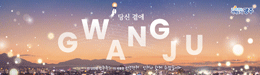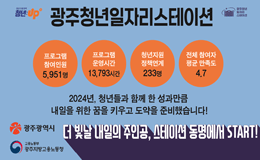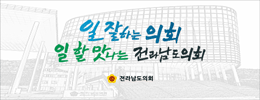[서효인의 ‘소설처럼’] 쇼츠로 담을 수 없는 최은영의 소설
 |
최근 주변에 쇼츠 콘텐츠에 중독된 게 아닐까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솔직히 말하자. 주변 사람이 아닌 글을 쓰고 있는 내가 그렇다. 틱톡에서 시작해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에 이르기까지 길면 1분에서 몇 초에 불과한 콘텐츠를 서비스한 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지만, 짧은 콘텐츠들은 우리 일상에 그 이름만큼 짧고도 굵은 방식으로 존재한다.
일과를 끝내고 자리에 누워 쇼츠를 보고 있으면 시간이 거짓말처럼 흘러가 있다. 쇼츠는 실용적인 정보를 주었다가, 현란한 춤사위를 보여주었다가, 정치 현안에 대해 다분히 정파적으로 말하다가,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의 장면을 짧게, 참을 수 없이 짧게 재생한다. 그걸 보고 있으면 너무 많은 정보가 밀려와 도리어 아무런 생각을 안 해도 된다. 세상사 안 그래도 머리 아픈데 잘 됐다 싶기도 하지만,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으면 좀 찜찜한 마음도 드는 것이다. 이거, 괜찮은 걸까?
SNS와 OTT 시대가 열린 이후로 영화의 흥행 부진은 이제 따로 짚을 것이 없는 현실이 되었고 TV 드라마의 영향력도 예전과는 현저히 다르다. 특히 쇼츠에서는 안 본 드라마나 영화도 어디서 본 듯 느낄 수 있게 결정적 장면을 짧게 보여준다. 며칠 누워서 쇼츠만 보다 보면 최근 하는 드라마는 대체로 꿸 수 있다. ‘연인’에서 남궁민이 어떤 대사를 하는지, ‘무빙’에서 봉석이가 어떻게 나는지, ‘더 글로리’에서 복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등.
그 중 쇼츠는 사이다 같은 장면을 골라서 보여주는 편이다. 갑질 손님을 처단하기, 학교 일진을 때려잡기, 무개념 신입 사원을 교육하기 같은 것들이다. 그걸 보면 마음이 일면 시원해진다. 현실에서는 사이다는커녕 시원한 냉수조차 마시기 어려우니까.
이렇듯 창작자가 애써 만든 서사물이 쇼츠라는 투박하고 좁은 상자 속으로 욱여넣음을 당하고 있을 때, 그보다 더 오랜 서사물인 소설은 한발 비켜 서 있는 듯하다. 책을 읽는 사람이, 소설의 독자가 줄어들었다는 빤한 말을 (엄연한 사실이지만) 하려는 건 아니다. 쇼츠로는 한 장면도, 아니 한 단락도 담을 수 없는 소설이라는 장르의 귀중함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최은영 소설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가 대표적으로 그렇다. 이야기는 제목처럼 아주 희미한 빛을 따라 나아간다. 은행에서 일하다 뒤늦게 대학에 편입한 ‘희원’은 2009년 2학기 강사인 ‘그녀’를 만난다. 용산이라는 공간과 여성이라는 젠더로서 묘한 동질감을 느끼던 그들은 쓰고 읽음에 대해, 그것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에 대해 대화한다. 그들의 대화는 격정적이지 않고, 논쟁적이지 않다. 따라서 사이다는 없다. 우리의 많은 대화가 그러하듯 생각지 못하게 상처 입거나 반대로 상처 입힐까 걱정한다.
2009년은 ‘용산참사’가 일어난 해다. 이 소설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이 용산을 외면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 소설의 인물은 지극히 현실의 우리와 같으므로 비극에 대한 해석 또한 갖가지이다. 지금의 용산은 그때의 용산과는 또 다른 의미와 상징을 갖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그날의 용산이 우리에게서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희미한 빛을 남겼으리라 믿는다. 어느 순간 글이나 번역서를 찾아볼 수 없이 사라진 그녀를 한겨울 희원이 떠올리듯이. 희원과 그녀의 관계를, 수업 시간의 발표와 에세이의 내용을, 전철에서 희원이 보았을 풍경을 쇼츠로 옮길 수 있을까? 그것은 편집과 알고리즘의 영역 바깥에 있는 것 같다. 좋은 소설일수록 좀 더 그러하리라 믿는다.
쇼츠나 유튜브의 영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소설은 이야기하고, 사회적 참사를 다룰 때도 그건 마찬가지다. 수업에서 희원은 자신의 감정을 기술하고 풍경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용삼참사를 떠올리게 하는 에세이를 쓴다. 사이다 같은 청량감이나 시원함은 전혀 없는 그 글에서 글을 쓴 희원은 모종을 부끄러움을 느낀다. 그의 모욕감과는 상관없이 학생들의 토론은 이어진다. 누군가는 폭력적인 시위가 문제라 말하고 누군가는 그것은 시민의 저항에 대한 잔인한 제압이었다고 말한다. 그 부분을 읽으며, 방금까지 보았던 쇼츠의 한 장면과 댓글 창을 떠올리며, 이 아름다운 소설의 장면 장면에 댓글을 달 수 없음을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희미한 빛을 느낄 새도 없이 너무나 강렬하고 잔인한 쇼츠의 빛을 이제 그만 줄여도 좋겠다 다짐했다. <시인>
SNS와 OTT 시대가 열린 이후로 영화의 흥행 부진은 이제 따로 짚을 것이 없는 현실이 되었고 TV 드라마의 영향력도 예전과는 현저히 다르다. 특히 쇼츠에서는 안 본 드라마나 영화도 어디서 본 듯 느낄 수 있게 결정적 장면을 짧게 보여준다. 며칠 누워서 쇼츠만 보다 보면 최근 하는 드라마는 대체로 꿸 수 있다. ‘연인’에서 남궁민이 어떤 대사를 하는지, ‘무빙’에서 봉석이가 어떻게 나는지, ‘더 글로리’에서 복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등.
이렇듯 창작자가 애써 만든 서사물이 쇼츠라는 투박하고 좁은 상자 속으로 욱여넣음을 당하고 있을 때, 그보다 더 오랜 서사물인 소설은 한발 비켜 서 있는 듯하다. 책을 읽는 사람이, 소설의 독자가 줄어들었다는 빤한 말을 (엄연한 사실이지만) 하려는 건 아니다. 쇼츠로는 한 장면도, 아니 한 단락도 담을 수 없는 소설이라는 장르의 귀중함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최은영 소설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가 대표적으로 그렇다. 이야기는 제목처럼 아주 희미한 빛을 따라 나아간다. 은행에서 일하다 뒤늦게 대학에 편입한 ‘희원’은 2009년 2학기 강사인 ‘그녀’를 만난다. 용산이라는 공간과 여성이라는 젠더로서 묘한 동질감을 느끼던 그들은 쓰고 읽음에 대해, 그것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에 대해 대화한다. 그들의 대화는 격정적이지 않고, 논쟁적이지 않다. 따라서 사이다는 없다. 우리의 많은 대화가 그러하듯 생각지 못하게 상처 입거나 반대로 상처 입힐까 걱정한다.
2009년은 ‘용산참사’가 일어난 해다. 이 소설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이 용산을 외면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 소설의 인물은 지극히 현실의 우리와 같으므로 비극에 대한 해석 또한 갖가지이다. 지금의 용산은 그때의 용산과는 또 다른 의미와 상징을 갖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그날의 용산이 우리에게서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희미한 빛을 남겼으리라 믿는다. 어느 순간 글이나 번역서를 찾아볼 수 없이 사라진 그녀를 한겨울 희원이 떠올리듯이. 희원과 그녀의 관계를, 수업 시간의 발표와 에세이의 내용을, 전철에서 희원이 보았을 풍경을 쇼츠로 옮길 수 있을까? 그것은 편집과 알고리즘의 영역 바깥에 있는 것 같다. 좋은 소설일수록 좀 더 그러하리라 믿는다.
쇼츠나 유튜브의 영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소설은 이야기하고, 사회적 참사를 다룰 때도 그건 마찬가지다. 수업에서 희원은 자신의 감정을 기술하고 풍경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용삼참사를 떠올리게 하는 에세이를 쓴다. 사이다 같은 청량감이나 시원함은 전혀 없는 그 글에서 글을 쓴 희원은 모종을 부끄러움을 느낀다. 그의 모욕감과는 상관없이 학생들의 토론은 이어진다. 누군가는 폭력적인 시위가 문제라 말하고 누군가는 그것은 시민의 저항에 대한 잔인한 제압이었다고 말한다. 그 부분을 읽으며, 방금까지 보았던 쇼츠의 한 장면과 댓글 창을 떠올리며, 이 아름다운 소설의 장면 장면에 댓글을 달 수 없음을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희미한 빛을 느낄 새도 없이 너무나 강렬하고 잔인한 쇼츠의 빛을 이제 그만 줄여도 좋겠다 다짐했다.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