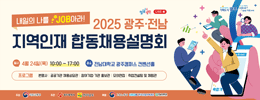[이소영의 ‘우리지역 우리식물’] 마이산의 줄사철나무
 |
무한히 뻗어나가는 힘, 마이산 줄사철나무
나는 종종 어린이, 청소년과 함께 식물 세밀화 수업을 한다. 우리가 만나서 식물을 관찰·기록하는 곳은 주로 학교, 정원, 공원 등이고 어느 지역 어느 장소에서든 늘 마주치는 식물도 있기 마련이다. 그중에는 사철나무가 있다.
우리는 도시 어디에서든 사철나무를 볼 수 있다. 이들은 겨울에도 잎이 푸르고 추위와 공해에 강하며, 우리나라 자생식물인 만큼 관리도 용이하고 생장력도 좋다. 바닷바람과 염분에 대한 저항성도 강해 제주도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아파트 단지와 주택, 빌딩 등의 경계를 짓는 나무로 심어져 왔다. 우리에게 화훼식물로서의 효용성이 너무 많은 나무, 도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나무인 셈이다.
우리나라에는 사철나무와 한 가족인 줄사철나무도 분포한다. 줄사철나무는 사철나무보다 꽃과 열매, 잎이 작고, 다른 나무에 착생해 공기 뿌리로 양분을 흡수해 살아간다. 덩굴성이기 때문에 덩굴사철나무라 불리기도 한다.
둘은 이름도 형태도 비슷하지만, 인간에게 정반대의 취급을 받는다. 사철나무는 우리에게 없어선 안 되는 화훼식물이지만, 줄사철나무는 너무 흔한 반면 덩굴성이라 화훼식물로서 사철나무만큼 가치가 없고, 다른 나무에 붙어 자라는 것에 마땅치 않은 존재로 여겨지곤 한다. 물론 이것은 인간 기준일 뿐 우리에게 사랑받지 않는다고 줄사철나무를 연민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인간이 필요로 하지 않기에 덜 훼손되고, 더 널리 번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라북도 마이산에는 특별한 줄사철나무가 있다. 마이산 근처에 다다르면 거대한 봉우리 두 개가 보이는데 산의 이름 또한 이 두 개의 산봉우리가 말의 귀를 닮아 붙여졌다. 그런 마이산에는 절벽에 붙어 성장하는 거대한 줄사철나무가 있다. 10년 여 전, 처음 이 풍경을 목격했을 때 이들이 내가 알던 작은 줄사철나무와 같은 종임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마이산의 줄사철나무가 절벽을 장악해 잎과 가지를 뻗은 모습을 보았을 때 나는 처음으로 식물의 동물성을 느꼈다. 나는 종종 인간의 손길에서 벗어나 제멋대로 자란 식물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식물에 갖는 잔잔하고 고요하다는 편견은 인간 종이 결코 이겨낼 수 없는 식물을 경계하느라 만들어낸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리고 이토록 크고 오래된 나무를 보면 경외감이 드는 한편 죄책감도 든다.
줄사철나무가 이토록 척박한 바위를 발판삼아 생장할 수 있다는 건 우리 곁 나무도 이만큼 혹은 이보다 더 잘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줄사철나무를 보면서 내가 아는 다른 나무들이 떠올랐다. 어느 미술관 벽틈의 작은 줄사철나무, 아파트 단지의 울타리 사철나무, 동네 학교의 화살나무…. 적어도 다 같이 가족같은 품종의 나무인데. 이들의 운명을 쥐고 있는 인간으로서 내 곁의 나무도 제 형태대로 살게 놔두지 못하면서 남 일 보듯, 자연이 다 한 듯 오래되고 큰 나무에 경외감만 가진 것에 조금 죄책감이 들었다.
게다가 도시에 심어진 사철나무에게 자주 따라붙는 병이 있다. 흰가루병이다. 봄이 되면 사철나무 잎에는 흰 가루와 같은 곰팡이가 자주 핀다. 사철나무 외에도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되는 채소와 장미, 배롱나무, 버즘나무 등이 이 병에 자주 걸린다. 재배 환경이 너무 습하거나 촘촘히 밀식되어 있는 경우 걸리기 쉬운데, 도시에서 이들은 주로 밀착되어 생울타리용으로 식재되다 보니 이 병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물론 흰가루병이 나무를 바로 죽게 만들거나 생명에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잎에 흰 가루가 있다 보면 광합성을 할 수가 없고, 심하면 잎이 갈변하면서 낙엽이 지게 된다.
나무가 도시에서 잘 자라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도시가 나무에게 살기 좋은 환경이라서가 아니다. 차로 변 휴지통 옆이 원산지인 나무는 없다. 나무는 그저 인간에 의해 이곳에 뿌리내려졌고, 그렇게 된 이상 살아남기 위해 이를 악물고 도시의 오염된 흙과 공기, 소음, 척박한 환경을 견뎌내고 있을 뿐이다. 마이산의 줄사철나무를 되뇔 때마다 무한히 뻗어나갈 수 있는 나무의 삶을 우리가 억지로 가로막고 있음에 죄책감이 느껴진다. <식물 세밀화가>
나는 종종 어린이, 청소년과 함께 식물 세밀화 수업을 한다. 우리가 만나서 식물을 관찰·기록하는 곳은 주로 학교, 정원, 공원 등이고 어느 지역 어느 장소에서든 늘 마주치는 식물도 있기 마련이다. 그중에는 사철나무가 있다.
우리는 도시 어디에서든 사철나무를 볼 수 있다. 이들은 겨울에도 잎이 푸르고 추위와 공해에 강하며, 우리나라 자생식물인 만큼 관리도 용이하고 생장력도 좋다. 바닷바람과 염분에 대한 저항성도 강해 제주도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아파트 단지와 주택, 빌딩 등의 경계를 짓는 나무로 심어져 왔다. 우리에게 화훼식물로서의 효용성이 너무 많은 나무, 도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나무인 셈이다.
전라북도 마이산에는 특별한 줄사철나무가 있다. 마이산 근처에 다다르면 거대한 봉우리 두 개가 보이는데 산의 이름 또한 이 두 개의 산봉우리가 말의 귀를 닮아 붙여졌다. 그런 마이산에는 절벽에 붙어 성장하는 거대한 줄사철나무가 있다. 10년 여 전, 처음 이 풍경을 목격했을 때 이들이 내가 알던 작은 줄사철나무와 같은 종임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마이산의 줄사철나무가 절벽을 장악해 잎과 가지를 뻗은 모습을 보았을 때 나는 처음으로 식물의 동물성을 느꼈다. 나는 종종 인간의 손길에서 벗어나 제멋대로 자란 식물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식물에 갖는 잔잔하고 고요하다는 편견은 인간 종이 결코 이겨낼 수 없는 식물을 경계하느라 만들어낸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리고 이토록 크고 오래된 나무를 보면 경외감이 드는 한편 죄책감도 든다.
줄사철나무가 이토록 척박한 바위를 발판삼아 생장할 수 있다는 건 우리 곁 나무도 이만큼 혹은 이보다 더 잘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줄사철나무를 보면서 내가 아는 다른 나무들이 떠올랐다. 어느 미술관 벽틈의 작은 줄사철나무, 아파트 단지의 울타리 사철나무, 동네 학교의 화살나무…. 적어도 다 같이 가족같은 품종의 나무인데. 이들의 운명을 쥐고 있는 인간으로서 내 곁의 나무도 제 형태대로 살게 놔두지 못하면서 남 일 보듯, 자연이 다 한 듯 오래되고 큰 나무에 경외감만 가진 것에 조금 죄책감이 들었다.
게다가 도시에 심어진 사철나무에게 자주 따라붙는 병이 있다. 흰가루병이다. 봄이 되면 사철나무 잎에는 흰 가루와 같은 곰팡이가 자주 핀다. 사철나무 외에도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되는 채소와 장미, 배롱나무, 버즘나무 등이 이 병에 자주 걸린다. 재배 환경이 너무 습하거나 촘촘히 밀식되어 있는 경우 걸리기 쉬운데, 도시에서 이들은 주로 밀착되어 생울타리용으로 식재되다 보니 이 병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물론 흰가루병이 나무를 바로 죽게 만들거나 생명에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잎에 흰 가루가 있다 보면 광합성을 할 수가 없고, 심하면 잎이 갈변하면서 낙엽이 지게 된다.
나무가 도시에서 잘 자라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도시가 나무에게 살기 좋은 환경이라서가 아니다. 차로 변 휴지통 옆이 원산지인 나무는 없다. 나무는 그저 인간에 의해 이곳에 뿌리내려졌고, 그렇게 된 이상 살아남기 위해 이를 악물고 도시의 오염된 흙과 공기, 소음, 척박한 환경을 견뎌내고 있을 뿐이다. 마이산의 줄사철나무를 되뇔 때마다 무한히 뻗어나갈 수 있는 나무의 삶을 우리가 억지로 가로막고 있음에 죄책감이 느껴진다. <식물 세밀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