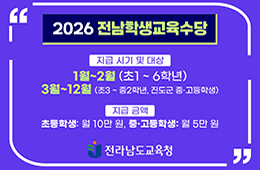호남 누정-광주 <10> 풍암정
풍암 김덕보, 두 형<김덕홍·김덕령> 기리며 원효계곡에 살포시 들어앉다
큰형 김덕홍 임진왜란 때 전사, 작은형 덕령 옥사에
동생 덕보, 세상 등지고 무등산 자락에 지은 정자
팔작지붕 형태 정면 2칸·측면 2칸…재실 1칸 특징
고경명·임억령 시문, 정홍명 ‘풍암기’ 걸려 있어
큰형 김덕홍 임진왜란 때 전사, 작은형 덕령 옥사에
동생 덕보, 세상 등지고 무등산 자락에 지은 정자
팔작지붕 형태 정면 2칸·측면 2칸…재실 1칸 특징
고경명·임억령 시문, 정홍명 ‘풍암기’ 걸려 있어
 무등산 원효계곡에 자리한 풍암정은 임란 때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김덕홍, 김덕령의 동생 김덕보가 지은 정자다. |
계곡을 찾아가는 길은 언제나 설렌다. 더욱이 명산, 덕산인 경우는 더더욱 그러하다. 색다른 기대를 하게 된다. 풍화에 다듬어진 기암괴석과 수정처럼 맑은 물은 생각만으로도 달뜨게 한다. 올망졸망한 나무들과 현자처럼 주위를 에두른 노송의 자태는 어떤가. 세상의 이런저런 즐거움과는 비교되지 않는다. 명산유곡은 승경(勝景) 가운데서도 승경이다.
무등산 원효 계곡에 살포시 들어앉은 누정을 알현하러 간다. 풍암정(楓岩亭). 무엇 하나 빠진 데가 없다. 풍광이면 풍광, 역사면 역사, 이야기면 이야기 모두 빛이 난다. 탄복할 만하다.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고 하지만, 사실은 영웅이 한 시대를 만든다. 시대와 인물의 서사는 후대에게 늘 감명과 상상을 준다.
풍암정(楓岩) 김덕보(1571~1627). 자는 자룡(子龍)이며 호는 풍암이다. 흔히 ‘형 만한 아우 없다’는 말이 있지만 김덕보는 ‘형 만한 아우’다. 됨됨이와 충혼이 형들 못지않다. 그의 형들은 임란 때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김덕홍, 김덕령. 김덕보도 형들만큼 가슴이 뜨거웠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김덕보는 당시 담양부사인 이경린과 장성현감이었던 이귀의 권고로 의병을 모집한다. 그러나 전장에선 늘 엇갈린 운명이 수시로 일어난다. 거센 풍파가 휘몰아치는 것이 전장이다. 안타깝게도 전란 중에 큰형 덕홍이 전사하고, 여기에 작은 형 덕령마저 무고로 옥사를 한다.
충은 조선을 떠받치는 유일무이한 이념의 기둥이었다. 권력을 가진 자의 편에서 충은 칼자루를 쥔 것이나 진배없었다. 그것을 좇아야 하는 이는 늘 칼날 위에서 춤을 춰야 하는 운명을 감당해야 한다. 덕보의 큰형은 죽음으로 충을 증명했고, 작은 형은 죽임으로 충의 근거가 되어야 했다.
얄궂은 운명이었다. 한가지에서 태어난 형들은 그렇게 전란의 ‘재물’이 되었다. 덕보의 비분을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덕보가 세상에서 비켜나 풍암정이라는 정자를 짓게 된 연유다. 은일(隱逸)은 그가 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무등의 계곡은 그런 덕보를 스스럼없이 받아주었다.
만년에 단풍나무 언덕 위 몇 칸 집 세우니
오래된 바위 큰 대나무 앞뒤를 둘러섰구나
빛을 향한 처마 창문에 겨울인들 따뜻하고
물을 향한 정자 난간은 여름에도 시원하다
귀한 약을 구하려 신선 따라 땅을 파보았네고
좋은 책들 빌려다가 사람들과 함께 읽고
편안한 이곳에 이 한몸을 깃들이니
무엇하러 바다 밖 봉호산을 찾을 것인가
풍암정을 찾아가면서 김덕보의 ‘마음가는 대로-만영’(漫詠)이라는 시를 떠올렸다. 여느 정자와 달리 이곳은 무등의 품에 안겨 있다. 대부분의 정자와 누정이 산 언덕에 자리하거나 강가 언저리에 얹혀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풍암정은 산의 품을 헤집고 들어가야 한다. 수풀이 우거진 곳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정표에서 더 걸어들어 가야하는 수고를 들여야 한다. 그곳에 정자를 지은 이의 마음을 다소나마 알 것도 같다.
풍암정은 원효 계곡에 보물처럼 박혀 있다. 분청사기마을에서 이십여 분 남짓 걸어가야 한다. 뙤약볕이 내리쬐지만 대수롭지 않다. 마을에서 조금 걸어들어 가자 그늘을 이룬 나무터널이 나온다. 무릉숲이 따로 없다. 촘촘한 나무터널을 걸어 풍암제라는 저수지를 지나 왼편으로 꺾어들자 물소리가 들려온다. ‘세상에서’ 방금 들어선 이의 귓가가 시원해진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기암괴석과 그 아래로 흐르는 맑은 물. 명경지수가 따로 없다. 바위 저편에 수려하게 앉은 정자가 보인다. 그러고 보니 덕보의 시문과 정자의 이미지는 한가지다. 그것을 읊고, 세운 이의 마음이 오롯이 배어나온다,
풍암정의 내력을 모르는 이들은 그저 풍광에만 취할 것이다. 장형이 전장에서 순절하고 중형이 간신배 참소로 옥사를 당한 김덕보의 애닯은 사연을 모른다면 말이다. 격변의 시기 애통하게 생을 마감해야 했던 조선 충신의 이야기를 안다면 저 자리에 수굿하게 앉은 정자를 보고 아름답다고만 탄복하지는 않을 것 같다.
아름다운 곳엔 그렇게 역설의 미학이 드리워져 있기 마련인가 보다. 왜 아름다운 풍광 이면에는 예외없이 아픔이 존재하는지, 왜 고결한 미는 상흔의 역사를 배경으로 꽃피는지 잠시 생각해본다.
조일형 한국학호남진흥원 박사는 “풍암정에는 우산 안방준을 비롯해 석천 임억령, 제봉 고경명 등의 시 외에도 기암 정홍명의 ‘풍암기’가 있어서 당시 누정과 관련한 내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했다.
정자 바깥쪽 큰 바위에는 ‘풍암’이라고 새겨진 글자가 보인다. 누정 안쪽에는 풍암정사(楓岩情舍)라는 현판이 걸려 있으며, 누정은 팔작지붕 형태로 정면 2칸, 측면 2칸으로 돼 있다. 또 재실이 1칸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음은 풍암정에 시를 남긴 만덕(晩德) 김대기(1557~1631)의 시다. ‘풍암을 떠나면서-사풍암(謝楓岩)’이라는 작품이다. 담양 출신인 그는 김덕보와는 다소 연배는 차이가 있지만 교유를 했던 사이로 보인다. 송강 정철의 문하에서 수학했으며 양산보 아들 양자징 등과도 교유했다 전해온다.
정철로부터 ‘남중제일류’(南中第一類)라는 남쪽에서 첫손에 가는 선비라는 칭송을 받았다. 물론 김대기의 천품으로 볼 때 스스로는 과람한 상찬이라고 했을 것이다. 그만큼 문장과 학덕과 인품이 빠지지 않았다는 뜻일 터다. 정묘호란이 발발했을 때는 영광에서 거병해 왜군에 맞섰다.
나는 늙고 그대 또한 병이 들어
지팡이 부여잡고 가까스로 찾아왔네
문전에 다다랐지만 모습은 볼 수 없어
단풍만이 맑은 날 숲을 이루었구나
은일하기 좋은 승경이다. 사람들의 손을 덜 타고, 발걸음이 닿지 않는 적소이다. 언급한 대로 아름다운 만큼 상흔이 있다고 했는데, 정자 앞의 길들을 ‘무등산 의병길’이라 부르는 이유를 알 것도 같다.
잠시 정자에 걸터앉아 앞을 바라본다. 기암괴석에 천지의 단풍나무가 주위를 에워싸고 있다. 여름에는 찔레꽃 무리지어 피어나고 가을에는 선홍빛 단풍이 든다. 겨울에는 설산의 풍경이 장관일 것이다. 이곳 풍암정(楓岩亭)에서 잠시 옛 선비들의 뜨겁고 붉은 마음을 가늠해본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풍암정(楓岩) 김덕보(1571~1627). 자는 자룡(子龍)이며 호는 풍암이다. 흔히 ‘형 만한 아우 없다’는 말이 있지만 김덕보는 ‘형 만한 아우’다. 됨됨이와 충혼이 형들 못지않다. 그의 형들은 임란 때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김덕홍, 김덕령. 김덕보도 형들만큼 가슴이 뜨거웠다.
충은 조선을 떠받치는 유일무이한 이념의 기둥이었다. 권력을 가진 자의 편에서 충은 칼자루를 쥔 것이나 진배없었다. 그것을 좇아야 하는 이는 늘 칼날 위에서 춤을 춰야 하는 운명을 감당해야 한다. 덕보의 큰형은 죽음으로 충을 증명했고, 작은 형은 죽임으로 충의 근거가 되어야 했다.
얄궂은 운명이었다. 한가지에서 태어난 형들은 그렇게 전란의 ‘재물’이 되었다. 덕보의 비분을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덕보가 세상에서 비켜나 풍암정이라는 정자를 짓게 된 연유다. 은일(隱逸)은 그가 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무등의 계곡은 그런 덕보를 스스럼없이 받아주었다.
 |
오래된 바위 큰 대나무 앞뒤를 둘러섰구나
빛을 향한 처마 창문에 겨울인들 따뜻하고
물을 향한 정자 난간은 여름에도 시원하다
귀한 약을 구하려 신선 따라 땅을 파보았네고
좋은 책들 빌려다가 사람들과 함께 읽고
편안한 이곳에 이 한몸을 깃들이니
무엇하러 바다 밖 봉호산을 찾을 것인가
 풍암정에서 바라본 외부 풍경. |
풍암정은 원효 계곡에 보물처럼 박혀 있다. 분청사기마을에서 이십여 분 남짓 걸어가야 한다. 뙤약볕이 내리쬐지만 대수롭지 않다. 마을에서 조금 걸어들어 가자 그늘을 이룬 나무터널이 나온다. 무릉숲이 따로 없다. 촘촘한 나무터널을 걸어 풍암제라는 저수지를 지나 왼편으로 꺾어들자 물소리가 들려온다. ‘세상에서’ 방금 들어선 이의 귓가가 시원해진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기암괴석과 그 아래로 흐르는 맑은 물. 명경지수가 따로 없다. 바위 저편에 수려하게 앉은 정자가 보인다. 그러고 보니 덕보의 시문과 정자의 이미지는 한가지다. 그것을 읊고, 세운 이의 마음이 오롯이 배어나온다,
풍암정의 내력을 모르는 이들은 그저 풍광에만 취할 것이다. 장형이 전장에서 순절하고 중형이 간신배 참소로 옥사를 당한 김덕보의 애닯은 사연을 모른다면 말이다. 격변의 시기 애통하게 생을 마감해야 했던 조선 충신의 이야기를 안다면 저 자리에 수굿하게 앉은 정자를 보고 아름답다고만 탄복하지는 않을 것 같다.
아름다운 곳엔 그렇게 역설의 미학이 드리워져 있기 마련인가 보다. 왜 아름다운 풍광 이면에는 예외없이 아픔이 존재하는지, 왜 고결한 미는 상흔의 역사를 배경으로 꽃피는지 잠시 생각해본다.
조일형 한국학호남진흥원 박사는 “풍암정에는 우산 안방준을 비롯해 석천 임억령, 제봉 고경명 등의 시 외에도 기암 정홍명의 ‘풍암기’가 있어서 당시 누정과 관련한 내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했다.
정자 바깥쪽 큰 바위에는 ‘풍암’이라고 새겨진 글자가 보인다. 누정 안쪽에는 풍암정사(楓岩情舍)라는 현판이 걸려 있으며, 누정은 팔작지붕 형태로 정면 2칸, 측면 2칸으로 돼 있다. 또 재실이 1칸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음은 풍암정에 시를 남긴 만덕(晩德) 김대기(1557~1631)의 시다. ‘풍암을 떠나면서-사풍암(謝楓岩)’이라는 작품이다. 담양 출신인 그는 김덕보와는 다소 연배는 차이가 있지만 교유를 했던 사이로 보인다. 송강 정철의 문하에서 수학했으며 양산보 아들 양자징 등과도 교유했다 전해온다.
정철로부터 ‘남중제일류’(南中第一類)라는 남쪽에서 첫손에 가는 선비라는 칭송을 받았다. 물론 김대기의 천품으로 볼 때 스스로는 과람한 상찬이라고 했을 것이다. 그만큼 문장과 학덕과 인품이 빠지지 않았다는 뜻일 터다. 정묘호란이 발발했을 때는 영광에서 거병해 왜군에 맞섰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돌기단. |
지팡이 부여잡고 가까스로 찾아왔네
문전에 다다랐지만 모습은 볼 수 없어
단풍만이 맑은 날 숲을 이루었구나
 풍암정 가는 길 인근의 분청사기전시실. |
잠시 정자에 걸터앉아 앞을 바라본다. 기암괴석에 천지의 단풍나무가 주위를 에워싸고 있다. 여름에는 찔레꽃 무리지어 피어나고 가을에는 선홍빛 단풍이 든다. 겨울에는 설산의 풍경이 장관일 것이다. 이곳 풍암정(楓岩亭)에서 잠시 옛 선비들의 뜨겁고 붉은 마음을 가늠해본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