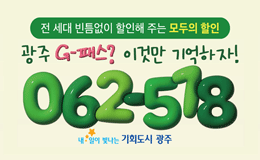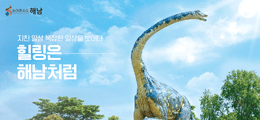[이덕일의 ‘역사의 창’] 붕당과 진영
 |
고대에는 정치적 목적의 당(黨)을 만드는 것을 부정적으로 봤다. 사대부 계급이 집단적으로 조정에 진출한 북송(北宋) 때부터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다. 북송의 구양수(歐陽修)는 ‘붕당론(朋黨論)’에서 “군자는 군자와 더불어 도(道)를 행하지만 소인은 소인과 더불어 이익을 추구한다”면서 도를 추구하는 군자들의 당을 진붕(眞朋), 사익을 추구하는 소인들의 당을 위붕(僞朋)으로 구분했다. 위붕은 군주가 멀리해야 하지만 진붕은 가까이 지내야한다는 것이다.
조선은 명나라 형법인 ‘대명률(大明律)’을 조선 실정에 맞게 고쳐서 형법으로 사용했다. 대명률에는 간사한 사람들이 무리를 짓는 것을 뜻하는 간당(奸黨)조가 있는데 “붕당을 결성하여 조정을 문란하게 하는 자는 모두 목을 베고, 처자는 종으로 삼고 재산은 관에 몰수한다”고 규정했다. 간사한 무리들이 붕당을 결성해 나라를 어지럽히는 것을 사형으로 다스렸다.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자당(自黨)은 진붕(眞朋)이고 상대 당은 위붕(僞朋)으로 공격하는 점이다. 성호 이익은 ‘붕당론(朋黨論)’에서 “붕당은 싸움에서 생기고, 그 싸움은 이해관계에서 생긴다”라고 간파했다. 또한 ‘당습소란(黨習召亂)’에서는 “당파의 폐습이 고질화되면서 자기 당이면 어리석고 못난 자도 관중(管仲)이나 제갈량(諸葛亮)처럼 여기고, 가렴주구를 일삼는 자도 공수·황패(공遂·黃覇:한나라 때 명 목민관들)처럼 여기지만 자기 당이 아니면 모두 이와 반대로 한다”면서 편향된 당심(黨心)을 비판했다.
이익은 ‘귀향(歸鄕)’에서 “지금 세상에 붕당의 화(禍)도 그 근원을 따지면 벼슬하려는 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벼슬로 무엇을 추구하는가가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벼슬 자체가 목적이 되었다는 비판이다.
현재 당쟁보다 넓은 의미로 쓰이는 용어가 진영(陣營)인데, 진영이란 원래 군대가 집결하고 있는 곳을 뜻한다. 현재 우리 사회가 두 진영으로 나뉘어 전쟁 중이란 뜻이나 마찬가지다.
추거자(推車子)라는 말이 있다. 수레를 미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상하가 서로 힘을 합쳐 국난을 극복한다는 의미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의 ‘성공(成公) 2년’조에는 서기 전 589년 제(齊)나라와 진(晉)나라가 제나라 부근의 안(鞍) 땅에서 진영을 치고 서로 전쟁하던 때의 이야기가 나온다. 진나라의 대부(大夫) 해장(解張)은 수레의 왼쪽을 맡아 싸우다가 손과 팔꿈치에 화살이 박혀 피가 전차의 왼쪽 바퀴를 물들였지만 끝까지 고통을 참으며 수레를 몰았다. 수레의 오른쪽을 맡은 정구완(鄭丘緩)은 길이 험하면 수레에서 내려 손으로 밀면서 싸워 제나라 군대를 물리쳤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율곡 이이는 서인의 영수이고, 서애 류성룡은 남인의 영수였지만 백성들의 민생을 걱정하는 처방은 같았다. 당시 백성들에게 공납(貢納)은 큰 고통이었다. 공납은 그 지방의 특산물을 임금에게 바친다는 소박한 개념에서 시작했지만 그 부과 단위가 가호(家戶) 단위라는 점이 문제였다. 관청과 통하는 부유한 양반들에겐 적게 부과되고 가난한 상민들에게 많이 부과되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가짓수도 많았다. 이이는 그 부과 단위를 가호가 아니라 농지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바꾸고 잡다한 가짓수를 쌀로 통일하자는 대공수미법(代貢收米法)을 제안했고, 류성룡은 임진왜란 때 작미법(作米法)이라는 이름으로 실제 실행에 옮겼다.
지난 7월 17일~18일 NBS의 정당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힘 30%, 더불어민주당 23%, 지지정당 없음이 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야 양당이 모두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는 형국이다. 국민들의 눈에 여나 야나 사익을 추구하는 위붕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사회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도(道)는 사라지고 이(利)가 판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요즘 정치 수준에 이이나 류성룡을 말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인지 몰라도 국가 전체의 미래를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는 큰 정치를 보고 싶은 마음은 그때와 마찬가지일 것이다.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자당(自黨)은 진붕(眞朋)이고 상대 당은 위붕(僞朋)으로 공격하는 점이다. 성호 이익은 ‘붕당론(朋黨論)’에서 “붕당은 싸움에서 생기고, 그 싸움은 이해관계에서 생긴다”라고 간파했다. 또한 ‘당습소란(黨習召亂)’에서는 “당파의 폐습이 고질화되면서 자기 당이면 어리석고 못난 자도 관중(管仲)이나 제갈량(諸葛亮)처럼 여기고, 가렴주구를 일삼는 자도 공수·황패(공遂·黃覇:한나라 때 명 목민관들)처럼 여기지만 자기 당이 아니면 모두 이와 반대로 한다”면서 편향된 당심(黨心)을 비판했다.
현재 당쟁보다 넓은 의미로 쓰이는 용어가 진영(陣營)인데, 진영이란 원래 군대가 집결하고 있는 곳을 뜻한다. 현재 우리 사회가 두 진영으로 나뉘어 전쟁 중이란 뜻이나 마찬가지다.
추거자(推車子)라는 말이 있다. 수레를 미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상하가 서로 힘을 합쳐 국난을 극복한다는 의미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의 ‘성공(成公) 2년’조에는 서기 전 589년 제(齊)나라와 진(晉)나라가 제나라 부근의 안(鞍) 땅에서 진영을 치고 서로 전쟁하던 때의 이야기가 나온다. 진나라의 대부(大夫) 해장(解張)은 수레의 왼쪽을 맡아 싸우다가 손과 팔꿈치에 화살이 박혀 피가 전차의 왼쪽 바퀴를 물들였지만 끝까지 고통을 참으며 수레를 몰았다. 수레의 오른쪽을 맡은 정구완(鄭丘緩)은 길이 험하면 수레에서 내려 손으로 밀면서 싸워 제나라 군대를 물리쳤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율곡 이이는 서인의 영수이고, 서애 류성룡은 남인의 영수였지만 백성들의 민생을 걱정하는 처방은 같았다. 당시 백성들에게 공납(貢納)은 큰 고통이었다. 공납은 그 지방의 특산물을 임금에게 바친다는 소박한 개념에서 시작했지만 그 부과 단위가 가호(家戶) 단위라는 점이 문제였다. 관청과 통하는 부유한 양반들에겐 적게 부과되고 가난한 상민들에게 많이 부과되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가짓수도 많았다. 이이는 그 부과 단위를 가호가 아니라 농지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바꾸고 잡다한 가짓수를 쌀로 통일하자는 대공수미법(代貢收米法)을 제안했고, 류성룡은 임진왜란 때 작미법(作米法)이라는 이름으로 실제 실행에 옮겼다.
지난 7월 17일~18일 NBS의 정당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힘 30%, 더불어민주당 23%, 지지정당 없음이 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야 양당이 모두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는 형국이다. 국민들의 눈에 여나 야나 사익을 추구하는 위붕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사회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도(道)는 사라지고 이(利)가 판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요즘 정치 수준에 이이나 류성룡을 말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인지 몰라도 국가 전체의 미래를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는 큰 정치를 보고 싶은 마음은 그때와 마찬가지일 것이다.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