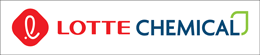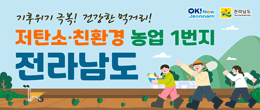우리가 매일 실패하는 이유- 조혜원 동신대 상담심리학과 2년
 |
‘작심삼일’(作心三日)은 단단히 먹은 마음이 사흘을 넘기지 못한다는 뜻으로 결심이 굳지 못함을 이르는 말이다. 보통 우리는 평소 내가 가진 습관을 바꾸거나,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 위해 단단히 마음을 먹고 계획을 세운다. 그래서 작심삼일은 결국 습관을 바꾸지 못했거나, 습관을 만드는 데 실패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왜 습관을 바꾸고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게 어려운 걸까? 시간이 부족해서? 의지력이 약해서? 게을러서? 목표와 계획을 너무 높고 어렵게 잡아서?
사실 우리는 스스로 그 이유를 잘 알고 있다. 반드시 해야겠다는 마음보다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를 ‘회피’라고 한다. 여기에 합리적인 이유가 붙으면 ‘하지 않아도 괜찮다’ ‘내일 몰아서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작심삼일에 이른다. 우리가 작심삼일을 반복하는 이유는 이 같은 회피와 합리화가 습관이 돼 버리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가 이 모든 결과의 탓을 자신에게 돌리며 ‘어차피 하지도 못할 거 왜 해야 하지?’라는 무기력함과 죄책감에 빠져 도전조차 두려워하고 꺼리는 사람이 돼 버리는 것이다. 회피와 합리화가 결국 또 다른 실패를 불러들인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작심삼일의 습관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선 자기 효능감을 높여야 한다. 자기 효능감은 자신이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심리학적 용어다. 미국의 목사이자 저명한 작가인 노먼 빈센트 필은 “자신을 믿어라.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라. 겸손하지만 합리적인 자신감 없이는 성공할 수도 행복할 수도 없다”며 자기 효능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자기 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들은 그들 스스로가 과제 또는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이 풍부하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과제에 대해 높은 수준의 노력을 투자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자기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성취감이다. 결국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거나, 작은 습관을 바꾸거나 만드는 데 성공하며 성취감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생각이다. 미루던 일들에 대해 듣기 좋은 핑계를 만드는 자기 합리화가 아닌, 말 그대로 과제를 했을 때 나올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사고하라는 의미이다. 이를 ‘접근 동기’라고 한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동기가 필요하다. 목표를 세우거나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할 때도 그에 따른 동기가 있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는 그 일을 꼭 하게 만드는 접근 동기가 된다.
가령 학교 과제를 예로 들어보자.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완성된 리포트 또는 발표 자료를 보며 스스로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끼는 것은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 또 그 결과로 더 좋은 학점을 받고, 더 많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며, 좋은 직장에 취업까지 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접근 동기가 될 수 있다. 이런 결과들을 생각하면 벌써 막 힘이 나고 하루 빨리 결과를 얻어내어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게 되지 않는가?
반대로 나에게 더 좋지 않은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회피(회피 동기)하는 것도 필요하다. 학교 과제를 하지 않았을 때 받게 될 F학점 등 더 큰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학교 과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믿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방법만으로 우리는 작심삼일이라는 굴레에서 한 걸음 멀어질 수 있다.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작심삼일의 징크스를 깨기 위해 자신과의 싸움에 노력을 투자하자. 설령 몇 번 진다고 하더라도 괜찮다. 우리에게는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그런 습관이 나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사실 우리는 스스로 그 이유를 잘 알고 있다. 반드시 해야겠다는 마음보다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를 ‘회피’라고 한다. 여기에 합리적인 이유가 붙으면 ‘하지 않아도 괜찮다’ ‘내일 몰아서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작심삼일에 이른다. 우리가 작심삼일을 반복하는 이유는 이 같은 회피와 합리화가 습관이 돼 버리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가 이 모든 결과의 탓을 자신에게 돌리며 ‘어차피 하지도 못할 거 왜 해야 하지?’라는 무기력함과 죄책감에 빠져 도전조차 두려워하고 꺼리는 사람이 돼 버리는 것이다. 회피와 합리화가 결국 또 다른 실패를 불러들인다는 얘기다.
우선 자기 효능감을 높여야 한다. 자기 효능감은 자신이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심리학적 용어다. 미국의 목사이자 저명한 작가인 노먼 빈센트 필은 “자신을 믿어라.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라. 겸손하지만 합리적인 자신감 없이는 성공할 수도 행복할 수도 없다”며 자기 효능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자기 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들은 그들 스스로가 과제 또는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이 풍부하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과제에 대해 높은 수준의 노력을 투자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자기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성취감이다. 결국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거나, 작은 습관을 바꾸거나 만드는 데 성공하며 성취감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생각이다. 미루던 일들에 대해 듣기 좋은 핑계를 만드는 자기 합리화가 아닌, 말 그대로 과제를 했을 때 나올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사고하라는 의미이다. 이를 ‘접근 동기’라고 한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동기가 필요하다. 목표를 세우거나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할 때도 그에 따른 동기가 있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는 그 일을 꼭 하게 만드는 접근 동기가 된다.
가령 학교 과제를 예로 들어보자.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완성된 리포트 또는 발표 자료를 보며 스스로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끼는 것은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 또 그 결과로 더 좋은 학점을 받고, 더 많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며, 좋은 직장에 취업까지 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접근 동기가 될 수 있다. 이런 결과들을 생각하면 벌써 막 힘이 나고 하루 빨리 결과를 얻어내어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게 되지 않는가?
반대로 나에게 더 좋지 않은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회피(회피 동기)하는 것도 필요하다. 학교 과제를 하지 않았을 때 받게 될 F학점 등 더 큰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학교 과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믿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방법만으로 우리는 작심삼일이라는 굴레에서 한 걸음 멀어질 수 있다.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작심삼일의 징크스를 깨기 위해 자신과의 싸움에 노력을 투자하자. 설령 몇 번 진다고 하더라도 괜찮다. 우리에게는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그런 습관이 나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