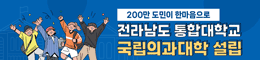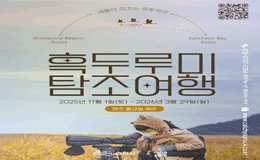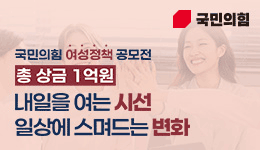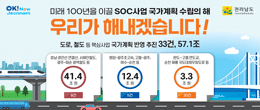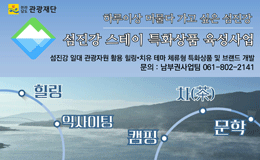[광주일보-한국학호남진흥원 공동기획] 호남 누정-광주 <2>부용정
인재 기르고 마을 질서 세웠던 광주 향약의 시원지
전라수군절제사 지낸 김문발 1416년 건립
맞배지붕 민도리집으로 정·측면 각각 3칸
양응정·고경명·이안눌 등 선비들 시회장
800년 은행나무·고싸움 테마파크도 눈길
전라수군절제사 지낸 김문발 1416년 건립
맞배지붕 민도리집으로 정·측면 각각 3칸
양응정·고경명·이안눌 등 선비들 시회장
800년 은행나무·고싸움 테마파크도 눈길
 광주시 남구 칠석동에 있는 부용정은 전라도관찰사를 지낸 김문발이 건립한 정자다. 이곳에선 향촌 규율과 인재 양성을 위한 강학이 진행되었다. |
그곳에 가면서 연꽃을 기대했다. 하얀 연꽃이 나붓나붓 피어 있는 모습을 생각했다. 부용정(芙蓉亭)이라는 명칭 때문이었다. 연꽃을 부용이라 이름한다. 흙탕물에서도 고결하게 피어오른 연꽃, 그 순백의 힘을 보고 싶었다.
부용에는 향기가 있다. 여느 꽃인들 향취가 없으랴. 그러나 연꽃이 발하는 향은 절제와 부드러움이다. 여기에 요염과 요설은 들어설 틈이 없다. 있는 듯 없는 듯 스스로 맑음을 피워내는 성정은 다른 꽃들과는 비교불가다.
중국 송대의 주돈이는 ‘애련설’(愛蓮說)에서 연꽃을 상찬했다. ‘진흙에서 나왔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속은 비었지만 겉은 곧고’라고 노래했다. 연꽃의 생리와 미덕을 아는 이들은 곧잘 주돈이의 시를 인용하곤 한다. 연꽃은 덩굴을 이루지도 가지를 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청아한 향을 멀리까지 발한다. 연꽃이 덕망 있는 군자와 올곧은 선비에 비견되는 이유다.
시끄러운 세상이다. 역사 이래 시끄럽지 않은 때가 있었던가. 당연한 일임에도 그 시끄러움이 이젠 데면데면해진다. 사람 사는 세상, 떠들썩한 일이 없지 않겠지만 사생결단의 이전투구는 매일매일 반복된다. 요설과 사설(辭說)이 난무하고 모략과 중상비방이 도를 넘는다. 혀끝이 날카로워진 세태일수록 부용의 미덕을 생각하게 된다.
‘옻돌마을’이라 일컫는 동네에는 부용정(芙蓉亭)이 있다. 이름 따라 혹여 무심한 듯 사방을 물들이는 연꽃이 피어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연꽃은 없다. 연방죽은 없지만 마을 앞엔 수수하면서도 아담한 방죽은 자리한다. 저편에 도열한 포플러 나무가 봄날의 정취를 더한다.
부용은 없지만, 그것을 연상할 만한 부용정(芙蓉亭)이 있으니 그것으로 족하다. 무심한 듯 사방을 물들이는 군자의 도를 잠시나마 알현할 수 있겠다 싶다.
옻돌마을은 광주시 남구 칠석동 마을의 옛이름이다. 행정지명인 칠석동이 쉽게 다가는 오지만, 옻돌마을이라는 문해적 이름이 주는 유구함과 정취를 넘지는 못한다. ‘칠석’(漆石)은 “검은 옻색의 고인돌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앞산에 고인돌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마을의 유래는 오랜 옛적에 닿아 있다.
고싸움놀이로도 유명한데, 이곳에서 웅대한 전통놀이가 전승되는 것은 풍수지리와 연관이 있다. 지관들은 마을의 형상을 와우형국(蝸牛形局)으로 본다. 예로부터 황소가 쪼그리고 앉은 자태는 터가 세다고 전해온다. 풍년을 기대하기는 난망했을 터. 자연스레 억센 터를 누르기 위해 고싸움놀이가 행해졌다. 정월 초 회의를 열어 당산제를 논하고 이후 고싸움과 관련한 행사들이 열렸다.
부용정은 규모가 크다. 단아함보다는 웅장함이 느껴진다. 산 중턱에 자리한 여느 정자와 다른 아우라를 발한다. 마을 앞에 자리한 데서 보듯 실용적인 기능을 상정했을 터다. 정자 주위로 사방을 물들인 초록의 기운이 완연해 잠시 걸터앉는다. 막힌 가슴이 뚫리며 실바람이 귓가를 스친다.
부용정은 부용 김문발(1359~1418)이 세웠다. 시대상으로 보면 여말선초에 해당한다. 김문발은 만년인 1416년 지역의 인재를 기르고 향촌 규율을 위해 정자를 건립했다. 그는 조선전기 형조참판, 충청전라도수군도체철추포사, 전라도수군절제사 등을 역임했다. 본관은 광산(光山)이며 문정공(文正公) 김태현의 후손이다.
기록에 따르면 김문발은 1418년 황해도 관찰사에 임명되지만 임직한 기간은 짧다. 이후 그는 낙향해 부용정을 짓고 주민들의 풍속 교화에 전념한다. 여씨의 남전향약과 주자의 백록동 규약을 토대로 풍교에 힘을 쏟았다.
부용정의 역사적 가치가 향약 시행처라는 점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 광주 향약의 시원지로서의 부용정은 단순히 누정이 지체 높은 이들의 여기와 휴식만을 위한 공간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건물은 정면이나 측면 모두 세 칸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포가 없는 민도리집으로, 맞배지붕에 민흘림기둥이 인상적이다.
한국학호남진흥원 천득염 원장에 따르면 부용정에서는 선비들의 시회장(詩會場)과 향촌의 질서를 상정한 민주적인 여론 수렴이 이루어졌다. 천 원장은 “광주에서 처음으로 향약을 시행했던 정자라는 유서 깊은 의미가 깃들어 있다”며 “무엇보다 칠석마을의 고싸움놀이테마공원과 고싸움놀이전수관 등의 공간과 연계하면 문화적, 역사적 가치가 높은 콘텐츠 개발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용정 안으로 들어서면 선비들의 글을 만날 수 있다.
김문발 사후 150여 년이 지난 즈음 일련의 선비들이 부용정을 찾았다. 당시 광주 목사인 송천 양응정, 삼십 대의 제봉 고경명, 명암 김형 등이다. 또한 칠석마을 일원의 광산김씨 집안사람들도 참석했다. 이들은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시운을 떼었다. 다감한 운치 속에서 담박한 문우지정을 나누었을 것이다.
이른 아침 실낱 같은 비 내리니
저녁 되자 맑은 빛이 푸른 못에 가득하네
아름다운 모임 어찌 하늘이 준 기회가 아니겠는가
사군(使君)의 나들이 행색 절로 느리네
(양응정의 ‘부용정 운’에서 )
봄날, 부용정 마루에 걸터앉아 분분하게 내리쬐는 보드라운 햇살을 바라본다. 싱그러움이 대지에 가득하다. 저편에 자리한 800년 넘은 은행나무가 마치 이곳을 굽어보는 느낌이다. 오래된 신화 하나가 홀연히 서 있는 것이리라. 향풍 진작을 은연히 지켜보았을 은행나무의 자태에서 옛 선현들의 모습이 어른거린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이른 아침 실낱 같은 비 내리니
저녁이 되자 맑은 빛이 푸른 못에 가득하네
아름다운 모임 어찌 하늘이 준 기회가 아니겠는가
사군(使君)의 나들이 행색 절로 느리네
(양응정의 ‘부용정 운’에서)
부용에는 향기가 있다. 여느 꽃인들 향취가 없으랴. 그러나 연꽃이 발하는 향은 절제와 부드러움이다. 여기에 요염과 요설은 들어설 틈이 없다. 있는 듯 없는 듯 스스로 맑음을 피워내는 성정은 다른 꽃들과는 비교불가다.
 칠석마을 800년 된 은행나무. |
부용은 없지만, 그것을 연상할 만한 부용정(芙蓉亭)이 있으니 그것으로 족하다. 무심한 듯 사방을 물들이는 군자의 도를 잠시나마 알현할 수 있겠다 싶다.
옻돌마을은 광주시 남구 칠석동 마을의 옛이름이다. 행정지명인 칠석동이 쉽게 다가는 오지만, 옻돌마을이라는 문해적 이름이 주는 유구함과 정취를 넘지는 못한다. ‘칠석’(漆石)은 “검은 옻색의 고인돌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앞산에 고인돌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마을의 유래는 오랜 옛적에 닿아 있다.
 부용정 인근에 있는 고싸움놀이 테마파크. |
부용정은 규모가 크다. 단아함보다는 웅장함이 느껴진다. 산 중턱에 자리한 여느 정자와 다른 아우라를 발한다. 마을 앞에 자리한 데서 보듯 실용적인 기능을 상정했을 터다. 정자 주위로 사방을 물들인 초록의 기운이 완연해 잠시 걸터앉는다. 막힌 가슴이 뚫리며 실바람이 귓가를 스친다.
부용정은 부용 김문발(1359~1418)이 세웠다. 시대상으로 보면 여말선초에 해당한다. 김문발은 만년인 1416년 지역의 인재를 기르고 향촌 규율을 위해 정자를 건립했다. 그는 조선전기 형조참판, 충청전라도수군도체철추포사, 전라도수군절제사 등을 역임했다. 본관은 광산(光山)이며 문정공(文正公) 김태현의 후손이다.
기록에 따르면 김문발은 1418년 황해도 관찰사에 임명되지만 임직한 기간은 짧다. 이후 그는 낙향해 부용정을 짓고 주민들의 풍속 교화에 전념한다. 여씨의 남전향약과 주자의 백록동 규약을 토대로 풍교에 힘을 쏟았다.
부용정의 역사적 가치가 향약 시행처라는 점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 광주 향약의 시원지로서의 부용정은 단순히 누정이 지체 높은 이들의 여기와 휴식만을 위한 공간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건물은 정면이나 측면 모두 세 칸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포가 없는 민도리집으로, 맞배지붕에 민흘림기둥이 인상적이다.
한국학호남진흥원 천득염 원장에 따르면 부용정에서는 선비들의 시회장(詩會場)과 향촌의 질서를 상정한 민주적인 여론 수렴이 이루어졌다. 천 원장은 “광주에서 처음으로 향약을 시행했던 정자라는 유서 깊은 의미가 깃들어 있다”며 “무엇보다 칠석마을의 고싸움놀이테마공원과 고싸움놀이전수관 등의 공간과 연계하면 문화적, 역사적 가치가 높은 콘텐츠 개발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용정 안으로 들어서면 선비들의 글을 만날 수 있다.
김문발 사후 150여 년이 지난 즈음 일련의 선비들이 부용정을 찾았다. 당시 광주 목사인 송천 양응정, 삼십 대의 제봉 고경명, 명암 김형 등이다. 또한 칠석마을 일원의 광산김씨 집안사람들도 참석했다. 이들은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시운을 떼었다. 다감한 운치 속에서 담박한 문우지정을 나누었을 것이다.
이른 아침 실낱 같은 비 내리니
저녁 되자 맑은 빛이 푸른 못에 가득하네
아름다운 모임 어찌 하늘이 준 기회가 아니겠는가
사군(使君)의 나들이 행색 절로 느리네
(양응정의 ‘부용정 운’에서 )
봄날, 부용정 마루에 걸터앉아 분분하게 내리쬐는 보드라운 햇살을 바라본다. 싱그러움이 대지에 가득하다. 저편에 자리한 800년 넘은 은행나무가 마치 이곳을 굽어보는 느낌이다. 오래된 신화 하나가 홀연히 서 있는 것이리라. 향풍 진작을 은연히 지켜보았을 은행나무의 자태에서 옛 선현들의 모습이 어른거린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이른 아침 실낱 같은 비 내리니
저녁이 되자 맑은 빛이 푸른 못에 가득하네
아름다운 모임 어찌 하늘이 준 기회가 아니겠는가
사군(使君)의 나들이 행색 절로 느리네
(양응정의 ‘부용정 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