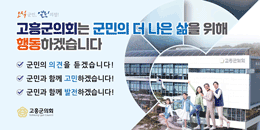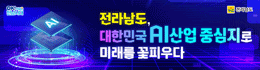중대재해처벌법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산업재해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5년간 두 차례를 제외하곤 줄곧 1위를 지켜 온 것이다. 여기에 산재사망률이 영국보다 15배나 높다는 조사도 있다. 산재사망률이 낮아지지 않는 데는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 관련 법안을 내놓지만 땜질식에 그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탓이 크다. 부실감리 예방을 위한 ‘건설산업진흥법’은 1987년 제정 이후 31번이나 개정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부실감리로 벌점을 받은 업체가 200여 곳이나 된다.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1981년 마련한 ‘산업안전보건법’도 지금까지 열두 차례나 개선안이 나왔지만 산업현장의 재해 발생은 줄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은 2018년 12월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후에야 전부 개정안이 나왔는데 매사에 ‘사후약방문’식 처방이 문제다.
김용균 씨 사망은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태가 됐다. 김 씨의 사망으로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있었고, 지난해 1월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강화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1년 만에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하지만 2년 후부터는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도 대상이 된다. 광주의 경우 50인 이상 사업장은 1429곳으로 전체 사업체의 1.2%에 불과하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포함해도 전체의 19.6%밖에 안 된다. 그런데도 일부 기업에서는 바지 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피해 가려는 꼼수를 부리는 곳도 있다고 한다.
광주 시민들은 현대산업개발의 ‘학동 참사’에 이어 7개월 만에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를 경험했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대기업조차 부실공사로 한순간에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낸 현장을 목격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전 법안처럼 땜질식 처방에 그치지 않으려면 예외 없는 엄격한 법 적용이 뒤따라야 한다.
/장필수 제2사회부장 bungy@kwangju.co.kr
김용균 씨 사망은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태가 됐다. 김 씨의 사망으로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있었고, 지난해 1월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강화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1년 만에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광주 시민들은 현대산업개발의 ‘학동 참사’에 이어 7개월 만에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를 경험했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대기업조차 부실공사로 한순간에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낸 현장을 목격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전 법안처럼 땜질식 처방에 그치지 않으려면 예외 없는 엄격한 법 적용이 뒤따라야 한다.
/장필수 제2사회부장 bung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