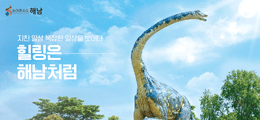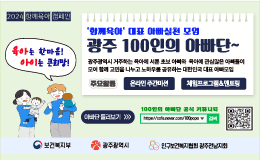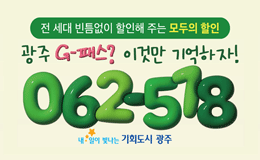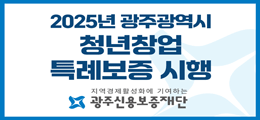시간에 묻히기 전 기억의 창고에 저장한 풍경들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사라져 가는 풍경들
이용한 지음
사라져 가는 풍경들
이용한 지음
 |
“사실 이 세계는 무수한 사라짐 속에서 구축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엄연히 존재했던 그것들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들이다. 내가 목도한 숱한 풍경이 시간의 무덤에 묻히기 전에 이렇게 기억의 창고에 하나씩 저장해 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이유는 없다. 늘 그랬듯 우리는 시간 앞에서 슬퍼할 겨를이 없다.”(본문 중에서)
초가, 흙집, 굴뚝, 맷돌, 확독, 아궁이, 부뚜막, 다랑논, 물레방아…. 70~80년만 해도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사물이나 풍경들이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자취를 감췄다. 민속마을이나 박물관에나 가야 겨우 볼 수 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시간이 주는 변화를 막아내기는 힘들다. 오늘에는 사라져버렸지만, 예전에는 분명 그 자리에 익숙한 사물과 풍경들이 있었다.
15년에 걸쳐 발로 찾아낸 옛 풍경에 대한 기록이 책으로 묶여졌다. 제목부터 향수를 자극하는 ‘사라져 가는 풍경들’은 멈춰진 시간의 발자취를 더듬어 가는 여정이다. 시인이자 여행가인 이용한 작가는 그동안 고양이 에세이를 썼다. ‘고양이 작가’로 불리는 그는 지금까지 ‘사라져가는 오지마을을 찾아서’, ‘꾼’, ‘장이’, ‘옛집기행’ 등 다수의 문화기행서를 출간했다.
책은 모두 4장으로 구성됐다.
첫 장에는 ‘옛집 풍경’이 나온다. 초가와 샛집, 굴너와집, 흙집 등이 다뤄진다. 오막살이, 초가삼간이라는 말처럼 초가는 화려한 집은 아니다. 흙과 나무, 짚으로 지었는데 우리 민족과는 떼래야 뗄 수 없는 재료들이다. “신성함을 지붕에 올림으로써” 하늘을 표현한 집이 바로 초가다. 그러나 초가를 없애면서 서민의 주거문화와 풍속도 사라졌다.
고추를 빻고 콩을 갈던 맷돌과 확독에 대한 단상도 눈길을 끈다. 요즘처럼 분쇄기나 믹서기가 없던 시절, 어머니들은 번거로웠던 맷돌질을 해야 했다. 맷돌과 절구의 중간 형태인 확독은 주로 양념을 찧을 때 사용했다.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맷돌과 확독이 환기하는 시골의 추억은 아련함을 준다.
2장 ‘그 밖의 풍경들’에서는 옛집에서 만나는 세간들을 비롯해 닭의 보금자리인 닭둥우리, 방안을 밝혔던 등잔, 설날에 걸어두었던 복조리 등을 볼 수 있다.
사랑방 노인들이 삼았던 짚신은, 오래 전부터 서민들의 신발 역할을 톡톡히 했다. 옛날 농촌에서 짚신을 삼았는데 농한기 때는 가능한 한 많은 짚신을 삼아 놓아야 했다. 이제는 유물이 돼버린 등잔에 대한 이야기도 정겹다. 일반적인 등잔은 외심지를 썼지만, 불을 밝히기 위해선 쌍심지를 켰다. ‘눈에 쌍심지를 켠다’는 말이 예에서 연유했다는 점이 흥미롭다.
전통을 만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부분도 있다. 3장 ‘명맥을 잇는 사람들’에서는 떡, 한지, 쌀엿, 전통옹기에 삶을 바친 이들의 사연을 만난다. 번거롭고 일손이 많이 가지만 전통을 잇는 이들에게선 숭고함이 느껴진다.
마지막 장에서는 옛 풍습과 의식에 초점을 맞춘다. 마을 안녕을 위해 행해졌던 집안 신,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당산제 등이 소개된다. 그러나 이젠 거의 사라지고 문헌 속에서나 찾을 수 있을 정도다.
책을 읽다보면 오늘의 성장과 속도, 소유에 매몰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 물론 시간은 지난 과거를 미화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미화와 기억해야 할 것은 분명 다르다. 오늘 우리가 발 딛고 선 자리는 얼마 전만해도 삶의 토대가 됐던 그리운 풍경과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을.
“레비-스트로스는 도시가 ‘인간의 가장 뛰어난 발명품’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그저 우리가 꿈꾸는 도시일뿐 오늘날 도시의 모습은 아니다. 자연을 향해 구불구불 이어지던 고샅길은 고속도로에 멸망했고, 산자락을 에둘렀던 다랑논은 공장에 패배했다. 커다란 나무는 베어졌으며 나무에 깃든 신성성도 함께 잘려 나갔다.”
<상상출판·1만55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시간이 주는 변화를 막아내기는 힘들다. 오늘에는 사라져버렸지만, 예전에는 분명 그 자리에 익숙한 사물과 풍경들이 있었다.
15년에 걸쳐 발로 찾아낸 옛 풍경에 대한 기록이 책으로 묶여졌다. 제목부터 향수를 자극하는 ‘사라져 가는 풍경들’은 멈춰진 시간의 발자취를 더듬어 가는 여정이다. 시인이자 여행가인 이용한 작가는 그동안 고양이 에세이를 썼다. ‘고양이 작가’로 불리는 그는 지금까지 ‘사라져가는 오지마을을 찾아서’, ‘꾼’, ‘장이’, ‘옛집기행’ 등 다수의 문화기행서를 출간했다.
 소달구지는 경운기가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짐과 곡물을 운반하고 때로는 교통수단으로까지 두 몫을 톡톡히 해냈다. <상상출판 제공> |
첫 장에는 ‘옛집 풍경’이 나온다. 초가와 샛집, 굴너와집, 흙집 등이 다뤄진다. 오막살이, 초가삼간이라는 말처럼 초가는 화려한 집은 아니다. 흙과 나무, 짚으로 지었는데 우리 민족과는 떼래야 뗄 수 없는 재료들이다. “신성함을 지붕에 올림으로써” 하늘을 표현한 집이 바로 초가다. 그러나 초가를 없애면서 서민의 주거문화와 풍속도 사라졌다.
고추를 빻고 콩을 갈던 맷돌과 확독에 대한 단상도 눈길을 끈다. 요즘처럼 분쇄기나 믹서기가 없던 시절, 어머니들은 번거로웠던 맷돌질을 해야 했다. 맷돌과 절구의 중간 형태인 확독은 주로 양념을 찧을 때 사용했다.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맷돌과 확독이 환기하는 시골의 추억은 아련함을 준다.
2장 ‘그 밖의 풍경들’에서는 옛집에서 만나는 세간들을 비롯해 닭의 보금자리인 닭둥우리, 방안을 밝혔던 등잔, 설날에 걸어두었던 복조리 등을 볼 수 있다.
사랑방 노인들이 삼았던 짚신은, 오래 전부터 서민들의 신발 역할을 톡톡히 했다. 옛날 농촌에서 짚신을 삼았는데 농한기 때는 가능한 한 많은 짚신을 삼아 놓아야 했다. 이제는 유물이 돼버린 등잔에 대한 이야기도 정겹다. 일반적인 등잔은 외심지를 썼지만, 불을 밝히기 위해선 쌍심지를 켰다. ‘눈에 쌍심지를 켠다’는 말이 예에서 연유했다는 점이 흥미롭다.
전통을 만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부분도 있다. 3장 ‘명맥을 잇는 사람들’에서는 떡, 한지, 쌀엿, 전통옹기에 삶을 바친 이들의 사연을 만난다. 번거롭고 일손이 많이 가지만 전통을 잇는 이들에게선 숭고함이 느껴진다.
마지막 장에서는 옛 풍습과 의식에 초점을 맞춘다. 마을 안녕을 위해 행해졌던 집안 신,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당산제 등이 소개된다. 그러나 이젠 거의 사라지고 문헌 속에서나 찾을 수 있을 정도다.
책을 읽다보면 오늘의 성장과 속도, 소유에 매몰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 물론 시간은 지난 과거를 미화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미화와 기억해야 할 것은 분명 다르다. 오늘 우리가 발 딛고 선 자리는 얼마 전만해도 삶의 토대가 됐던 그리운 풍경과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을.
“레비-스트로스는 도시가 ‘인간의 가장 뛰어난 발명품’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그저 우리가 꿈꾸는 도시일뿐 오늘날 도시의 모습은 아니다. 자연을 향해 구불구불 이어지던 고샅길은 고속도로에 멸망했고, 산자락을 에둘렀던 다랑논은 공장에 패배했다. 커다란 나무는 베어졌으며 나무에 깃든 신성성도 함께 잘려 나갔다.”
<상상출판·1만55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