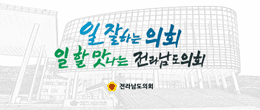‘고령 친화 도시’를 위한 지역 대학의 역할
 |
우리나라는 2019년 고령 인구 비율이 14.2%를 넘어서면서 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와 함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보다 다양한 정책 수요가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도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5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정하고 모든 시민들을 위한 지역 사회 통합 돌봄 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지역 차원에서 주택, 보건, 복지, 행정 서비스를 포괄한 포용적 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 같은 국가 정책은 2007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시한 고령 친화 도시와 궤(軌)를 같이 한다. 선진국의 고령 친화 도시는 모든 시민이 평생에 걸쳐 지역에서 신체·심리적으로 건강하고 안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과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살던 곳에서 노후 맞기)’를 지향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요양 시설보다 자신이 살아 온 생활 터전과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노후를 보내려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
2019년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 복지 포럼에 의하면, 부모 부양 책임에 대해 사회가 맡아야 한다는 응답이 2002년 19.7%에서 2018년 54.0%로 크게 증가했다. 향후 고령자 부양의 1차 책임이 가족에서 국가 및 사회로 옮겨 갈 것임을 짐작하게 해준다.
따라서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위한 사회적 대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저출산에 따른 급격한 학령 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 대학의 주도적인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이미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대학 기반형 은퇴 공동체(UBRCs ; University-Based Retirement communities)를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미국도 지난 2011년부터 대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대학 경영 패러다임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은 바 있으며, 1990년대부터 베이비 붐 세대의 활동적인 노후와 평생 교육을 위한 대학 기반형 은퇴 공동체를 발전시켰다. 노인 주거 환경과 대학 간의 연계성을 찾으며, 고령자에게 대학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개발 기준은 대학이 주변 지역의 노인들에게 다양한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부터 주거 생활을 지원하는 것까지 다양하다. 이때 무엇보다도 대학 관계자가 반드시 고령 공동체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미국 사회에서는 1990년대부터 20년 간 다양한 유형의 대학 기반형 은퇴 공동체가 전국 100개 이상의 지역대학에서 설립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오는 2030년에는 총 인구 대비 고령 인구가 약 24%를 넘어 초고령 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현재 많은 고령자들은 활발한 노후 생활과 함께 더욱 가치 있는 교육과 프로그램을 바라고 있다. 이 같은 시대 변화에 따라, 지역 대학에서도 새로운 고령 친화형 운영 모델 개발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대학 기반형 은퇴 공동체의 장점은 고령자들에게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지역대학 또한 부수적인 수입을 보장받는 윈윈(win-win) 방식이란 점이다. 대학 구성원과 노인들이 좋은 유대 관계를 맺음으로써 지역 사회와 지역 대학이 함께 발전할 수 있다. 다양한 교양 강좌와 문화 이벤트를 통해 지역 주민과 대학이 더욱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다. 지역 대학은 노인들에게 건강 관리 서비스와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한편 학생들의 실무 경험을 연계할 수 있다.
노인 인구가 많은 광주·전남 지역 대학도 한국형 UBRCs 개발을 통해 시대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비하고 지역 사회와 함께 공동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창출해내기를 기대한다.
문재인 정부도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5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정하고 모든 시민들을 위한 지역 사회 통합 돌봄 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지역 차원에서 주택, 보건, 복지, 행정 서비스를 포괄한 포용적 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위한 사회적 대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저출산에 따른 급격한 학령 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 대학의 주도적인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이미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대학 기반형 은퇴 공동체(UBRCs ; University-Based Retirement communities)를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미국도 지난 2011년부터 대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대학 경영 패러다임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은 바 있으며, 1990년대부터 베이비 붐 세대의 활동적인 노후와 평생 교육을 위한 대학 기반형 은퇴 공동체를 발전시켰다. 노인 주거 환경과 대학 간의 연계성을 찾으며, 고령자에게 대학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개발 기준은 대학이 주변 지역의 노인들에게 다양한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부터 주거 생활을 지원하는 것까지 다양하다. 이때 무엇보다도 대학 관계자가 반드시 고령 공동체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미국 사회에서는 1990년대부터 20년 간 다양한 유형의 대학 기반형 은퇴 공동체가 전국 100개 이상의 지역대학에서 설립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오는 2030년에는 총 인구 대비 고령 인구가 약 24%를 넘어 초고령 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현재 많은 고령자들은 활발한 노후 생활과 함께 더욱 가치 있는 교육과 프로그램을 바라고 있다. 이 같은 시대 변화에 따라, 지역 대학에서도 새로운 고령 친화형 운영 모델 개발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대학 기반형 은퇴 공동체의 장점은 고령자들에게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지역대학 또한 부수적인 수입을 보장받는 윈윈(win-win) 방식이란 점이다. 대학 구성원과 노인들이 좋은 유대 관계를 맺음으로써 지역 사회와 지역 대학이 함께 발전할 수 있다. 다양한 교양 강좌와 문화 이벤트를 통해 지역 주민과 대학이 더욱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다. 지역 대학은 노인들에게 건강 관리 서비스와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한편 학생들의 실무 경험을 연계할 수 있다.
노인 인구가 많은 광주·전남 지역 대학도 한국형 UBRCs 개발을 통해 시대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비하고 지역 사회와 함께 공동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창출해내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