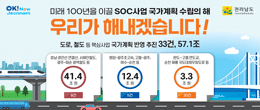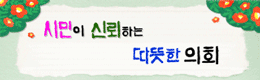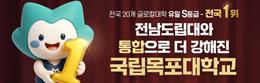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이해영 연출 방효린·이하늬 주연
여배우 착취·복잡한 정치상황 등
80년대 충무로 어두운 이면 지적
 넷플릭스 시리즈 ‘애마’에서 신인 배우 주애가 ‘애마부인’의 한 장면을 말 위에서 연기하고 있다. <넷플릭스 제공> |
 |
그러나 화려한 흥행의 이면에는 여배우들의 희생과 착취, 성을 둘러싼 사회적 왜곡이 자리하고 있었다.
‘애마부인’은 당시 사회에서 금기시되던 여성의 성적 욕망을 은막 위로 끌어올린 첫 사례였다. 이전까지 한국 영화는 신파극이 주류를 이뤘고, 성을 다룬 영화는 대체로 산업화 과정에서 희생되는 성매매 여성의 서사를 담은 ‘호스티스물’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애마부인’은 기혼 여성의 성적 욕망을 다루며 여성을 성의 주체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애마’는 바로 이 지점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극중 톱스타 정희란(이하늬 분)은 계약의 덫에 걸려 원치 않는 성인영화에 출연하게 되고, 신예 신주애(방효린 분)는 생존을 위해 욕망의 아이콘 ‘애마’가 된다. 작품 초반 두 여성은 서로 적대하지만, 곧 착취의 구조를 공유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드라마가 흥미로운 대목은 당시 영화 산업의 어두운 구조를 폭로한다는 점이다. 제작사 대표 구중호(진선규 분)는 흥행을 위해 배우를 압박하고, 심의 당국과 권력자에게 줄을 대며 작품을 통제한다. 신인 감독 곽인우(조현철 분)는 예술적 비전을 꿈꾸지만 외압에 번번이 무너진다.
이는 실제 충무로의 풍경과 겹쳐진다. 1980년대 성인영화 시장은 수십 편의 ‘애마 시리즈’를 양산하며 산업적 호황을 누렸지만, 그 번영은 여성 배우들의 몸을 담보로 세워진 것이었다. 욕망은 상품화되었으되 욕망의 주체는 부재했다. ‘애마부인’은 여성의 욕망을 표방하는 듯했으나 실상은 남성적 시선이 만든 판타지에 지나지 않았다.
‘애마’는 그 판타지를 뒤집는다. 여성 캐릭터들은 단순히 성적 대상이 아니라 착취 구조에 맞서 자기 목소리를 찾아가는 주체로 그려진다. 마지막 화에서 희란과 주애가 화려한 복장을 입고 말을 타고 광화문을 질주하는 장면은 과거 소비적 이미지에 대한 통렬한 반전이다.
아쉬움도 있다. ‘애마’는 초반부 풍자적 코미디와 빠른 리듬으로 흥미를 끌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분위기가 무거워지며 호흡이 처진다. 인물 간 갈등이 다층적으로 쌓이기보다 메시지를 직접 설파하는 쪽으로 기울면서 드라마적 긴장감이 약해진다.
구중호로 대표되는 악역 캐릭터는 지나치게 평면적으로 묘사됐다. 권력과 자본을 등에 업은 제작자이지만 욕망과 두려움, 모순 같은 입체적 면모는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여성 캐릭터들의 성장은 돋보이나 남성 권력자의 서사가 단선적이어서 긴장과 대립 구도가 단순화된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