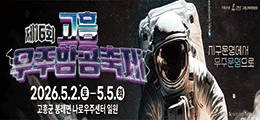취사·청소·외출 동행 … 가정 넘어 골목·동네와 ‘관계 복원’
광주다움 통합돌봄 ‘K복지’ 브랜드 되다 <2> 광주형 생활돌봄
신청주의 넘어 발굴주의
가정 방문해 풀코스 서비스
사회복지 제도의 빈 틈
광주시 자체 서비스로 메워
신청주의 넘어 발굴주의
가정 방문해 풀코스 서비스
사회복지 제도의 빈 틈
광주시 자체 서비스로 메워
 박일순 요양보호사가 지난 5일 광주 남구 정승환씨 집을 방문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박 요양호보사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일시재가)를 통해 정씨를 돕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날만 기다립니다. 혼자선 아무것도 못 해요.”
지난 5일 광주시 남구에 있는 허름한 빌라건물 2층. 박일순 요양보호사가 정승환(65)씨 집의 창문을 모두 열면서 일을 시작했다. 쓰레기봉투를 묶고 젖은 걸레를 헹구는 등 집안을 구석구석을 챙겼다.
뇌졸중으로 왼쪽 신체가 마비된 정씨는 “가족과 오래전에 인연이 끊겼다. 경제활동도 못 한다”면서 “사람이 와서 창문을 열고, 쓰레기만 치워줘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고 했다.
박 보호사가 정씨 집을 방문하는 건 광주시가 제공하는 통합돌봄(일시재가 서비스) 덕분이다. 가정을 방문해 취사·청소·세탁과 말벗, 근거리 외출 동행까지 생활 전반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광주시 통합돌봄은 ‘한 번 신청, 끝까지 연계’가 원칙이다. 통합돌봄의 진가를 체험한 정씨가 소개한 지인도 같은 보살핌을 받고 있다.
생활돌봄의 핵심은 ‘신청주의를 넘어 발굴주의’다. 이웃 신고, 동행정복지센터 의무방문, 돌봄콜 접수로 들어온 신호를 현장방문으로 곧장 확인하고, 같은 주간에 최소 두 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묶어 제공한다.
동 사례관리 담당자가 보호·지원 계획을 세우고, 구 통합돌봄 담당자와 민간 제공기관이 1대1로 묶여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사회복지 제도의 빈틈은 광주시 자체 서비스로 메우는 구조다. 중위소득 90% 이하는 전액 지원, 연 150만원 한도 내에서 안전생활환경·대청소·방역·케어안심주택까지 ‘생활돌봄 풀코스’를 제공한다.
통합돌봄은 다양한 계층을 돌보는 사회안전망으로 자리잡았다.
광주에 사는 중증 섬유근육통과 공황장애, 우울을 앓던 중년 1인 가구는 봄철 낙상 이후 고관절 골절까지 겹쳐 외출을 끊었다.
제주에 사는 형제가 광주시에 신청하자 지난 7월부터 식사지원이 시작됐고, 대청소와 방역, 안전생활환경 개선이 이어졌다.
한 어르신 부부는 노환에 몸을 움직이기 힘들었지만 병원 동행과 식사지원을 묶은 통합지원으로 활력을 되찾았다고 한다.
식사 지원은 생활돌봄의 또 다른 축이다. 남구에 사는 하영자(113)할머니는 광주시 최고령 ‘식사지원’ 대상자다. 하 할머니에게 제공된 메뉴는 소고기야채죽, 애호박새우볶음, 계란말이, 귤 3개, 연양갱, 두유 등 영양까지 챙긴 식단이었다.
통합돌봄 담당자는 “정해진 권고 양보다 더 담아 400ml 반찬통으로 보낸다. 9000원 한 끼에 조리·인건비·차량렌털·가가호호 배달비가 포함돼 있지만, 현장에선 ‘반찬 구성이 더 풍성해야 한다’는 요구도 많다”고 전했다.
통합돌봄은 서비스제공자와 수혜자의 관계에서 벗어난 인간관계 복원에 중점을 두고 시행되고 있다.
배달지원업체 담당자는 “대상자 성향을 아는 사람이 직접 ‘아버지~’ 하고 건네면 거칠던 말도 차분해진다. 단순 투입이 아니라 관계를 배달하는 일”이라고 했다. 광주형 생활돌봄이 ‘사람 대 사람’ 대면 배달을 기본으로 한 이유다.
동행지원은 병원·관공서 외출을 돕는 서비스다. 대상자의 생활력이 붙으면 횟수를 줄이고, 다른 서비스로 재배치한다.
안전생활환경은 연 150만원 한도에서 낙상예방 장치 등을 설치하고, 대청소는 연 1회, 방역·방충은 연 3회까지 지원한다. 필요 시 구에서 확보한 케어안심주택으로 단기간 이동해 집을 정돈하고 다시 ‘살던 곳’으로 복귀하는 회복 루트를 연다. AI 안부·ICT 안전센서는 무료로 상시 가동돼 고립 신호를 조기에 포착한다.
핵심은 ‘연계와 균형’이다. 광주시 생활돌봄은 동 사례관리, 구 담당부서, 민간 제공기관이 하나의 절차와 전산 기준으로 움직인다.
기존 제도를 최우선으로 연계하고, 남는 빈틈만 시비로 메우는 탓에 예산의 탄력 운용이 가능하다. 이 구조 덕분에 수혜자는 적시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현장에선 “연 150만원 한도로는 복잡한 가구를 충분히 받쳐주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는 사례회의로 추가 투입 여부를 결정하고, 수가·모니터링 기준은 지속 보완 중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생활돌봄은 비용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되(중위소득 90% 이하 전액), 대상자별로 가장 필요한 조합을 빠르게 묶어 투입하는 속도가 생명”이라며 “모니터링 교육과 수가·한도 개선을 병행해 현장 체감을 더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남진희 인턴기자 njinhee324@naver.com
지난 5일 광주시 남구에 있는 허름한 빌라건물 2층. 박일순 요양보호사가 정승환(65)씨 집의 창문을 모두 열면서 일을 시작했다. 쓰레기봉투를 묶고 젖은 걸레를 헹구는 등 집안을 구석구석을 챙겼다.
뇌졸중으로 왼쪽 신체가 마비된 정씨는 “가족과 오래전에 인연이 끊겼다. 경제활동도 못 한다”면서 “사람이 와서 창문을 열고, 쓰레기만 치워줘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고 했다.
광주시 통합돌봄은 ‘한 번 신청, 끝까지 연계’가 원칙이다. 통합돌봄의 진가를 체험한 정씨가 소개한 지인도 같은 보살핌을 받고 있다.
생활돌봄의 핵심은 ‘신청주의를 넘어 발굴주의’다. 이웃 신고, 동행정복지센터 의무방문, 돌봄콜 접수로 들어온 신호를 현장방문으로 곧장 확인하고, 같은 주간에 최소 두 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묶어 제공한다.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사회복지 제도의 빈틈은 광주시 자체 서비스로 메우는 구조다. 중위소득 90% 이하는 전액 지원, 연 150만원 한도 내에서 안전생활환경·대청소·방역·케어안심주택까지 ‘생활돌봄 풀코스’를 제공한다.
통합돌봄은 다양한 계층을 돌보는 사회안전망으로 자리잡았다.
광주에 사는 중증 섬유근육통과 공황장애, 우울을 앓던 중년 1인 가구는 봄철 낙상 이후 고관절 골절까지 겹쳐 외출을 끊었다.
제주에 사는 형제가 광주시에 신청하자 지난 7월부터 식사지원이 시작됐고, 대청소와 방역, 안전생활환경 개선이 이어졌다.
한 어르신 부부는 노환에 몸을 움직이기 힘들었지만 병원 동행과 식사지원을 묶은 통합지원으로 활력을 되찾았다고 한다.
식사 지원은 생활돌봄의 또 다른 축이다. 남구에 사는 하영자(113)할머니는 광주시 최고령 ‘식사지원’ 대상자다. 하 할머니에게 제공된 메뉴는 소고기야채죽, 애호박새우볶음, 계란말이, 귤 3개, 연양갱, 두유 등 영양까지 챙긴 식단이었다.
통합돌봄 담당자는 “정해진 권고 양보다 더 담아 400ml 반찬통으로 보낸다. 9000원 한 끼에 조리·인건비·차량렌털·가가호호 배달비가 포함돼 있지만, 현장에선 ‘반찬 구성이 더 풍성해야 한다’는 요구도 많다”고 전했다.
통합돌봄은 서비스제공자와 수혜자의 관계에서 벗어난 인간관계 복원에 중점을 두고 시행되고 있다.
배달지원업체 담당자는 “대상자 성향을 아는 사람이 직접 ‘아버지~’ 하고 건네면 거칠던 말도 차분해진다. 단순 투입이 아니라 관계를 배달하는 일”이라고 했다. 광주형 생활돌봄이 ‘사람 대 사람’ 대면 배달을 기본으로 한 이유다.
동행지원은 병원·관공서 외출을 돕는 서비스다. 대상자의 생활력이 붙으면 횟수를 줄이고, 다른 서비스로 재배치한다.
안전생활환경은 연 150만원 한도에서 낙상예방 장치 등을 설치하고, 대청소는 연 1회, 방역·방충은 연 3회까지 지원한다. 필요 시 구에서 확보한 케어안심주택으로 단기간 이동해 집을 정돈하고 다시 ‘살던 곳’으로 복귀하는 회복 루트를 연다. AI 안부·ICT 안전센서는 무료로 상시 가동돼 고립 신호를 조기에 포착한다.
핵심은 ‘연계와 균형’이다. 광주시 생활돌봄은 동 사례관리, 구 담당부서, 민간 제공기관이 하나의 절차와 전산 기준으로 움직인다.
기존 제도를 최우선으로 연계하고, 남는 빈틈만 시비로 메우는 탓에 예산의 탄력 운용이 가능하다. 이 구조 덕분에 수혜자는 적시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현장에선 “연 150만원 한도로는 복잡한 가구를 충분히 받쳐주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는 사례회의로 추가 투입 여부를 결정하고, 수가·모니터링 기준은 지속 보완 중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생활돌봄은 비용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되(중위소득 90% 이하 전액), 대상자별로 가장 필요한 조합을 빠르게 묶어 투입하는 속도가 생명”이라며 “모니터링 교육과 수가·한도 개선을 병행해 현장 체감을 더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남진희 인턴기자 njinhee3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