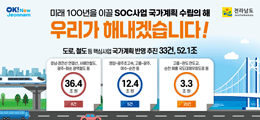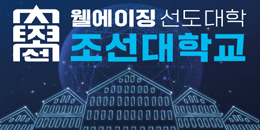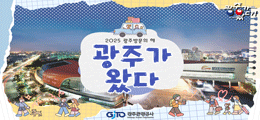[농산물품질관리사 김대성 기자의 ‘농사만사’] 논이 밭 되는 세상 이젠 뭘 심어야 하나
경지면적 감소 속 재배 품목도 다양…논·밭 활용도 고심할 때
 /클립아트코리아 |
요즘 논과 밭을 혼용하면서 그 구분이 쉽지는 않지만, 원칙적으로 이 둘의 구별법은 명확하다. 논은 답(畓) 또는 수전(水田)이라고도 한다. 바닥은 판판하며 둘레를 흙으로 두렁을 만들고, 관배수(灌排水)를 조절하기 위해 관개수로로부터 물이 흘러들어오는 곳에 취수(取水) 물고를, 물이 흘러나가는 곳에 배수(排水) 물고를 만든 땅으로 주로 벼를 재배하는 전통적인 형태의 농경지다.
논의 종류는 관개수의 배수상태에 따라서 건답(乾畓·마른논)과 습답(濕畓)으로 나누는데, 건답은 배수가 좋고 작토(作土)가 깊으며 투수성(透水性)도 비교적 양호해 벼의 생육에 이상적인 땅이다. 벼를 수확한 후 밭상태로 맥류 등 후작물을 재배하는데, 이를 답리작(畓裏作) 또는 이모작(二毛作)이라고 한다. 이에 반해 습답은 배수가 나빠 항상 물을 댄 상태로 있어 토양의 환원이 심하고 생산력도 낮은 ‘B급’ 농지인데 답리작을 할 수 없는 불편이 있다.
반면 밭은 논처럼 물을 채우지 않고 필요한 때에만 물을 대어서 작물을 심어 농사를 짓는 농경지를 일컫는 말이다. 한자로는 전(田)이라고 한다. 밭은 재배 곡식의 종류에 따라 구분되기도 하고, 토질이나 지리적 위치에 따라 이름이 달리 불리기도 한다.
굳이 따져보면 인류의 농사는 논이 아닌 밭과 함께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경작지의 최초는 밭이며, 그 기원은 논보다 훨씬 앞선다. 그 시기는 대략 신석기시대인 기원전 6500년경 즈음으로 추정한다. 또 우리나라에서의 밭의 형성은 화전(火田)을 초기 형태로 보며 이후 휴한전(休閑田), 숙전(熟田)의 단계로 발전한 것으로 본다.
이는 농경지면적의 변화로도 확인할 수 있다. 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밭 면적은 전통적으로 논보다 많았다. 일제강점기 이후 논 면적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밭의 비율이 줄어들었다. 그러다가 1980년대 후반부터 전체 경지면적은 지속해서 감소했지만, 밭의 비율은 서서히 높아졌다. 1996년에는 논의 경지면적이 120만 148㏊, 밭의 경지면적이 74만 5332㏊이었는데, 2019년에는 논이 82만 9778㏊, 밭이 75만 1179㏊를 차지하고 있어 밭의 전체 경지면적 비율이 39.5%에서 47.5%로 늘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경지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농경지가 2013년보다 약 20ha 줄어드는 등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논은 77만5640ha로 2021년(78만440ha)보다 0.6%(4800ha) 감소했다. 밭은 75만2597ha로 2021년(76만6277ha)보다 1.8%(1만3680ha) 줄었다.
경지면적에서 논과 밭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대에 따라 크게 다른데 전통적으로 전국을 전작지대(田作地帶), 답전혼작지대(畓田混作地帶), 답작지대(畓作地帶)로 구분했다. 전작지대는 제주도를 비롯해 대부분의 북한지역이 이에 포함되는데, 총 경지면적 중 논의 비율이 20% 이하인 곳이다. 이곳에서는 맥류·두류·잡곡·근채류 등 재배가 주를 이룬다. 답전혼작지대는 중부지역으로 황해도와 강원도 및 충청북도를 포함하는데 논의 비율이 전체 경지면적의 20~50%에 달하는 곳을 이른다. 답작지대는 경기도를 포함한 남부지역으로 논의 비율이 50~70%에 달하는 곳이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정부가 만성적인 쌀 공급과잉 해소를 통한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증가를 위해 올해 쌀 산업 구조개혁을 추진하기로 하고 주요 정책과제로 8만ha 벼 재배면적 감축을 골자로 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농업인 관련 단체별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목표 달성 여부, 추진방식 등을 두고 중앙정부 주도의 ‘일괄감축’이니 ‘의무적 감축’이니,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느니 이런저런 지적이 일면서 의견이 분분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벼 재배면적 감축과 이에 따른 논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합심해서 묘안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bigkim@kwangju.co.kr
반면 밭은 논처럼 물을 채우지 않고 필요한 때에만 물을 대어서 작물을 심어 농사를 짓는 농경지를 일컫는 말이다. 한자로는 전(田)이라고 한다. 밭은 재배 곡식의 종류에 따라 구분되기도 하고, 토질이나 지리적 위치에 따라 이름이 달리 불리기도 한다.
이는 농경지면적의 변화로도 확인할 수 있다. 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밭 면적은 전통적으로 논보다 많았다. 일제강점기 이후 논 면적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밭의 비율이 줄어들었다. 그러다가 1980년대 후반부터 전체 경지면적은 지속해서 감소했지만, 밭의 비율은 서서히 높아졌다. 1996년에는 논의 경지면적이 120만 148㏊, 밭의 경지면적이 74만 5332㏊이었는데, 2019년에는 논이 82만 9778㏊, 밭이 75만 1179㏊를 차지하고 있어 밭의 전체 경지면적 비율이 39.5%에서 47.5%로 늘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경지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농경지가 2013년보다 약 20ha 줄어드는 등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논은 77만5640ha로 2021년(78만440ha)보다 0.6%(4800ha) 감소했다. 밭은 75만2597ha로 2021년(76만6277ha)보다 1.8%(1만3680ha) 줄었다.
경지면적에서 논과 밭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대에 따라 크게 다른데 전통적으로 전국을 전작지대(田作地帶), 답전혼작지대(畓田混作地帶), 답작지대(畓作地帶)로 구분했다. 전작지대는 제주도를 비롯해 대부분의 북한지역이 이에 포함되는데, 총 경지면적 중 논의 비율이 20% 이하인 곳이다. 이곳에서는 맥류·두류·잡곡·근채류 등 재배가 주를 이룬다. 답전혼작지대는 중부지역으로 황해도와 강원도 및 충청북도를 포함하는데 논의 비율이 전체 경지면적의 20~50%에 달하는 곳을 이른다. 답작지대는 경기도를 포함한 남부지역으로 논의 비율이 50~70%에 달하는 곳이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정부가 만성적인 쌀 공급과잉 해소를 통한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증가를 위해 올해 쌀 산업 구조개혁을 추진하기로 하고 주요 정책과제로 8만ha 벼 재배면적 감축을 골자로 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농업인 관련 단체별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목표 달성 여부, 추진방식 등을 두고 중앙정부 주도의 ‘일괄감축’이니 ‘의무적 감축’이니,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느니 이런저런 지적이 일면서 의견이 분분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벼 재배면적 감축과 이에 따른 논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합심해서 묘안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big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