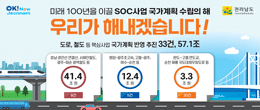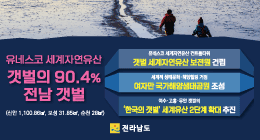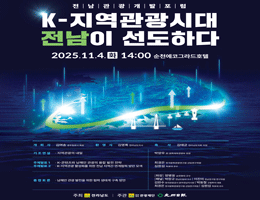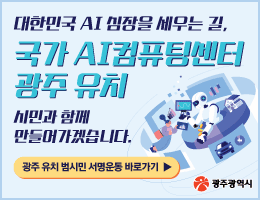옥수수의 변신은 무죄
[농산물품질관리사 김대성 기자의 ‘농사만사’]
찰옥수수 유행하다 사료용 전락…중요한 건 식량 안보
찰옥수수 유행하다 사료용 전락…중요한 건 식량 안보
 /클립아트코리아 |
세상에서 가장 많이 나는 곡물이 옥수수라는 것을 아는 이가 그리 많지 않다. 세계인의 주식인 밀이나 쌀을 먼저 떠올리겠지만, 옥수수보다는 생산량이 적다고 한다. 끼니 사이에 간식으로 주로 먹고 영화관에서 즐기는 팝콘의 주재료로 정도로 생각하기엔 서운한 면이 있다. 사람도 살기 힘든 척박한 곳에서도 잘 자라는 곡물이라는 점이 그 명성을 낳았겠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는 전 세계의 사람이나 가축을 먹여 살리는 중요한 작물임에 틀림없다.
옥수수에 대해 알려면 그 모태인 수수를 이해하는 게 먼저다. ‘옥 같은 수수’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생장 환경 등 여러 면에서 유사점을 보이기 때문이다. 수수, 옥수수, 사탕수수 등 우리가 흔히 접하는 수수류만도 3종이다. 모두 볏과에 속하는 식물인데, 씨앗이나 모종으로 심어 자라는 모습을 보면 옥수수와 수수를 구별할 수 없는 정도로 비슷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웬만한 눈썰미 아니면 70㎝ 이내로 자라기까지는 이들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단지 수수와 옥수수는 일년초인 데 반해, 사탕수수는 다년초라는 점에서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또 수수와 옥수수가 다른 부위도 활용하기는 하지만 주로 열매를 식용하는 반면, 사탕수수는 줄기를 으깨어 사탕즙을 만들어 흑설탕이나 이를 정제한 백설탕을 만드는데 이용한다는 점도 구별된다.
붉은 수숫대의 유래를 다룬 ‘햇님 달님’이라는 동화에도 나오는 수수는 벼목 볏과에 속하는 한해살이 식물로 북아프리카와 아시아가 원산지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전역에 걸쳐서 먹기 위해서 재배하는데, 발효시켜 고량주를 만들기도 한다. 식량으로서 품질은 보리·조에 비해 떨어지지만, 옥수수처럼 메마른 땅이나 습한 땅에도 잘 된다. 특히 콩밭의 콩 포기 사이에 섞어 심어 가꾸기도 하는 ‘알뜰한’ 작물이다.
옥수수의 고향도 수수와 마찬가지로 아메리카이다. 북부 안데스 또는 멕시코 일대를 그 원산지로 추정하는데,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란 덕분에 세계 곳곳에 급속히 확산할 수 있었다. 아메리카에서 들여왔지만, 아시아 사람의 눈에 띄어서 일찌감치 동아시아와 한반도에 자리를 잡은 작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에 축산업과 가공산업의 발달과 함께 옥수수의 알곡 수요량이 증가하면서 재배 면적도 증가했다. 하지만 양이 턱없이 부족해 대부분 수입하고 있다. 특히 식량으로 쓰이는 메옥수수와 달리 간식용으로 주로 이용되는 단옥수수는 1970년대 초에 미국에서 육성한 품종들이 도입돼 퍼졌다. 1970년대까지 끼니가 되는 메옥수수가 대부분을 차지하던 옥수수 농사는 1980년대를 지나면서 더욱 달고 차진 찰옥수수가 주를 이뤘다. 이어 2000년대 중반부터 찰옥수수 품종이 개발·보급되면서 재배 면적이 감소하긴 했지만, 텃밭 등에 재배하는 면적이 증가하면서 수요량 일부를 조달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지라 이제는 옥수수라 하면 간식용이나 식량용으로 쓰이는 단옥수수, 찰옥수수, 팝콘, 꼬마옥수수 등 식용 옥수수보다는 가축사료로 사용하는 사료용 옥수수와 식용유와 바이오 연료를 만드는 산업용 옥수수를 생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에 2023년부터 전략작물직불제 시행으로 재배하는 사료용 옥수수만도 2023년 기준 1만6000ha에 이른다.
농작물은 쓰임새와 수요에 따라 재배면적과 종자의 변화가 있기 마련이다. 식량용으로 주로 쓰이다가 간식용으로 전락 재배면적이 급격히 줄고, 다시 사료용 산업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생산을 늘리고 있는 옥수수의 천착을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또 이 작물의 생산량 감소와 수입 증가가 우리 농업에 미치는 파급력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이 점에서 중요한 것은 소소한 작물이라 할지라도 나라의 안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식량 작물의 중요성을 깨우치는 것이다. /bigkim@kwangju.co.kr
붉은 수숫대의 유래를 다룬 ‘햇님 달님’이라는 동화에도 나오는 수수는 벼목 볏과에 속하는 한해살이 식물로 북아프리카와 아시아가 원산지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전역에 걸쳐서 먹기 위해서 재배하는데, 발효시켜 고량주를 만들기도 한다. 식량으로서 품질은 보리·조에 비해 떨어지지만, 옥수수처럼 메마른 땅이나 습한 땅에도 잘 된다. 특히 콩밭의 콩 포기 사이에 섞어 심어 가꾸기도 하는 ‘알뜰한’ 작물이다.
옥수수의 고향도 수수와 마찬가지로 아메리카이다. 북부 안데스 또는 멕시코 일대를 그 원산지로 추정하는데,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란 덕분에 세계 곳곳에 급속히 확산할 수 있었다. 아메리카에서 들여왔지만, 아시아 사람의 눈에 띄어서 일찌감치 동아시아와 한반도에 자리를 잡은 작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에 축산업과 가공산업의 발달과 함께 옥수수의 알곡 수요량이 증가하면서 재배 면적도 증가했다. 하지만 양이 턱없이 부족해 대부분 수입하고 있다. 특히 식량으로 쓰이는 메옥수수와 달리 간식용으로 주로 이용되는 단옥수수는 1970년대 초에 미국에서 육성한 품종들이 도입돼 퍼졌다. 1970년대까지 끼니가 되는 메옥수수가 대부분을 차지하던 옥수수 농사는 1980년대를 지나면서 더욱 달고 차진 찰옥수수가 주를 이뤘다. 이어 2000년대 중반부터 찰옥수수 품종이 개발·보급되면서 재배 면적이 감소하긴 했지만, 텃밭 등에 재배하는 면적이 증가하면서 수요량 일부를 조달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지라 이제는 옥수수라 하면 간식용이나 식량용으로 쓰이는 단옥수수, 찰옥수수, 팝콘, 꼬마옥수수 등 식용 옥수수보다는 가축사료로 사용하는 사료용 옥수수와 식용유와 바이오 연료를 만드는 산업용 옥수수를 생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에 2023년부터 전략작물직불제 시행으로 재배하는 사료용 옥수수만도 2023년 기준 1만6000ha에 이른다.
농작물은 쓰임새와 수요에 따라 재배면적과 종자의 변화가 있기 마련이다. 식량용으로 주로 쓰이다가 간식용으로 전락 재배면적이 급격히 줄고, 다시 사료용 산업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생산을 늘리고 있는 옥수수의 천착을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또 이 작물의 생산량 감소와 수입 증가가 우리 농업에 미치는 파급력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이 점에서 중요한 것은 소소한 작물이라 할지라도 나라의 안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식량 작물의 중요성을 깨우치는 것이다. /big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