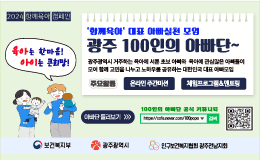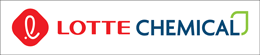국가중요어업유산 ‘전남 갯벌’… 팔딱팔딱 자연의 생명이 숨 쉬는 ‘생태계의 보고’
보성 뻘배·신안 천일염·완도 지주식 김양식·무안신안 낙지 맨손어업
남도의 어민들이 일궈온 ‘바다 밭’…미래의 유산으로 소중히 물려줘야
남도의 어민들이 일궈온 ‘바다 밭’…미래의 유산으로 소중히 물려줘야
 보성뻘배어업-갯펄 널배타는 아낙 |
해양수산부는 지역의 자연환경과 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된 유·무형 어업자산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국가중요어업유산’을 지정해 관리해오고 있다. 제1호 ‘제주 해녀어업’을 시작으로 제11호 ‘전남 신안군 흑산 홍어잡이어업’까지 11개를 지정했다. 이 가운데 전남지역 갯벌 관련어업으로는 ▲보성 뺄배어업(제2호) ▲신안 갯벌 천일염업(제4호) ▲완도 지주식 김 양식어업(제5호) ▲무안·신안 갯벌낙지 맨손어업(제6호)이 지정됐다.
◇ 국가 중요어업유산 제2호= 보성 뻘배어업(2015년 12월 지정)
벌교는 겨울철 별미인 꼬막으로 유명하다. 꼬막 주산지인 벌교 앞바다 여자만(汝子灣)은 오염되지 않은 청정 갯벌인데다 영양분이 풍부하고 찰진 뻘로 이뤄져 꼬막 서식의 최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앞서 보성·벌교 꼬막은 지난 2009년 지리적 표시 수산물 제 1호로 지정됐다.
여자만 갯벌은 모래가 섞이지 않은 진흙 뻘이기 때문에 한발만 내디뎌도 푹 빠져버려 자칫 옴짝달싹 못하게 된다. 이러한 제약조건을 해소하고 갯벌에 직접 들어가 꼬막을 잡기 위해 어민들이 창안한 어업활동 이동수단이 바로 뻘배이다. 뻘배 뒷부분에 한쪽 무릎을 꿇은 채 반대 발로 뻘을 밀어내며 전진한다. 꼬막 채취 작업을 마친 후에는 뻘배에 꼬막을 싣고 갯골을 따라 뭍으로 나온다. 명칭은 뻘배 외에도 뻘차, 널, 널매, 널배 등 다양하게 불렸다.
조선대 대학원 정재훈 박사학위 논문 ‘국가 중요어업유산의 브랜드화를 통한 관광활성화 방안-보성 뻘배어업을 중심으로’(2020년)에 따르면 뻘배는 길이 2.7m, 너비 30㎝, 두께 2.4㎝ 규모. 뻘배 제작에는 소나무와 나왕, 삼나무가 주로 사용됐다. 뻘배 제작과정은 통나무 켜기→바닷물 침수→나뭇결 구분→이망 구부리기→중심대 넣기→부착물 달기 순으로 진행됐다. 뒤틀림을 막기 위해 15일 정도 갯골에 담가 두는 과정과 갯벌에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망(뻘배 앞부분)을 15도 정도 구부리는 공정이 눈에 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2015년 12월 뻘배를 이용해 꼬막을 잡는 어업, ‘뻘배어업’을 ‘국가 중요어업유산 제2호’로 등재했다. 대상지역은 보성군 벌교읍 장암리 일대(35㎢).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뻘배’를 비롯한 갯벌 어업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
◇ 국가 중요어업유산 제4호= 신안 갯벌 천일염업(2016년 10월 지정)
함민복 시인은 산문집 ‘눈물은 왜 짠가’(2014년)에서 소금에 대해 “달이 밀어준 물을 태양이 바짝 말린 물의 사리, 물의 뼈, 바닷물의 정신, 소금. 죽음처럼 썩지 않는.”이라고 했다. 또 바닷가에 살면서 만났던 ‘수직과 수평의 조화로운 결정체’를 들며 “달의 힘이 수평으로 끌어준 물을 태양이 수직의 힘으로 건조시켜 줄 때 탄생하는 소금이 그 결정체”라고 말한다.
신안 천일염업은 바닷물을 갯벌에 조성한 염전으로 끌어들여 농축시킨 후 햇볕과 바람을 이용한 자연방식으로 수분만 증발시켜 천일염을 생산하는 전통 어법이다. 이 과정에서 함수(짠물) 제조기술과 소금내기, 체렴 방식(수문을 열고 바닷물을 건조해 소금판 위에 소금을 모으는 작업) 등 다양한 노하우가 필요하다. 대상지역은 신안군 천일염전 일대(29.7㎢). 2008년에는 천일염이 광물에서 식재료로 분류돼 식품가공에 활용함으로써 천일염 산업화의 전기(轉機)를 맞았다.
신안은 천일염 주산지이다. 국내 천일염 생산량의 80% 가량을 차지한다. 증도에 자리한 태평염전은 60여 년 전인 1953년부터 천일염을 생산해 오고 있다. 매년 4월, 좋은 품질의 천일염을 무탈하게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염원하는 천일염 채염식을 갖고 10월까지 천일염 생산을 한다. 문화재청은 지난 2007년에 태평염전을 근대문화유산 360호, 소금박물관(석조 소금창고)을 근대문화유산 361호로 각각 등록했다.
비금도 대동염전은 1948년 주민들(450 가구) 스스로 대동염전 조합을 결성, 천일염 생산에 나섰다. 해방 전 이북 천일염전에서 일하다 귀향한 박삼만 씨의 기술을 토대로 손봉훈 씨가 주도해 천일염 생산에 성공했다. 특히 ‘제염 기술원 양성소’를 설치해 염전 기술자를 양성, 각 지역에 천일염전 개발과 생산기술을 보급하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연구결과 신안 천일염은 프랑스 게랑드 염습지에서 생산되는 ‘게랑드 소금’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품질을 자랑한다.
◇ 국가 중요어업유산 제5호= 완도 지주식 김양식어업(2017년 12월 지정)
현재 한국산 김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K푸드’ 수출 1위 품목, ‘식품업계의 반도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을 양식해서 먹을 수 있게 된 때는 38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640년(조선 인조 18년)께 섬진강물과 남해가 만나는 광양 태인도에서 김여익(1606~1660) 공이 최초로 김 양식법을 창안했다고 알려져 있다. 갯벌에 소나무와 밤나무 가지를 꽂아서 김을 양식하는 ‘섶꽂이 방식’으로 첫 김 양식을 시도했다. 차츰 갯벌에 말목을 박아 김을 양식하는 지주식(支柱式) 방식으로 발전했다. 현재 김 양식 어가들은 깊은 바다에 부표를 띄우고 김발을 매달아 양식하는 ‘부류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지주식 김 양식은 갯벌에 지주목을 세워 밀물 때 포자가 부착된 대나무 발이나 그물이 바닷물에 잠기고, 썰물 때 자연스럽게 노출되도록 하는 친환경적이고 전통적인 방식이다.
완도는 넓은 갯벌과 얕은 수심, 큰 조수간만 차 등 김을 양식할 수 있는 천혜의 환경조건을 갖추고 있다. 100여 년 전부터 완도 조약도(약산면)와 고금면 일대에서 김 양식이 시작됐다. 완도 지주식 김 양식 전성기는 1930년대~1970년대. 1930년대에는 완도 김 양식어가가 전국의 34.9%를 차지할 정도였다. 이후 완도 섬주변 연안 양식어장이 포화상태가 되자 완도 어민들이 새로운 양식어장을 찾아 나서면서 전국 각지로 김 양식 어장이 확대됐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 12월 ‘완도 지주식 김 양식어업’을 국가 중요어업유산 제 5호로 지정했다. 고금면 3개 마을(청학리, 가교리, 봉명리) 24어가가 358㏊에서 전통 지주식 김 양식을 하고 있다. 채묘작업(9~10월)을 시작으로 지주에 김발 넣기→김발 높이 조절(11월)→김 채취(12~3월) 과정을 거친다. 고금면 청학동 청용리에서 재래식으로 나무틀(고데)을 이용해 김을 뜨고, 햇볕에 말리는 과정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국가 중요어업유산 제6호= 무안·신안 갯벌낙지 맨손어업(2018년 11월 지정)
무안과 신안에 살아왔던 조상들은 예로부터 갯벌에 사는 낙지의 습성과 생태를 연구해 맨손으로 더 쉽고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 사용했는데 ‘팔낙지’와 ‘가래낙지’, ‘묻음낙지’가 맨손어업에 해당된다.
맨손어업 중 가장 오래된 방식인 ‘팔낙지’는 눈과 손의 감각에만 의존해서 잡는 기술이다. 낙지 숨구멍인 ‘부럿’을 맨손으로 퍼 올려 손을 집어넣은 다음 도망가는 낙지를 잡아 올린다. ‘가래 낙지’ 어업은 가래삽(일반 삽보다 작고 끝이 뾰족해 재빨리 펄을 퍼내기 쉬워 많이 사용됐던 도구)이나 호미를 이용해서 잡는 방식이다. ‘묻음 낙지’ 어업은 부럿 주위에 둔덕을 만든 다음 숨을 쉬러 나온 낙지를 잡는 방식이다. 이 밖에 ‘횃불낙지’ 잡이는 야행성인 낙지가 갯벌 위로 올라와 활동하는 시간을 노린 것으로, 주로 봄과 가을에 많이 행해졌다.
무안·신안에서는 낙지의 산란장인 갯벌을 보전하기 위해 마을 지선어장 관리와 마을공동체 유지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낙지 생태계 보전에 필요한 교육·홍보활동 등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글= 송기동·이보람 기자
/사진= 나명주 기자, 보성·신안·완도군 제공
벌교는 겨울철 별미인 꼬막으로 유명하다. 꼬막 주산지인 벌교 앞바다 여자만(汝子灣)은 오염되지 않은 청정 갯벌인데다 영양분이 풍부하고 찰진 뻘로 이뤄져 꼬막 서식의 최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앞서 보성·벌교 꼬막은 지난 2009년 지리적 표시 수산물 제 1호로 지정됐다.
여자만 갯벌은 모래가 섞이지 않은 진흙 뻘이기 때문에 한발만 내디뎌도 푹 빠져버려 자칫 옴짝달싹 못하게 된다. 이러한 제약조건을 해소하고 갯벌에 직접 들어가 꼬막을 잡기 위해 어민들이 창안한 어업활동 이동수단이 바로 뻘배이다. 뻘배 뒷부분에 한쪽 무릎을 꿇은 채 반대 발로 뻘을 밀어내며 전진한다. 꼬막 채취 작업을 마친 후에는 뻘배에 꼬막을 싣고 갯골을 따라 뭍으로 나온다. 명칭은 뻘배 외에도 뻘차, 널, 널매, 널배 등 다양하게 불렸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2015년 12월 뻘배를 이용해 꼬막을 잡는 어업, ‘뻘배어업’을 ‘국가 중요어업유산 제2호’로 등재했다. 대상지역은 보성군 벌교읍 장암리 일대(35㎢).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뻘배’를 비롯한 갯벌 어업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
 신안갯벌천일염업-대성염전 |
함민복 시인은 산문집 ‘눈물은 왜 짠가’(2014년)에서 소금에 대해 “달이 밀어준 물을 태양이 바짝 말린 물의 사리, 물의 뼈, 바닷물의 정신, 소금. 죽음처럼 썩지 않는.”이라고 했다. 또 바닷가에 살면서 만났던 ‘수직과 수평의 조화로운 결정체’를 들며 “달의 힘이 수평으로 끌어준 물을 태양이 수직의 힘으로 건조시켜 줄 때 탄생하는 소금이 그 결정체”라고 말한다.
신안 천일염업은 바닷물을 갯벌에 조성한 염전으로 끌어들여 농축시킨 후 햇볕과 바람을 이용한 자연방식으로 수분만 증발시켜 천일염을 생산하는 전통 어법이다. 이 과정에서 함수(짠물) 제조기술과 소금내기, 체렴 방식(수문을 열고 바닷물을 건조해 소금판 위에 소금을 모으는 작업) 등 다양한 노하우가 필요하다. 대상지역은 신안군 천일염전 일대(29.7㎢). 2008년에는 천일염이 광물에서 식재료로 분류돼 식품가공에 활용함으로써 천일염 산업화의 전기(轉機)를 맞았다.
신안은 천일염 주산지이다. 국내 천일염 생산량의 80% 가량을 차지한다. 증도에 자리한 태평염전은 60여 년 전인 1953년부터 천일염을 생산해 오고 있다. 매년 4월, 좋은 품질의 천일염을 무탈하게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염원하는 천일염 채염식을 갖고 10월까지 천일염 생산을 한다. 문화재청은 지난 2007년에 태평염전을 근대문화유산 360호, 소금박물관(석조 소금창고)을 근대문화유산 361호로 각각 등록했다.
비금도 대동염전은 1948년 주민들(450 가구) 스스로 대동염전 조합을 결성, 천일염 생산에 나섰다. 해방 전 이북 천일염전에서 일하다 귀향한 박삼만 씨의 기술을 토대로 손봉훈 씨가 주도해 천일염 생산에 성공했다. 특히 ‘제염 기술원 양성소’를 설치해 염전 기술자를 양성, 각 지역에 천일염전 개발과 생산기술을 보급하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연구결과 신안 천일염은 프랑스 게랑드 염습지에서 생산되는 ‘게랑드 소금’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품질을 자랑한다.
 완도군 고금면 가교리 지주식 김양식. |
현재 한국산 김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K푸드’ 수출 1위 품목, ‘식품업계의 반도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을 양식해서 먹을 수 있게 된 때는 38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640년(조선 인조 18년)께 섬진강물과 남해가 만나는 광양 태인도에서 김여익(1606~1660) 공이 최초로 김 양식법을 창안했다고 알려져 있다. 갯벌에 소나무와 밤나무 가지를 꽂아서 김을 양식하는 ‘섶꽂이 방식’으로 첫 김 양식을 시도했다. 차츰 갯벌에 말목을 박아 김을 양식하는 지주식(支柱式) 방식으로 발전했다. 현재 김 양식 어가들은 깊은 바다에 부표를 띄우고 김발을 매달아 양식하는 ‘부류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지주식 김 양식은 갯벌에 지주목을 세워 밀물 때 포자가 부착된 대나무 발이나 그물이 바닷물에 잠기고, 썰물 때 자연스럽게 노출되도록 하는 친환경적이고 전통적인 방식이다.
완도는 넓은 갯벌과 얕은 수심, 큰 조수간만 차 등 김을 양식할 수 있는 천혜의 환경조건을 갖추고 있다. 100여 년 전부터 완도 조약도(약산면)와 고금면 일대에서 김 양식이 시작됐다. 완도 지주식 김 양식 전성기는 1930년대~1970년대. 1930년대에는 완도 김 양식어가가 전국의 34.9%를 차지할 정도였다. 이후 완도 섬주변 연안 양식어장이 포화상태가 되자 완도 어민들이 새로운 양식어장을 찾아 나서면서 전국 각지로 김 양식 어장이 확대됐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 12월 ‘완도 지주식 김 양식어업’을 국가 중요어업유산 제 5호로 지정했다. 고금면 3개 마을(청학리, 가교리, 봉명리) 24어가가 358㏊에서 전통 지주식 김 양식을 하고 있다. 채묘작업(9~10월)을 시작으로 지주에 김발 넣기→김발 높이 조절(11월)→김 채취(12~3월) 과정을 거친다. 고금면 청학동 청용리에서 재래식으로 나무틀(고데)을 이용해 김을 뜨고, 햇볕에 말리는 과정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갯벌낙지맨손어업 |
무안과 신안에 살아왔던 조상들은 예로부터 갯벌에 사는 낙지의 습성과 생태를 연구해 맨손으로 더 쉽고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 사용했는데 ‘팔낙지’와 ‘가래낙지’, ‘묻음낙지’가 맨손어업에 해당된다.
맨손어업 중 가장 오래된 방식인 ‘팔낙지’는 눈과 손의 감각에만 의존해서 잡는 기술이다. 낙지 숨구멍인 ‘부럿’을 맨손으로 퍼 올려 손을 집어넣은 다음 도망가는 낙지를 잡아 올린다. ‘가래 낙지’ 어업은 가래삽(일반 삽보다 작고 끝이 뾰족해 재빨리 펄을 퍼내기 쉬워 많이 사용됐던 도구)이나 호미를 이용해서 잡는 방식이다. ‘묻음 낙지’ 어업은 부럿 주위에 둔덕을 만든 다음 숨을 쉬러 나온 낙지를 잡는 방식이다. 이 밖에 ‘횃불낙지’ 잡이는 야행성인 낙지가 갯벌 위로 올라와 활동하는 시간을 노린 것으로, 주로 봄과 가을에 많이 행해졌다.
무안·신안에서는 낙지의 산란장인 갯벌을 보전하기 위해 마을 지선어장 관리와 마을공동체 유지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낙지 생태계 보전에 필요한 교육·홍보활동 등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글= 송기동·이보람 기자
/사진= 나명주 기자, 보성·신안·완도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