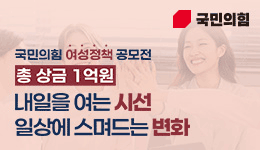‘동양건축 최고 걸작’ 무량수전 배흘림기둥과 마주하다
<5> 영주 부석사
전설과 연계 ‘뜬 돌’의미 ‘부석’
의상대사 창건 화엄종의 본찰
범종루·안양루 등 조형미 일품
석등·소조여래좌상등 국보 보존
전설과 연계 ‘뜬 돌’의미 ‘부석’
의상대사 창건 화엄종의 본찰
범종루·안양루 등 조형미 일품
석등·소조여래좌상등 국보 보존
 676년(신라 문무왕 16) 의상대사가 창건한 영주 부석사는 아름다운 경관만큼이나 사적 가치가 높은 유물이 많다. |
때는 약 670년 무렵. 당나라로 유학을 떠난 의상이 산둥성 등주에 도착한 즈음이었다. 어느 신도의 집에 잠시 유숙을 하게 되었는데 그 집의 딸 선묘(善妙)라는 처자가 그만 의상에 연모의 정을 품는다. 스님의 신분이었기에 의상은 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처자의 마음을 매정하게 거절할 수는 없었다. 의상은 처자의 마음을 감화시키고자 애쓴다. 그러면서 돌아가는 길에 다시 들르겠다는 약조를 한다.
처자는 서안 종남산으로 떠난 의상을 위해 기도를 드린다. 의상은 지상사 지엄대사를 차아가 화엄학을 공부한다. 그러나 얼마 후 신라로 급히 귀국해야 할 상황에 처한다. 당시 당나라에는 문무왕의 동생 김인문이 볼모로 잡혀와 있었다. 김인문은 의상에게 당나라가 곧 신라를 침공할지 모른다는 정보를 알려준다. 급히 귀국을 서두르던 의상은 뒤늦게 선묘 처자와의 약속을 떠올린다. 의상은 다음에 들르겠다는 약속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고국으로 향하는 배에 오른다.
오매불망 의상을 기다리던 선묘 처자는 포교에 도움이 되는 예물이라도 전달하려 급히 등주 부두로 나온다. 그러나 배는 이미 출항하고 난 뒤였다. 의상을 그냥 보낼 수 없었던 처자는 바다에 뛰어들었고, 이내 용(龍)으로 변한다. 의상이 화엄의 가르침을 펼 수 있도록 호위한다. 그러나 의상이 태백산 자락으로 돌아오자 도둑과 이교의 무리가 이미 진을 치고 있었다. 용은 때마침 부근에 있던 큰 바위를 공중에 띄워 외도의 무리를 쫓아낸다. 그렇게 부석사가 창건된다. 때는 의상은 문무왕 16년(676)이었다.
‘뜬 돌’이라는 뜻의 ‘부석’(浮石)의 내력은 그 같은 전설에서 연유한다. ‘삼국유사’를 비롯해 중국의 ‘송고승전’에 전해오는 이야기다. 커다란 돌이 공중에 떠 있다는 것이 사뭇 이채롭다.
그 돌은 부석사 무량수전 왼편의 산언저리에 있었다. 작은 바위 위로 넓적한 바위가 얹힌 모습은 ‘부석’(浮石)의 형상 그대로였다.
당시 용으로 변한 선묘처자가 들어 올린, 전설 속의 바위였다. 신화든, 설화든, 구전되는 이야기든 중요한 것은 그것에 깃든 정신의 가치일 테다. 부석사 창건에 대한 안내판 기록은 사실과 전설의 어느 중간에 위치한 듯했다. ‘실을 바위 틈에 넣고 지나가면 통과가 된다’는 부분은 사실과는 별개로 진리로 다가온다. 눈으로 미세한 틈을 가늠할 수 없지만 ‘부석’이 선묘 처자의 신심에 근거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부석’은 우리 인식의 개안을, 사유의 확장을 이야기한다. 집착의 부질없음을, 욕심의 헛됨을, 뜬 돌에 비유한 것이다. 나아가 소유와 명예 또한 허공에 뜬 바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른다.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희로애락애욕정 일체의 모든 욕망에 대한 경고이다. 부유하는 마음을 역설적으로 붙들어주는 상상 너머의 세계를 상정한다.
경북 영주는 소백산 자락에 자리한 고을이다. 예로부터 ‘십승지지’(十勝之地) 중 첫손에 꼽힐 만큼 풍광이 뛰어나다. 그만큼 산세가 유려하고 청정하다. 교육과 선비의 고장인 이곳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이 있다. 조선 중종 37년(1542년) 풍기 군수 주세붕이 백운동서원을 건립한 것이 시초다. 후일 퇴계 이황선생이 풍기군수 시절 조정에 건의를 해 소수서원으로 자리잡는다.
부석사는 아름다운 절이다. 단순한 미가 아니다. 태백산에서 뻗어내린 봉황산을 주산으로 산사가 자리한다. 산의 경사면에 석축을 쌓아 전각을 세운 덕분에 자연과 인위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다.
일주문까지는 다소 가파른 언덕을 올라야 한다. 석단은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어 108배를 하는 심정으로 오르지 않으면 안된다. 모두 108개의 계단을 오르고 나면 무량수전에 다다른다고 한다. 숨이 차고 다리가 뻐근하지만 정토의 세계로 나아가는 길에 그만한 수고가 대수랴 싶다. 일주문을 넘어 사천왕문을 지나자 눈앞에 명승이 펼쳐진다. 사찰이라고 하기에는 잘 단장된 정원 같다. 장마철 물이 오른 푸르름은 선명한 진초록으로 저잣거리의 길손을 맞는다. 화엄의 세계 아니 극락의 세계가 이러할까도 싶다. 봉황산의 줄기와 어우러진 산사의 전각은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다가온다. 미려와 소박의 아슬아슬한 경계 어느 지점에 놓여 있다.
가장 먼저 범종루(梵鐘樓)가 눈에 들어온다. 팔작지붕에 맞배지붕은 18세기 양식일 텐데 전각을 받치고 있는 기둥은 지극히 소박하다. 원래의 기둥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그런지 옹이와 틈이 그대로 노출돼 있다. 고르거나 예쁘지 않지만 지붕과 몸체를 받치고 있는 기둥은 수문장에 다름 아니다.
경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범종루 아래를 지나가야 한다. 하심의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 것이다. 범종루를 지나면 안양루(安養樓)가 나온다. ‘안양’은 정토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앞으로 돌출된 구조의 건물은 왜 이곳을 정토의 뜻이 담긴 안양루라고 이름했을까 가늠이 된다. 누각에서 바라보는 풍광은 빼어나게 아름답다.
두 개의 누각을 지나야 비로소 법당, ‘무량수전’(無量壽殿)에 들 수 있다. 부석사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물이다. 최순우 선생(1916~1984)의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라는 책에서 ‘동양건축의 최고 걸작품’이라고 표현했다. 고려시대 건립됐지만 1376년에 수리를 했다고 전해온다. 정면 다섯 칸, 측면 세 칸의 팔작지붕이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그 다섯 칸의 간격이 모두 다르다.
무량수전(국보제18호)의 최고의 백미는 기둥이다. 적당한 굵기의 기둥은 원통형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오는 부분이 부풀어 있다. 배흘림기둥은 예에서 연유한다. 주수완은 ‘한국의 산사 세계의 유산’(조계종출판사, 2020)에서 “내리누르는 힘을 위로 솟아오르는 힘으로 표현하다니 얼마나 역설적인가. 그래서일까. 무량수전 안에 들어가면 그 어디서도 내리누르는 힘을 느낄 수 없다”고 설명한다.
이밖에 경내에는 국보 제17호 무량수전 앞 석등을 비롯해 국보 제19호 부석사 조사당, 국보 제45호 소조여래좌상이 있다. 그 풍경에 그 유물이 빛을 발한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무량수전 앞에 있는 국보 제17호 석등. |
그 돌은 부석사 무량수전 왼편의 산언저리에 있었다. 작은 바위 위로 넓적한 바위가 얹힌 모습은 ‘부석’(浮石)의 형상 그대로였다.
당시 용으로 변한 선묘처자가 들어 올린, 전설 속의 바위였다. 신화든, 설화든, 구전되는 이야기든 중요한 것은 그것에 깃든 정신의 가치일 테다. 부석사 창건에 대한 안내판 기록은 사실과 전설의 어느 중간에 위치한 듯했다. ‘실을 바위 틈에 넣고 지나가면 통과가 된다’는 부분은 사실과는 별개로 진리로 다가온다. 눈으로 미세한 틈을 가늠할 수 없지만 ‘부석’이 선묘 처자의 신심에 근거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부석’은 우리 인식의 개안을, 사유의 확장을 이야기한다. 집착의 부질없음을, 욕심의 헛됨을, 뜬 돌에 비유한 것이다. 나아가 소유와 명예 또한 허공에 뜬 바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른다.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희로애락애욕정 일체의 모든 욕망에 대한 경고이다. 부유하는 마음을 역설적으로 붙들어주는 상상 너머의 세계를 상정한다.
경북 영주는 소백산 자락에 자리한 고을이다. 예로부터 ‘십승지지’(十勝之地) 중 첫손에 꼽힐 만큼 풍광이 뛰어나다. 그만큼 산세가 유려하고 청정하다. 교육과 선비의 고장인 이곳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이 있다. 조선 중종 37년(1542년) 풍기 군수 주세붕이 백운동서원을 건립한 것이 시초다. 후일 퇴계 이황선생이 풍기군수 시절 조정에 건의를 해 소수서원으로 자리잡는다.
부석사는 아름다운 절이다. 단순한 미가 아니다. 태백산에서 뻗어내린 봉황산을 주산으로 산사가 자리한다. 산의 경사면에 석축을 쌓아 전각을 세운 덕분에 자연과 인위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다.
일주문까지는 다소 가파른 언덕을 올라야 한다. 석단은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어 108배를 하는 심정으로 오르지 않으면 안된다. 모두 108개의 계단을 오르고 나면 무량수전에 다다른다고 한다. 숨이 차고 다리가 뻐근하지만 정토의 세계로 나아가는 길에 그만한 수고가 대수랴 싶다. 일주문을 넘어 사천왕문을 지나자 눈앞에 명승이 펼쳐진다. 사찰이라고 하기에는 잘 단장된 정원 같다. 장마철 물이 오른 푸르름은 선명한 진초록으로 저잣거리의 길손을 맞는다. 화엄의 세계 아니 극락의 세계가 이러할까도 싶다. 봉황산의 줄기와 어우러진 산사의 전각은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다가온다. 미려와 소박의 아슬아슬한 경계 어느 지점에 놓여 있다.
가장 먼저 범종루(梵鐘樓)가 눈에 들어온다. 팔작지붕에 맞배지붕은 18세기 양식일 텐데 전각을 받치고 있는 기둥은 지극히 소박하다. 원래의 기둥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그런지 옹이와 틈이 그대로 노출돼 있다. 고르거나 예쁘지 않지만 지붕과 몸체를 받치고 있는 기둥은 수문장에 다름 아니다.
경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범종루 아래를 지나가야 한다. 하심의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 것이다. 범종루를 지나면 안양루(安養樓)가 나온다. ‘안양’은 정토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앞으로 돌출된 구조의 건물은 왜 이곳을 정토의 뜻이 담긴 안양루라고 이름했을까 가늠이 된다. 누각에서 바라보는 풍광은 빼어나게 아름답다.
 ‘동양건축의 최고 걸작품’이라고 평가받는 무량수전. |
무량수전(국보제18호)의 최고의 백미는 기둥이다. 적당한 굵기의 기둥은 원통형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오는 부분이 부풀어 있다. 배흘림기둥은 예에서 연유한다. 주수완은 ‘한국의 산사 세계의 유산’(조계종출판사, 2020)에서 “내리누르는 힘을 위로 솟아오르는 힘으로 표현하다니 얼마나 역설적인가. 그래서일까. 무량수전 안에 들어가면 그 어디서도 내리누르는 힘을 느낄 수 없다”고 설명한다.
이밖에 경내에는 국보 제17호 무량수전 앞 석등을 비롯해 국보 제19호 부석사 조사당, 국보 제45호 소조여래좌상이 있다. 그 풍경에 그 유물이 빛을 발한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